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초음파로 공중에 띄워진 초경량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부드럽게 늘어나며 공간을 떠다닌다. 디스플레이는 스스로 빛을 발산해 입체 영상을 만들어낸다.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프린세스 레아의 입체 형상이다.
서울대 3차원광공학 연구실에서 만난 홍용택·박재형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미래 디스플레이'를 묘사한 기술이다. 이들이 함께 그리는 미래 디스플레이는 '어쿠스틱 레비테이션 디스플레이(Acoustic Levitation Display)'다. 음파를 이용해 공중에 물체를 띄우고, 동시에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로 이른바 '3차원(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다.
홍용택 교수는 이를 '프린세스 레아 홀로그램'에 비유했다. 그는 "스타워즈에서 프린세스 레아가 3D 홀로그램으로 소환되는 장면처럼, 디스플레이를 공중에 띄워 자유롭게 3D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상이다. 손목시계 주변에 '링' 형태 구조물을 만들고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소자를 집적한 후 링이 올라가며 늘어나는 장치를 구현한다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처럼 영상을 띄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박재형 교수는 "기존 기술은 고정된 원통 형태 구조물에서 구현하는 수준"이라면서도 "향후 스트레처블 구조가 완성되면 더 넓고 다양한 공간에 확장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리는 이렇다. 초음파 트랜스듀서(Transducer)라는 장치가 강력하고 정밀한 음파를 방출→음파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정재파(Standing Wave)' 형성→압력 노드라고 불리는 특정 지점에서 소리 압력에 따라 물체가 중력과 균형을 이루며 부상→떠오른 작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스스로 영상을 발산→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해 입체적인 홀로그램을 구현하는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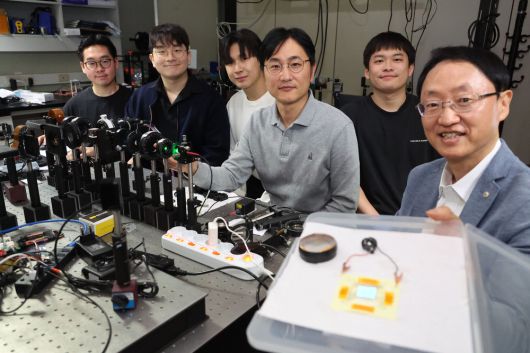 |
홍용택 교수(오른쪽 첫째)와 박재형 교수(오른쪽 셋째)가 서울대 연구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어쿠스틱 레비테이션 디스플레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런 혁신은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도 진화할 수 있다. 차량 내부 스티어링 휠이나 대시보드에 디스플레이를 띄워내는 방식으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킬 수 있다. 또 수술을 할 때 환자의 수술 부위를 3D 홀로그램으로 공중에 띄워 의사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진단하고 시술할 수 있다.
홍 교수는 디스플레이 발전 방향에 대해 "온갖 아이디어가 오가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뇌 내 현실'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시신경과 디스플레이 기술을 결합해 눈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뇌에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도 있다. 홍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다. 홍 교수는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할 경우 포스트잇처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플렉시블이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면서 "피부에 부착 가능한 바이오패치로 확장 적용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제품들을 혈당 측정 패치나 의료용 밴디지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해 "20% 정도 신축만 가능해지면 실제 인체 피부나 자동차 표면에도 손쉽게 부착할 수 있다"면서 "200PPI(인치당 픽셀 수) 이상 선명한 해상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내비게이션 기기와 같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가 200PPI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산학 연구도 활발하다. 현재 LG디스플레이는 12인치 화면이 최대 18인치까지 신축성 있게 늘어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2017년 해당 제품을 처음 시연한 뒤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기술로도 꼽힌다. 홍 교수는 "중국이 여전히 데모(시연)를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면서 "폴더블 등 플렉시블에 이어 한국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