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선엽 대장.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백선엽 장군님을 위한 자리는 서울 현충원에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백선엽 장군님께 서운한 말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며 “백 장군님 주변 분들이 ‘보훈처 직원들이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총선 전에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설문을 돌렸고, 법안 개정을 여권 일부에서 추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장군님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에 가슴이 무척 아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보훈처는 ‘뽑혀 나갈 수 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고 광복회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은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런 언급 자체가 자유대한민국에 큰 기여를 해오신 백선엽 장군님께 큰 상처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백 장군님은 6·25전쟁 영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분이고 ‘6·25의 이순신’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이다”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조금이라도 피해를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에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법안이 추진될 경우 만에 하나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이 오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백 장군님,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회복하셔서 오래 같이 계셔주셔야 한다. 원로들의 존재만으로 전후 세대에는 커다란 힘이 된다. 백 장군님 같은 애국 원로들께서 애쓰신 덕택에 후손들이 잘 살고 있다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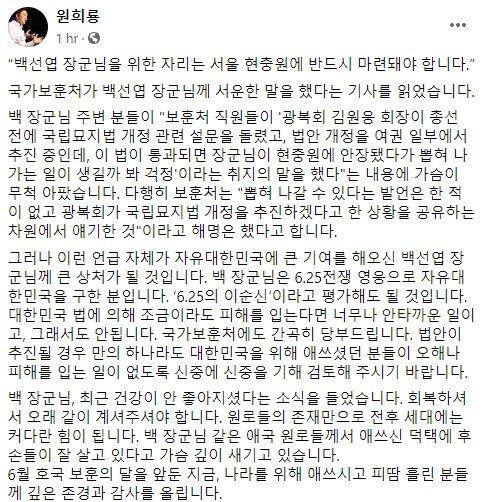 |
사진 SNS 캡처 |
━
보훈처, 백 장관에 “현충원 '친일 파묘' 상황 공유”
한편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 인사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을 찾아 장지(葬地)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들은 지난 13일 백 장군 사무실로 찾아와 장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100세인 백 장군이 별세할 경우 국립묘지로 안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훈처 직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 문제를 언급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백 장군 측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압박을 느낀 백 장군 측은 “가족들 모두 최악의 사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 직원이 찾아온 시점과 발언 내용 모두 부적절했다는 것이 백 장군 측 입장으로 알려진 것이다.
올해 100세인 백 장군은 광복 직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했으며 6·25 전쟁 당시 1사단장, 1군단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등을 역임해 한국전쟁 영웅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광복 전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간도특설대’ 활동 이력 때문에 지난 2009년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됐다.
보훈처는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백 장군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라며 “담당 직원이 백 장군 측에 ‘뽑혀나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백 장군 사무실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최근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국립묘지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을 묻고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복회가 국립묘지에서 친일 인사를 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백 장군 측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