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에서 다른 목표에 도달한 작가들
김아타 “극한서 큰 에너지”
최찬숙, 3개월간 머물며 작업
볼탕스키, 학살된 이 위로
 |
김아타가 2010년 아타카마 사막에 설치한 캔버스. 자료 화면 영상 촬영. 김종목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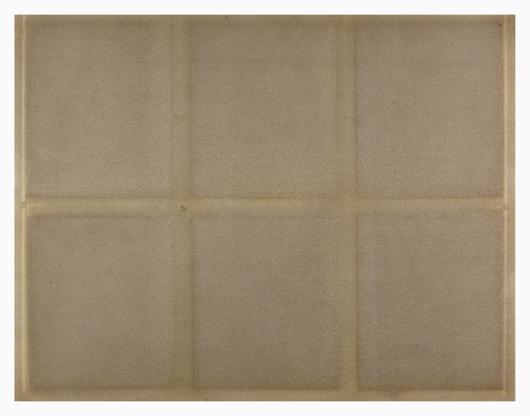 |
김아타 ‘자연하다’ 중 ‘아타카마 사막’(2010~2013) 모란미술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아타가 ‘자연하다’전(경기 마석 모란미술관 19일 개막)에 출품한 28점 중 하나는 ‘아타카마 사막’(2010~2013)이다. 이 사막에 2년 동안 캔버스를 세웠다. 김아타는 “아타카마 사막에 세운 캔버스는, 모래가루가 천에 박혀 사막이 됐다”고 했다. 캔버스에 남은 사막 흔적을 두곤 ‘자연의 문신’이자 ‘자연의 붓질’이라고 했다. 왜 칠레 아타카마를 ‘자연하다’ 프로젝트의 장소 중 한 곳으로 꼽았을까.
김아타는 기자와 통화하며 “화성에 가장 가까운 지형이다. 건조하다. 바람도 세다. 모래가 캔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싯다르타의 고행도 떠올렸다고 한다. “싯다르타가 이곳 사막에 왔어도 부처가 되었으리라 생각했다. 극한의 환경에서 큰 에너지가 나온다. ‘큰 상처가 큰 지혜’를 낳는다는 말도 있다.”
▶김아타 “우주에도 캔버스를”…눈·비바람·흙먼지, 사계가 그린 ‘자연하다’
 |
최찬숙의 ‘큐빗 투 아담’(2021). 김종목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최찬숙 ‘큐빗 투 아담’(2021) 중 코퍼맨을 다룬 영상 장면.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아타 작품 중에서 ‘아타카마 사막’이 눈에 들어온 건 최찬숙의 ‘큐빗 투 아담’(2021)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찬숙은 이 작품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1’을 수상했다. 이 영상 설치 작품의 주 배경이 아타카마 사막의 추키카마타 구리광산과 우주망원경 집합체인 알마이다. 최찬숙은 2019년 아타카마 사막에서 3개월간 머물렀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에 최찬숙
김아타가 자연과 종교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면, 최찬숙은 소유와 인공물 문제를 파고들었다. 최찬숙은 기자와 통화하며 “토지 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지역들을 조사하다 보니 추키카마타 광산 자료가 많이 나왔다. 우연히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알마(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집합체·Atacama Large Millimeter Array, ALMA)를 알게 됐다”고 했다. 여성 작가가 드론 촬영 등 허가를 받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계획이 지연되는 와중 무작정 사막을 걷다가 발견한 게 아타카마 사막 중 ‘토르테’라 불리는 곳이다. 폐광산에 모래 등이 쌓여 다시 땅을 이뤘다. “폐광산에서 흘러나온 화학물질이 뒤섞이면서 굉장히 기이한 형태로 땅이 굳어졌다. 땅이란 존재도 이방인처럼 밀려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작품 방향도 그렇게 잡았다. 이곳에서 땅의 생명력도 느꼈다”고 했다.
이 작품은 ‘미라’로 시작한다. 1899년 추키카마타 광산에서 발견된 코퍼맨(Copper Man)이다. 550년(추정)에 묻힌 시체에 구리가 스며들었다. 몸과 땅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이 미라를 두고도 광산업자와 땅 소유자가 각각 “구리가 들어갔으니 내 것” “내 땅에 묻힌 거니 내 것”이라며 다퉜다. 결국 JP모건이 사들여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최찬숙은 “이 미라도 데이터를 선점하려 강대국들이 점유한 알마처럼 인간이 땅을 다루는 방식이나 소유권 문제를 반영하는 듯했다. 그런 부분도 연결했다”고 말했다. 미술관은 지난 3월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큐빗 투 아담’을 두고 “개인의 기억과 역사를 이루는 땅과 몸에 주목하고 이주, 이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밀려난 사람들과 남겨진 존재는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과거 광산 채굴에서 오늘날 가상화폐를 위한 채굴에 이르는 인간의 노동과 물질 소유의 역사를 파헤치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작품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소, 사건, 시간, 공간을 통해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낸다”고 평했다.
최찬숙은 사막에서 본 ‘회전초’를 소재로 다음 작품을 준비 중이다. “뿌리 없이 바람에 흩날려 다니면서 씨를 뿌린다. 조건이 맞는 자연환경에선 정착해 뿌리를 내리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두고 땅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고 했다.
 |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아니미타스’(2014). 김종목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피에르 위그의 ‘세로 인디오 무에르토’. 출처 아트바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프랑스 작가들도 아타카마 사막을 주제로 작품을 발표했다. 그중 한 명이 크리스티앙 볼탕스키(1944~2021)다. 홀로코스트 등 학살과 죽음 문제에 천착한 그는 사막 공간에서 참혹한 역사를 떠올렸다. 역사의 공간을 위로·추모의 공간, 사색·성찰의 공간으로 전환한다.
피노체트가 정치범 수천명을 학살해 이곳에 묻었다. 실종자 가족은 아직도 시신을 찾으러 다닌다. 볼탕스키는 사라진 영혼을 위로하려고 ‘아니미타스’(2014)를 제작했다. 일출에서 일몰까지를 담은 13시간짜리 영상에 등장하는 건 갈대와 한국의 풍경(風磬)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일본의 후린(風鈴)뿐이다. 대에 걸린 종마다 소원을 적는 종이 모양 플라스틱판을 매달았다. 지극히 단순한 설치와 영상으로 시적 효과를 낸다.
이 작품은 부산시립미술관의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전에도 나왔다.
▶아타카마 사막, 눈쌓인 바르샤바··· 고요한 풍경 속 번득이는 죽음의 이미지, 볼탕스키 유고전
피에르 위그의 ‘세로 인디오 무에르토(Cerro indio muerto, 죽은 인디언의 언덕)’도 아타카마 사막의 죽음을 다룬다. 그는 작품 제목과 동명의 장소에서 땅 표면에 엎드린 해골을 발견해 프레임에 담았다. 죽은 광부로 추정된다고 한다. 위그의 직접적인 죽음 묘사에서도 ‘내던져지고, 버려지는 존재’에 관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