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기 신도시는 주택을 대량 공급해 1990년대 초중반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지역을 의미한다. 고양시 일산,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으로 모두 5개 지역이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도시들인데 그만큼 노후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선 후보들은 해당 지역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쟁쟁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노후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빠른 사업을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을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도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공약을 중심으로 내세웠다. 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춰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1기 신도시에 고품격 원가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이번 1기 신도시 개편 화제에 대해 “목동·상계동·여의도 등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이 많지만 1기 신도시 규모에는 못미친다”라며 “지방신도시들의 경우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인접지역이 아니라 결국 1기 신도시로 관심이 몰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에 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들 뜬 분위기다.
1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이 높게 나와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의 경우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말했고 다른 부동산 관계자 역시 “3종주거지역의 소형 평수는 최근 거래가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제도 금리가 인상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아직 적극적인 거래 활성화는 없다”며 “문의는 확실히 늘었지만 아직 실거래는 늘어나지 않아 투기판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재건축 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한 김창규 후곡마을 조합 추진준비위원장은 “초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라며 “현재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상충시키고 혹시 모를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기준과 원칙을 설립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일산 전체와 분당 등과 협력해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적률 상승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대답에 차이가 있었다.
앞서 만난 부동산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여 기존에 입지가 좋던 지역을 재건축하는 것이 역세권이 아닌 새로운 부지에 건축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결과가 기대된다”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주택을 지어도 결국 신축과 역세권으로 쏠려 아예 인기 지역 가구수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후에 만난 관계자는 “3종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너무 인구가 쏠리는 것은 현재 해당 아파트에 거주중인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용적률 상향은 찬성하지만 너무 많은 인구가 쏠릴 정도가 아니라 370%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은 현재 재건축 공약의 가장 큰 화제다. 지난 대선부터 이번 지선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여러 후보들은 재건축 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노후 도심에 주택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한 번에 용적률 500% 상향 적용은 힘들 것”이라며 “정비사업조합 등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고자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이들이 요구대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난개발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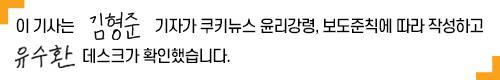 |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