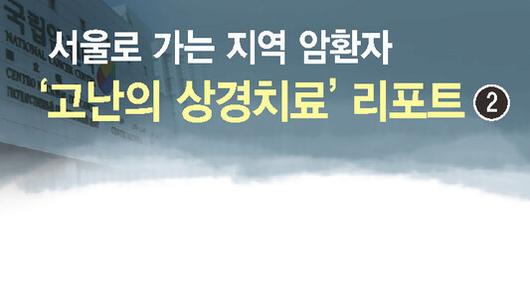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②
마지막 기회도 서울에…
 |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에서 폐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김춘자씨가 지난해 12월29일 <한겨레>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조윤상 피디 jopd@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큰 병 걸리면 서울로 가라.’ 해마다 비수도권에 사는, 국내 사망원인 1위 암 환자의 30%, 소아암 환자는 70%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한다. 체력이 약한 환자가 4~5시간씩 걸려 수백㎞를 통원하거나, 아예 병원 옆에 거처를 얻어 서울살이를 시작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대형병원 인근에 하나둘씩 환자 숙소가 들어서더니 이제 고시원·고시텔·셰어하우스·요양병원이 밀집한 ‘환자촌’으로 자리잡았다. <한겨레>는 지난해 11월부터 석달간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과 경기도 국립암센터 인근에서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틈타 성업 중인 환자방 실태를 취재했다. 또 같은 기간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서 치료받는 지역 암 환자와 보호자 46명을 인터뷰하고, 188명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10명의 자문을 거쳐 한국의 지역 의료 불평등 실태와 필수의료·의료전달체계 대책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서울 쪽은 임상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기회가 많다고요. 지방엔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김춘자(63)씨는 암세포가 뇌로 전이된 폐암 환자다. 집은 울산이지만 2021년 5월부터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머문다. 인근 대형 병원에서 진행하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는 2015년부터 서울·경기 일대 병원과 울산을 오가며 긴 투병 생활로 “아픈 몸만큼이나 가족과 떨어진 마음도 아프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 여긴다. 신약이나 기존 약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은 약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김씨는 올해도 집을 떠나 ‘서울 큰 병원’에서 삶의 마지막 기회를 붙들어 볼 작정이다.
8일 <한겨레>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지역별 항암제 임상시험 건수(동일 약품을 여러 곳에서 동시 시험한 경우 지역별로 1건씩 복수 집계)를 확인했더니, 5년간 총 971건 중 907건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이뤄졌다. 연평균 181건꼴, 전체 임상 중 93.4%가 서울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말기암 환자의 위험을 감수한 벼랑 끝 치료 기회마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 병원에서도 5년간 524건, 연평균 105건(54%)의 임상이 진행됐다.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5년간 총 200건을 넘는 곳이 없었다. 특히 같은 기간 제주와 경북에서는 임상시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15건), 강원(11건), 충남(12건)에서 진행된 임상 또한 극히 일부로, 이들 지역에서 진행된 임상은 연간 2~3건에 그쳤다. 제주에 사는 암 환자가 같은 기간 관내 병원에서 임상에 참여할 수 없었던 반면, 서울에서는 조건이 맞는다면 907가지 임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이다.
 |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상시험 중인 약물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검증 과정에 있는 가능성일 뿐이다. 기존 암치료로 효과를 얻지 못했던 자궁경부암 환자 ㄱ(66)씨도 지역에서 서울로 와 세차례나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환자가 임상을 통해 기회를 잡는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윤리적 문제와 되레 생을 단축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달리 방도가 없는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이런 가능성조차 몹시 절박하다. 홍민희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엄밀하게는 임상시험의 효과가 좋다고 말할 수 없고, 효과를 증명하려고 시험하는 것”이라며 “다만 임상시험의 가정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이 기존 것보다 좋은 경우가 있고, 일부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에 사는 폐 전이 두경부암 환자 ㄷ(82)씨 또한 몸 상태가 나빠 항암치료 자체가 어려웠으나, 면역 항암제 임상에 참여하고 4년째 큰 탈 없이 지내고 있다.
연 720만원 드는 비급여 항암제…임상은 무료
말기암 환자들이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이유 중에는 경제적 문제도 크다. 임상 조건에 맞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제 투여 비용을 제약회사가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고가의 약값에도 약을 처방받고자 하는 전이·재발 암 환자 상당수가 바라는 일이다.
폐암 경구 항암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경우, 2016년부터 국내에서 허가됐지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검사를 통해 환자에 특정 유전자(T790M)가 발견되고, 국내에서 재발한 2차 치료만 ‘효능이 높다’고 인정돼 건보 적용을 받는다. 해당 조건에 맞는 환자는 월 30만원대 비용을 내고 투여할 수 있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비급여로 복용해야 한다. 비급여로는 한달에 약값만 600여만원, 1년이면 7200여만원이 든다.
뇌 전이 폐암 환자 김춘자씨는 암세포가 뇌와 흉막 등 여러 곳에 퍼진 만큼 절박했지만, 특정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아 건보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항암제를 처방받으려면 비급여로 고액의 약값을 다 부담해야 했다. “암 치료가 6~7년씩 되면 진짜 돈이 바닥났을 거 아닙니까. 약값이 한달 600만원이라 하니까 저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담당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춘자씨는 다니던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 조건에 해당했다. 이 약이 뇌 전이 폐암 환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이었다. 덕분에 김씨는 1년 반 전부터 제약사가 제공하는 항암제를 무료로 받게 됐다. “이 임상에서 실패하면 저는 다른 약이 없어요. 그리되면 하늘나라 가까운 거죠. 그래도 서울(병원)이니까, 획기적인 약이 나오는지 기대를 거는 거죠.”
항암제 외에도 서울에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치료제 임상시험도 많다. 전북 정읍에 살며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는 췌장암 4기 성아무개(45)씨는 호중구(세균·박테리아를 막아내는 포식세포)가 감소하는 항암 부작용에 대한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비급여로 1회에 50만원에 해당하는 치료지만, 임상시험 대상이 돼 약을 무상으로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암 환자가 재발 또는 말기로 진행된 상황을 대비하는 성격으로 서울행을 택하기도 한다. 항암제 치료 대신 방사선 치료만 받는 유방암 2기 환자 이숙경(가명·44)씨는 “혹시 나중에 암이 재발하거나 더 진행됐을 때 임상 참여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울에 왔다”고 했다.
<한겨레>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2월15~18일 서울로 온 비수도권 암 환자(보호자 대리 응답과 복수 응답 가능) 2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유효 응답자(이하 응답자) 188명의 답변을 분석해 보니, 6.4%(12명)가 ‘신약 임상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울로 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기 환자는 10.6%(20명)에 불과했지만, 신약 임상 기회를 찾아 서울로 온 12명 중 7명이 4기 암 환자였고, 3기 2명, 2기 3명이었다. 더 이상 기존 치료법에 기대를 걸 수도 없고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든 말기암 환자일수록 ‘서울 큰 병원’에 몰린 임상시험밖에 기댈 데가 없는 셈이다.
중증환자 몰려 세계적 임상도시 된 서울
약 부작용 위험 속 다국적 제약사들 수익
서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전세계에서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이뤄진 도시다. 국가 전체로 보면 2021년 한국의 전세계 임상시험 점유율(3.7%)은 미국·중국·스페인·영국·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6위다.(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한국 임상시험 산업 정보 통계집’)
지난 2002년 정부가 국가기술지도(로드맵)에 99개 핵심기술 중 하나로 임상시험을 포함시킨 이후, 점차 한국은 세계 임상시험 중심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에서 임상시험 진행을 선호하는 까닭은 중증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모여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홍민희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제약사들은 빠른 시간 안에 임상시험에 적합한 환자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호한다”며 “한국은 나라 자체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특성 때문에 많은 임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승인된 국내외 제약사의 항암제 임상시험은 2017년 171건에서 2021년 25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은 생명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어 참여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기존 치료보다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작용 가능성을 환자가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의료진이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환자 입장에선 의사 권위를 존중해야 하니, 불편한 점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상시험 진행이 병원과 다국적 제약사 수익, 의료진 연구 실적에도 활용되는 상황은 환자 건강 보호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퇴사하고 월급 200→400만원, 정년도 없어” 기술 배우는 MZ▶▶바이든, 비행기 떴는데 “안 가”…우크라 방문 특급 연막작전▶▶마음 따뜻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②
마지막 기회도 서울에…
‘큰 병 걸리면 서울로 가라.’ 해마다 비수도권에 사는, 국내 사망원인 1위 암 환자의 30%, 소아암 환자는 70%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한다. 체력이 약한 환자가 4~5시간씩 걸려 수백㎞를 통원하거나, 아예 병원 옆에 거처를 얻어 서울살이를 시작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대형병원 인근에 하나둘씩 환자 숙소가 들어서더니 이제 고시원·고시텔·셰어하우스·요양병원이 밀집한 ‘환자촌’으로 자리잡았다. <한겨레>는 지난해 11월부터 석달간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과 경기도 국립암센터 인근에서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틈타 성업 중인 환자방 실태를 취재했다. 또 같은 기간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서 치료받는 지역 암 환자와 보호자 46명을 인터뷰하고, 188명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10명의 자문을 거쳐 한국의 지역 의료 불평등 실태와 필수의료·의료전달체계 대책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서울 쪽은 임상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기회가 많다고요. 지방엔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김춘자(63)씨는 암세포가 뇌로 전이된 폐암 환자다. 집은 울산이지만 2021년 5월부터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머문다. 인근 대형 병원에서 진행하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는 2015년부터 서울·경기 일대 병원과 울산을 오가며 긴 투병 생활로 “아픈 몸만큼이나 가족과 떨어진 마음도 아프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 여긴다. 신약이나 기존 약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은 약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김씨는 올해도 집을 떠나 ‘서울 큰 병원’에서 삶의 마지막 기회를 붙들어 볼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