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화 '리바운드'의 연출을 맡은 장항준 감독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화 '리바운드'는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로 구성된 최약체 농구부원들이 전국 고교농구대회에 출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 중고교농구대회에 참가한 강영현 코치와 부산 중앙고 학생들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다.
장항준 감독은 영화 '기억의 밤' 이후 6년 만에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 코미디부터 범죄·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던 그는 국내서 처음 제작되는 농구 소재 영화로 스크린 복귀하게 됐다.
"시나리오를 읽고 피가 끓더라고요. 벅차고 설렜어요. 진정성도 느껴졌고요. 사실 영화 '리바운드'가 상업영화의 주류 장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점이 오히려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가보지 않은 길처럼 보였거든요. 평소에도 안전한 것보다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낯선 길'에 호기심을 느꼈어요."
장항준 감독은 영화의 진정성에 주목했다. 지난 2012년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 중고교농구대회에서 벌어진 강영현 코치와 농구부 학생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무조건 실제와 가깝게 찍자'라고 했어요. 현실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배우들의 외모부터 체육관 같은 공간까지 싱크로율이 높길 바랐죠. 배우들 캐스팅할 때도 신장, 몸무게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촬영도 대부분 (영화의 배경이 되는) 부산에서 찍었어요. 극 중 등장하는 체육관은 실제 선수들이 연습했던 부산 중앙고 체육관이에요. 당시 느낌을 내려고 학교 측에 동의를 얻어 문과 바닥도 교체했어요. 관객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가 실화라는 게 중요했죠."
 |
영화 '리바운드'의 연출을 맡은 장항준 감독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화 '리바운드'와 여타 스포츠물이 다른 건 '지도자' 역시 학생들처럼 실패하고 아이들과 어울리며 함께 성장해나간다는 점이다. 장항준 감독은 영화 '리바운드'의 주축이 될 인물로 단박에 안재홍을 떠올렸다.
"보통 일반적인 스포츠 영화는 완성형의 코치나 감독이 불량한 아이들을 교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영화는 '강 코치'도 아이들과 별다를 게 없어요. 프로 선수가 되고 싶었으나 꿈을 이루지 못했고, 때로는 분별력 없이 굴기도 하고…. '강 코치'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한 셈이죠. 이야기를 보았을 때 '강 코치' 역은 안재홍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전부터 그의 연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지질하기도 하고, 아닌척하는데 허점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좋아서요. 안재홍은 안재홍밖에 못 하니까요."
장항준 감독은 안재홍과 실제 강영현 코치가 닿아있는 지점이 있다며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강영현 코치가 자신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어요. 하루는 '감독님, 영화 속에서 저를 죽이셔도 괜찮아요'라고 하더라고요. 하하하. (안)재홍이가 '이건 실화 영화인데 형이 왜 죽어요'라며 놀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두 사람은 순진하고 순수한 데가 있어요. 성격은 다르지만 어딘지 결이 닮았어요."
영화 '리바운드'는 안재홍과 정진운을 제외한 대부분 출연진을 신인으로 꾸렸다. "배우가 아닌 캐릭터로 보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장 감독의 뜻은 통했다. 촬영 현장에서도 배우들은 서로를 코치와 선수로 여겼고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안)재홍이가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농구 연습도 함께하고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줬죠. 특히 몸 푸는 시간에는 기합도 넣어주면서 함께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같다'고 생각했어요. 안재홍은 진짜 그 아이들의 코치였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요."
일찍이 영화 '리바운드'는 드라마 '시그널' '킹덤' 시리즈를 쓴 김은희 작가가 각본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장 감독은 김은희 작가가 각색을 맡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라고 농담했다.
"처음 '리바운드' 연출을 제안받고 (시나리오 각색에 관해)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고칠까, 다른 작가를 찾아볼까…. 바쁜 시기여서 다른 작가에게 맡기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김은희 작가)가 '리바운드'를 읽어보더니 '오빠, 이 작품 할 거야?'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내가 해보면 안 돼? 내가 고쳐보고 싶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설렌다면서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원안을) 변형하고 뺄 건 빼면서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흡족했어요."
 |
영화 '리바운드' 스틸컷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동안 한국에서 농구 소재의 스포츠 영화가 제작되지 않았던 건 경기 장면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했다. 같은 구기 종목이어도 야구의 경우는 배우가 자세만 완벽히 익힌다면 공은 CG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농구는 CG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선수가 아니니까 흉내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기본기'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자세가 안 되면 CG를 갖다 붙여도 안 되거든요. 몇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연습했고 쓰든 안 쓰든 합들을 짜고 맞췄죠. 배우들도 사실 신인이고 이 작품이 자기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겨서 요구대로 잘 따라와 줬어요. '진짜같이 해달라'는 제 말처럼 푹 빠져서 해주었어요."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에 등장하는 음악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영화 말미 결승에 오른 중앙고 농구부가 열세에도 불구 도전해나가기 위해 의지를 다지는 장면이다. 경기장으로 나서는 이들의 모습과 함께 펀(Fun.)의 '위 아 영(We are young)'이 흐르는 장면은 관객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저는 촬영하면서 그때그때 편집을 하는 편이에요. 그 장면도 촬영을 마치고 편집하는데 '어떤 음악을 쓰면 좋을까?' 하다가 임의로 '위 아 영'을 삽입해놓은 거죠. 사실 그 노래를 그대로 쓸 수 있을지 몰랐어요. 워낙 비싼 곡이라서요. 그런데 편집 기사와 이야기도 해보고 어떤 노래를 깔아도 그 노래 이상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속으로 어쩌지,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영화 투자사인 넥슨이 내부 시사회 이후 '이 노래를 그대로 쓰자'고 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사주시겠다니! 생각지 못한 제작비가 드는 건데도 작품과 잘 어울린다며 흔쾌히 결정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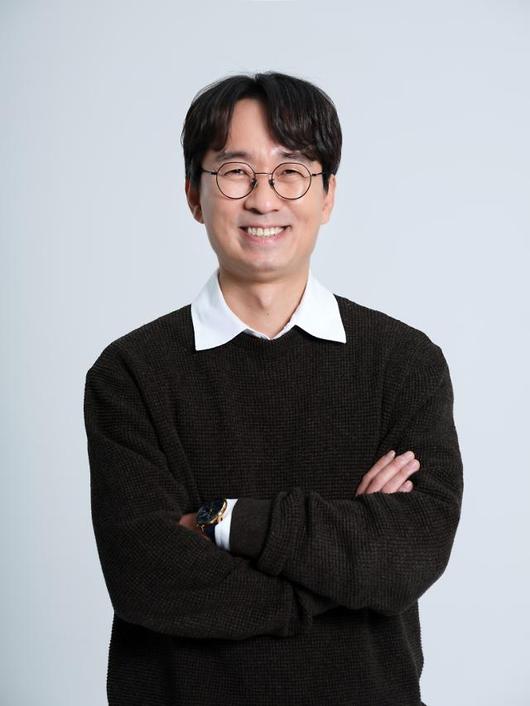 |
영화 '리바운드'로 6년 만에 스크린 복귀한 장항준 감독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장 감독은 해당 일화를 설명하며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표현했다. 무산될 뻔했던 '리바운드'가 넥슨과 만나 제작이 결정된 일도 그렇지만 개봉 시기와 맞물려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인기로 대중들이 농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일도 '행운' 중 하나였다.
"저희는 일찍이 개봉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슬램덩크'가 이렇게 활약할 줄은…. 속으로 '100만명 넘겨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300만명을 돌파했더라고요. 매일 스코어를 확인하면서 응원했었죠."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더 있었다. 배우 이신영이 연기한 '기범' 역의 실제 모델인 농구선수 천기범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일이었다.
"촬영 도중이었어요. 스태프도 저도 충격에 빠졌었죠. 하지만 모든 작품은 난관이 있고 쉽게 만들어지는 작품은 없어요. '꿋꿋하게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리바운드'가 누구 한 명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 작품을 꿈을 잃어버린 25살 청년과 주목받지 못하던 6명의 청년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장항준 감독은 차기작에 관해 간단하게 귀띔해주었다.
"차기작을 말해두고 못 찍는 경우가 생겨서 조심스럽지만, 지금 계획 중인 건 블랙코미디일 것 같아요. '리바운드'와는 결이 많이 다르죠. 엑소시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경제=최송희 기자 alfie312@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