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희진 프로배구 여자부 정관장 감독. 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장담합니다.
세상에는 고희진 감독 부임에 반대했는데, 투리노 다니엘레 흥국생명 코치와 신경전을 벌일 때는 고 감독을 응원한, 정관장 팬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이런 팬은 일단, 취향에 따라, ‘좋아요’ 또는 ‘팬이에요’를 누른 다음 이 글을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 감독은 17일 인천 방문 경기를 앞두고 “세터 (로테이션) 자리별로 서브 공략, 블로킹과 수비 위치 등을 준비하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대로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정관장은 이 경기 전까지 14전 전승을 기록 중이던 프로배구 여자부 선두 흥국생명을 3-1(25-22, 25-23, 14-25, 25-22)로 물리쳤습니다.
그랬다는 건 고 감독이 준비한 작전이 잘 통했다는 뜻이겠죠?
정관장이 19-21로 끌려가던 4세트로 가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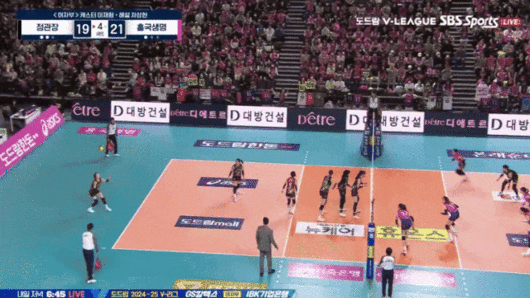 |
SBS스포츠 중계화면 캡처 |
정관장 주전 세터 염혜선(33)이 상대 코트 왼쪽으로 짧게 서브를 넣습니다.
그러면 흥국생명에서는 김연경(36)이 이 서브를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김연경의 공격에 대비해 정호영(23·미들 블로커)과 메가(25·오퍼짓 스파이커)가 블로킹 벽을 칩니다.
이 공격을 가로막지 못해도 리베로 노란(30)이 커버에 나섭니다.
그러고는 부키리치(25·아웃사이드 히터)가 상대 코트에 스파이크 폭탄을 날립니다.
이 로테이션 순번에서 염혜선은 5번 연속으로 서브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장이 5연속 득점에 성공한 겁니다.
이럴 때 흥국생명 세터 이고은(29)이 코트 오른쪽으로 공을 띄우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SBS스포츠 중계화면 캡처 |
정호영과 메가가 김연경이 있는 상대 왼쪽 코트를 봉쇄하는 사이 부리리치가 투트크를 전담 마크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 장면이 나온 1세트 후반에도 염혜선은 4번 연속으로 서브를 넣으면서 = 정관장이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세트를 끝냈습니다.
두 장면 모두 김연경은 로테이션 순서상 2번 자리(전위 오른쪽)였습니다.
(김연경은 분명 코트 왼쪽 앞에 있는데 왜 ‘전위 오른쪽’이라고 썼는지 궁금하신 분은 ‘도대체 포지션 폴트란 무엇인가? [발리볼 비키니]’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연경은 이 경기서 정관장 서브를 총 29번 받았는데 그중 17번(58.6%)이 2번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김연경이 2번 자리에 있는 동안 흥국생명은 공격 효율 0.033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배구에서는 서브 차례가 바뀔 때마다 로테이션이 바뀝니다.
이렇게 공격 효율이 떨어지면 로테이션을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 감독의 이 서브 작전이 김연경을 ‘2번 늪’에 가둬놓았던 겁니다.
 |
프로배구 여자부 정관장 주전 세터 염혜선(왼쪽)과 고희진 감독. 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 감독은 또 블로킹 벽을 높이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염혜선 대신 장신(181cm) 세터 안예림(23)을 코트에 투입해 ‘블로킹 그 이후’까지 대비했습니다.
1, 4세트 승리 일등공신이 염혜선이라면 2세트는 안예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예림은 2세트 23-23 동점 상황에서 유효 블로킹(우리 팀 디그로 이어진 블로킹)에 이어 공격 세팅까지 책임지면서 팀에 세트 포인트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이번 칼럼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 경기에서는 고 감독이 준비한 작전이 정말 딱딱 맞아떨어졌던 것.
고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다”며 공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선수들이 잘해야 이런 전술이 빛을 볼 수 있다. 정말 대견하다”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남자부 삼성화재 지휘봉을 잡고 있던 시절 고 감독은 어딘가 준비가 덜 된 느낌을 풍기기도 했던 게 사실.
그런데 어느덧 고 감독을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명장의 향기가 나지 않나요?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