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빙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티빙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OSEN=조형래 기자] 국내 프로스포츠 한정 가장 많은 팬들을 보유한 스포츠가 프로야구다. KBO리그는 연간 800만명 관중이 찾는 국내 최고의 프로스포츠 이벤트다. 일주일에 6일씩 사람들의 3시간 가량을 책임지는 컨텐츠다. KBO리그를 위해서 팬들은 자신들의 아낌없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런데 팬들이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회수될 위기에 놓였다. KBO리그 유무선(뉴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한 CJ ENM 계열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 때문이다. 티빙의 안일한 준비, 대처, 그리고 무능력이 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대로면 팬들이 떠날 위기다.
KBO는 지난 4일, CJ ENM과 2024~2026시즌 KBO리그 유무선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했다. 3년 총액 1350억원으로 연평균 45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액 중계권 계약이다. 지난 2019년 통신 포털 컨소시엄(네이버,카카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과 맺은 5년 1100억원, 연평균 220억원의 계약보다 2배 넘는 금액에 계약을 맺었다.
KBO리그는 중계권 계약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야구에 대한 시장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였다. 아울러 구단들에게 분배될 중계권 계약 수입도 늘어난다는 의미였다. 2019년 이후 약 3년여 가량은 코로나19 시국에 시달렸지만 KBO리그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역대 4번째 800만 관중을 돌파했다(총 810만326명). 야구의 인기는 굳건했고 여전히 사랑받는 컨텐츠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이 역대급 중계권 계약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꿈에 부풀었다. KBO도 외적인 성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
티빙 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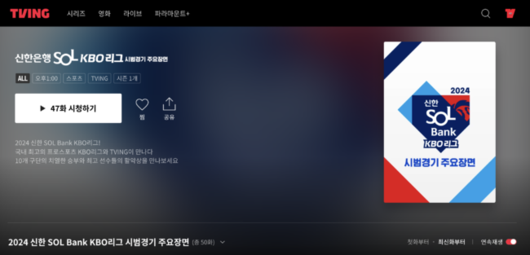 |
티빙 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중계권 계약 이후 알려진 사실들은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더 이상 프로야구는 공짜 컨텐츠가 아니게 됐다. ‘전면 유료화’ 시대가 열렸다. 월 5500원을 내고 CJ ENM의 OTT 플랫폼 티빙의 이용권을 구매해야 야구를 볼 수 있다. 월 5500원이라는 금액 자체에 대한 기존 팬들의 저항은 크지 않았다. 그에 걸맞는 컨텐츠, 티빙의 플랫폼 구성, 관람의 편의성 등을 충분히 제공한다면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 하지만 전면 유료화의 어두운 부분은 신규 팬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이었다. 특히 중고생 등 청소년 팬들에게 월 5500원이라는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었다. 스스로 진입 장벽을 쌓은 것은 청소년 및 신규 팬들의 유입을 스스로 막는 꼴이었다. 5500원에 걸맞는 내용이 필요했다.
그런데 시범경기가 시작되자 이런 고민들은 쓸데없다는 게 드러났다.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이 연달아 터졌다. 현재의 문제가 시급한데 먼 미래까지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지난 9일 시범경기가 개막했고 지난 12일까지 시범경기가 진행됐는데, 이 기간 티빙의 민낯이 완전하게 드러났다. 능력도 없는데 준비까지 허술했다. 중계 퀄리티 문제는 기본이었다. 시범경기 임에도 티빙 플랫폼은 프로야구 5경기를 소화하는 게 버거워보였다. 중계 중 버퍼링이 자주 일어났고 실시간으로 보는 게 힘들었다.
무엇보다 하이라이트 영상 내에 ‘22번 타자’, SAFE가 아닌 SAVE, 3루 밟고 홈런, 등 야구 용어 자체를 모르는 듯한 모습으로 팬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오타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야구 자체를 모른다는 것을 하이라이트를 통해 스스로 알렸다. 또한 하이라이트 영상의 업데이트 시간도 경기 종료 후 4~5시간이 끝나고 올라왔고 또 1화, 2화 등 드라마 회차처럼 경기별 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애교였다. 해시태그에 ‘꼴데’,’칩성’ 등 구단 비하 단어들까지 사용하는 등 몰지각한 행태까지 벌어졌다. 티빙은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
 |
티빙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OSEN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350억원을 쏟아 붓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도 드문 일일 것이다. 누가 와서 중계권 계약을 맺으라고 협박하지 않았다. 스스로 1350억이라는 돈다발을 들고 KBO를 찾아갔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준비를 했어야 했다. 능력이 없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팬들도 정규시즌 개막 전까지 이해를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티빙은 능력도 없는데 준비도 되지 않았다. 야구를 모르니 야구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 사전 동의 없이 라커룸을 찾아 가거나 공문 하나만 보내서 구단에 협조를 일방적으로 구하는 행태는 구단들의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
티빙은 정규시즌 주 1회, ‘슈퍼매치’를 선정해서 차별화된 현장 중계를 한다고 선언했다. 경기 시작 40분 전부터 스페셜 프리뷰쇼, 감독과 선수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경기 종료 후에도 리뷰쇼를 한다고 밝혔다. 사실 특별하지 않은 포맷이다. ‘ESPN’ ‘FOX스포츠’ 등 메이저리그 중계에서 볼 수 있는 포맷이다. 아울러 K리그 뉴미디어 중계권을 갖고 있는 쿠팡플레이가 주 1회 ‘쿠플픽’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프리뷰쇼의 무대 설치를 그라운드 외야 쪽에 하겠다는 티빙 측의 주장에 구단들은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시작 전 40분 전에 방송이 시작되면 그 전부터 무대 설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시간은 원정팀들의 훈련시간이다.
아울러 KBO가 홍보했던 40초 미만의 경기 쇼츠 영상 등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팬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공언도 사실상 허울 뿐이었다. KBO가 천명했던 보편적 시청권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팬들이 영상을 재생산 하는 권한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OSEN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2019년 통신 포털 컨소시엄이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을 맺은 직후, KBO리그를 지켜본 누적 시청자수는 8억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8억명이 무료로 볼 수 있었던 컨텐츠를 유료화 시켰는데 무료보다 못한 퀄리티라면 팬들도, 관계자들도 모두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행태는 프로야구를 만만히 본 것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여러 논란에 티빙 측은 지난 12일 ‘K-볼 설명회’를 열고 최주희 대표와 이현진 최고전략책임자, 전택수 최고제품책임자가 직접 참석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애썼다. 최주희 대표는 "주말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다. 무료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범경기 시작되고 나서 우려 섞인 목소리, 지적사항 잘 알고 있다. 티빙 직원이 불철주야 야구 팬들의 목소리, 커뮤니티의 얘기들을 보고, 기사도 모니터링했다. 시범경기 중계 서비스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많은 이슈들에 대해 저희 팀의 실시간 대응을 통해 바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조치를 취해서 마무리했고 아직 남아있는 이슈들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는 상황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KBO 중계에 있어 다양한 야구 파트너들이 계시는 만큼 파트너들과의 합을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아직 많은 염려와 우려 사항 있다는 걸 안다. 티빙이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정규 시즌에서는 제대로 된 중계 서비스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표의 이러한 반성에도 티빙이 쉽게 달라지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정규시즌 개막까지는 열흘도 남지 않았고 테스트 해야 할 시범경기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짧은 시간 모든게 달라질 수 있을까. 티빙은 한국 프로야구 산업화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jhrae@osen.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