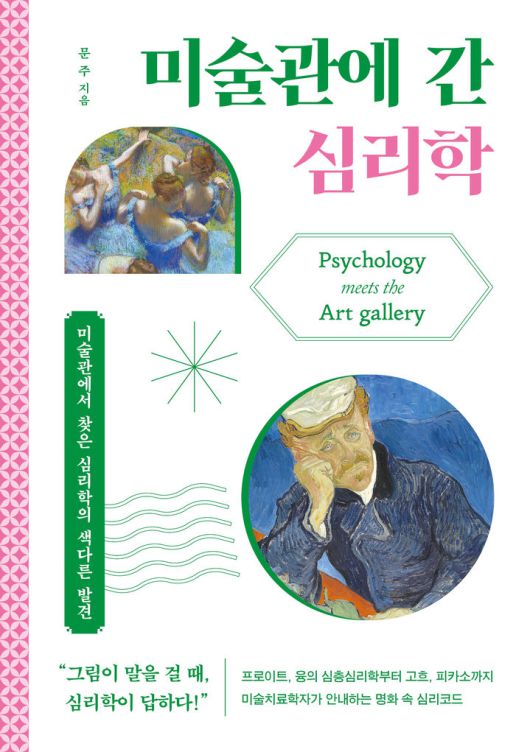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미술관에 가면 우리는 작품 앞에서 단순히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떤 그림은 오래전 잊혀진 기억을 불러내고, 또 다른 그림은 알 수 없는 불안이나 위안을 전해준다.
빈센트 반 고흐의 격정적인 붓질은 우울과 광기의 흔적을, 파블로 피카소의 파격적인 형태 해체는 인간 내면의 분열과 재구성을 드러낸다. 미술관은 인간 정신의 비밀이 응축된 공간이며, 그림은 마음의 거울이자 심리학의 생생한 텍스트다.
'미술관에 간 심리학'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심리학의 눈으로 그림을 바라보고, 그림의 언어로 마음을 다시 읽어내는 시도를 통해, 예술이 감상 차원을 넘어 어떻게 우리의 정서와 사고를 이해하는 창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고갱은 고흐에게 보이는 것만 그리지 말고 상상력을 표현하라고 강요했는데, 고흐는 모든 그림은 자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강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의 예술적 관점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고흐가 그린 두 개의 의자는 여러 관점으로 자주 분석된다. (중략) 고흐의 의자는 명확한 상징적 흐름이 있다. 아버지가 늘 피우던 파이프를 의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프로이트가 말한 거세 불안과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와 사랑, 증오가 모두 섞인 매개체라 볼 수 있다." (47쪽, 1장 미쳐야 그릴 수 있다?)
고흐는 "나는 명료한 정신으로 극도의 슬픔과 고독을 표현하려고 했다네"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를테면 '별이 빛나는 밤'의 소용돌이는 불안과 희망이 뒤엉킨 내면을, '해바라기'의 노란빛은 삶을 붙잡고자 한 열망을 보여준다.
이 책은 고흐의 붓질에 스며든 고독과 열정을 따라가며, 예술이 어떻게 한 인간의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는지 들여다본다.
"평론가들은 (프리다) 칼로를 초현실주의자로 봤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사실주의자라고 봤다. 칼로는 초현실이 아닌 가장 잘 아는 주제, 즉 자신과 슬픈 현실을 그렸기 때문이다. 칼로가 남긴 143점의 작품 중 무려 55점이 자화상이라는 점을 보면, 자신을 주제로 삼아 한 여성으로서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면모를 표현하는 것에 몰두했다는 걸 알 수 있다." (113쪽, 2장 내가 보는 나)
"인간은 초록색을 평화적이면서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색으로 인식한다. 어떤 지역에 충분한 녹지가 있다면 물이 있다는 것이고 물이 있다는 건 식량이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초록은 원시적, 본능적으로 인간을 달래주는 색이기도 하다. 하지만 초록은 독성, 질투, 초보자라는 상징 또한 강력하다." (192쪽, 4장 색이 말하는 것들)
이렇게 피카소의 '청색 시대'는 깊은 우울과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났다. 푸른빛으로 가득한 화면은 인간 존재의 고독과 슬픔을 압도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절망을 넘어선 감정의 울림을 남긴다. 이 차가운 색채 속에서 피카소가 어떻게 내면의 상처를 표현하고, 또 예술로 치유해나갔는지 흥미롭게 풀어냈다.
저자는 프랑스 에꼴 데 보자르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예술치료학 석사학위를,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임상미술치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입 신병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시행했고 다문화 부부, 장기 입원환자,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