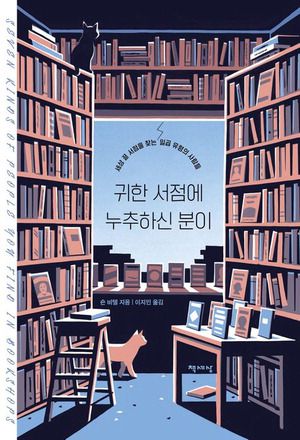 |
헌책방 주인이 집필한 책이라면 책을 향한 깊은 존중심과 서점 방문객을 바라보는 너그러운 시선이 배어 있으리라고 예상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최대 헌책방인 '더 북숍'의 주인이 쓴 책 '귀한 서점에 누추하신 분이'는 그런 예감을 시원하게 걷어찬다. 헌책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상행동'을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냉혹한 시선으로 해부해버리기 때문이다. 저자는 손님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비판을 퍼붓는데, 먼저 눈에 띄는 손님 유형은 '전공자'다.
'전공자' 부류는 헌책방 입장 때부터 의기양양한 표정이다. 주인에게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려고 서점에 방문한 것이 분명해서다. 주인이 그 분야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저들은 입이 어디에 걸린지도 모를 정도로 기뻐한다. 가령 '고생태학 복원으로 살펴본 연체동물군'이란 책을 문의하고는 헌책방 주인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하면 그들의 얼굴엔 멸시의 기운이 들이치고 이윽고 '연설'이 시작된다는 것.
또 다른 부류인 '고서 수집가'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에 불만을 표한다는 점"이라고 저자는 쓴다. 가격을 알려주면 뭔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젓고 "다른 곳에선 훨씬 싸게 판다"고 소리를 높인단다. 저자는 묻는다. 다른 헌책방이 더 싸게 판다면 왜 여기 와서 그 책에 눈독을 들이는 건지를. 또 다른 데서 더 싸게 판다고 책방 주인이 그 말만 믿고 책값을 깎아주지도 않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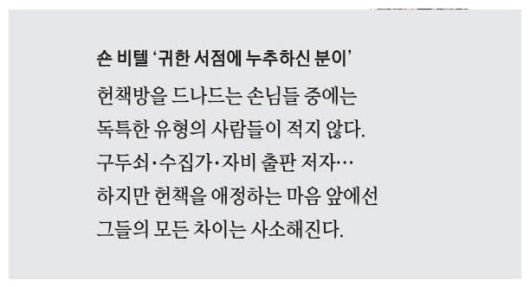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비 출판 저자'도 다소 위험한 부류에 속한다. 저자에 따르면 그들은 자비 출판물을 팔 생각은 조금도 없는 서점 주인을 "지루해 죽을 지경까지" 만들고야 만다. 헌책방 주인의 시간을 몇 시간쯤 낭비해야 직성이 풀리는 유형이랄까. 그들은 대개 자신이 '은퇴 후에' 쓴 자비 출판물을 소개한다. 넘쳐나는 시간, 단호한 결의가 대화에 섞이기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까지 된다.
'구두쇠' 유형도 눈길이 간다. 이들은 1726년 출판된 책이 6000파운드(약 1000만원)에 팔리는 상황에 분개한다. 불만의 이유는, 출간 당시 가격이 '1그로트'(약 4펜스)였다고 책에 적혀 있는데, 중고책 가격이 더 비쌀 수가 있냐는 것. 책의 저자가 '아이작 뉴턴'이고, 책 제목은 '수학 원리', 책의 상태가 'S급'임을 말해도 그들은 수긍하지 않는단다.
이 책은 헌책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 보는 인류학 보고서의 느낌이 강하다. 자지러질 듯이 유쾌해 독자를 웃음으로 무너뜨리고야 마는 오노레 드 발자크의 '기자(記者) 생리학'에서 구성의 힌트를 얻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특이한 제목에 펼쳤다가 쿡쿡 웃음이 터지기 시작하고, 결국엔 속으로 박장대소하게 된다.
웃다가, 웃다가, 또 웃다가 미소가 걷히는 순간이 온다. 책에 소개된 유형 중에 '나'도 포함돼 있지 않은가 싶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하지만 저 책에 내가 기록됐다 한들 뭐가 대수일까. 헌책방의 묵은내를 사랑한다는 공통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독자'라는 한 부류인 것을.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