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로 인한 차별과 냉대, 극복 과정 솔직하게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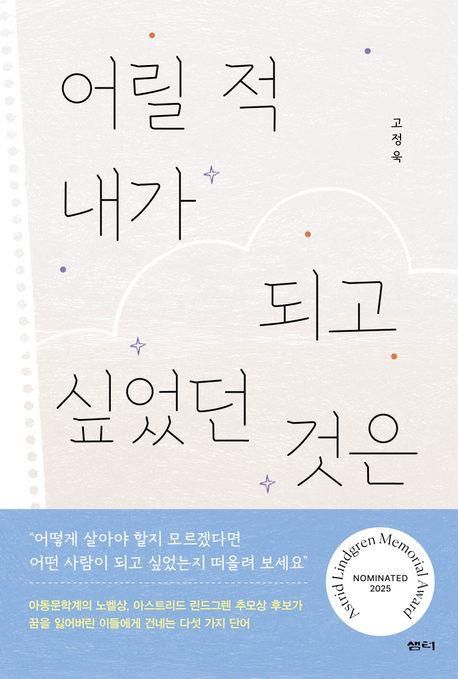 |
'어릴 적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은' 책 표지 이미지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장애가 있었기에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애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과 세상의 온기를 깨달았습니다."('들어가며' 에서)
장애를 딛고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와 '아주 특별한 우리 형', '가방 들어 주는 아이' 등 여러 아동문학 베스트셀러를 펴낸 작가 고정욱(65)이 에세이 '어릴 적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은'을 출간했다.
이 책은 갓난아이였던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인이 된 이야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차별과 냉대에 시달린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 눈길을 끈다.
저자는 "어릴 적 부모님에게 이웃집 할머니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니 해외로 입양 보내'라고 한 말은 가장 순화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자와 가족들은 이보다 더 심한 일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동료로부터 "저런 아이(장애인인 아이)는 방해만 될 뿐"이라며 "조용히 처리하라"는 조언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고, 작고하기 직전까지도 이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장애는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창 시절에는 의대 진학을 꿈꿨으나 '장애인은 응급 환자를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문과에 가게 됐고, 이후 국문학 박사 과정을 밟던 중에는 '칠판에 글을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의를 맡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강의를 맡지 못해 좌절하는 저자의 모습을 본 한 선배는 "가서 네 권리를 주장하라"고 따끔하게 조언했다. 이에 정신을 차린 저자는 학교 측에 강력하게 호소한 끝에 강의를 배정받았고, 이후 20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설 수 있었다.
저자는 이때를 떠올리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실패해도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한 좌절이 새로운 출발과 성공의 영양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스웨덴의 아동문학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ALMA·이하 린드그렌상)의 올해 후보로 오른 소감도 책에 담았다.
그는 "2024년 10월 우리나라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떠들썩했다"며 "솔직히 같은 작가의 입장에서 부러웠다. 저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털어놨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자는 린드그렌상 후보가 됐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았다. 당시를 떠올리며 저자는 "얼떨떨한 기분 끝에 깨달았다. 세상에는 눈 밝은 자가 있어 지켜보고 있음을"이라고 썼다.
비록 올해 린드그렌상은 프랑스 작가 마리옹 브루네에게 돌아가 고정욱은 수상의 기쁨을 누리진 못했지만, 상의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영예로 평가받는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돼 작가로 데뷔한 고정욱은 주로 장애를 소재로 한 동화를 써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 380권의 책을 펴냈고 총 500만부가량의 책을 판매했으며 연 300회가량의 강연을 다니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샘터. 244쪽.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