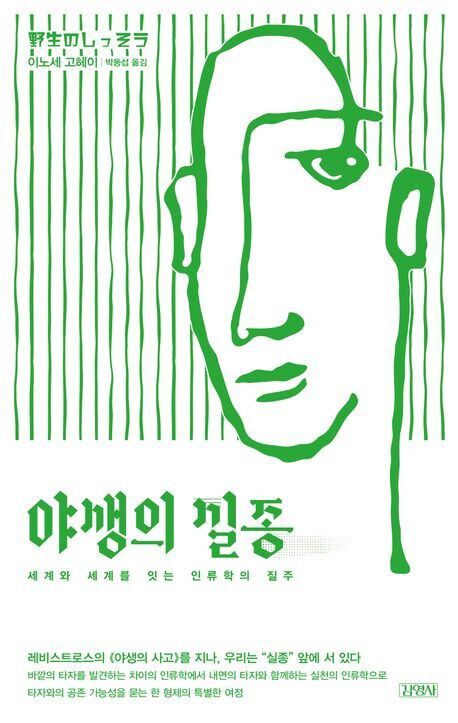 |
야생의 실종 l 이노세 고헤이 지음, 박동섭 옮김, 김영사, 1만8800원 |
“어느 날 동이 트기 전 모두가 잠든 우리 집에서 형은 사라져 버렸다.”
‘야생의 실종’은 이 한 문장에서 흘러나와 엉키고 꼬이고 뭉쳐진 선을 더듬는 책이다. 자폐증과 지적 장애를 가진 형이 이른 오전 집을 나가 활짝 핀 벚꽃 아래를 소리 지르며 달려갔다. 그리고 없어졌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두 달 뒤였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였다. 경찰은 ‘실종’이라고 규정할 그날의 사건을 동생인 저자는 ‘싯소’라고 부른다.
저자는 20년 이상 장애인류학을 연구해온 학자였다. 어린 시절 사람들이 형을 ‘장애아’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는 형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경험을 한다. 그 호명이 이 세계가 그와 형을, 나와 타자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선이란 사실을 알아차린다.
문화인류학의 오랜 주제는 타자였다. 형을 생각하며 선택한 학문이 “형을 타자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장애의 인류학’이 아니라 ‘장애와 함께 있는 인류학’을 고민한다. 학문적 거리두기로부터 거꾸로 거리를 두고 형이 ‘실종’이 아니라 ‘질주’하며 흘려둔 선을 따라간다. ‘실종’(失踪)의 일본어 발음인 싯소는 ‘질주’(疾走)와 발음이 같다.
“형의 세계를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좇아가면 싯소는 확실히 질주가 된다.”
형이 달려간 궤적, 형이 달려온 시간, 형과 연결된 이야기들을 되짚으며 몸과 장애, 나와 타자와 세계의 관계를 사유한다. 코로나19, 도쿄올림픽, 쓰쿠이야마유리엔 참사(2016년 장애인시설에 침범한 20대 남자가 “장애인은 없어져야 한다”며 19명을 살해하고 26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 등이 마디마다 교차하며 질문의 겹을 더하고 폭을 넓힌다.
꼬인 선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는 일은 단절된 존재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닿을 것인가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은 절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력적으로 확성되는 지금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함께 살아갈 순 있다는 책의 믿음은 우리 사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선이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