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전 세계를 떠받치던 시대 끝나"…'中 봉쇄선' 동맹 역할 강조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北…낮아진 '우선순위' 韓 구상에도 영향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 공개됐다. 미국은 NSS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동맹의 '책임 확대'를 강조했는데 우리의 외교적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가 전 세계를 떠받치던 시대 끝나"…'中 봉쇄선' 동맹 역할 강조
트럼프 행정부는 NSS에 인도·태평양을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격전지"로 규정하며,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명시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 역량 투입 등을 요구하며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한 동맹의 책임"을 강조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규슈·대만·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으로 대(對)중국 봉쇄선이다. 이번에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한 동맹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은,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 확대 가능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그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중국 관련 사안에도 관여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최근엔 주한미군이 북한보다 대만, 필리핀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통해 "동북아 안정의 핵심 기반 요소"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재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 사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 동참·방위비 증액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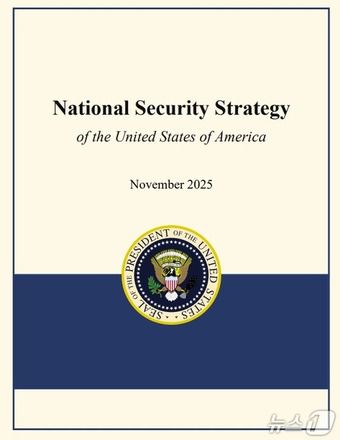 |
미국 백악관이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자료. |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 안 돼…"주한미군 임무 中 위협 대비로 이동"
북한이 이번 NSS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NSS에 북한이 17회 등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통적 역할인 북한 위협 대응에 힘이 계속해서 실리길 바라고 있다. 동시에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남북대화까지 관련 동력이 이어지게 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NSS에 북한 문제는 빠진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에 북한은 낮은 단계에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제1도련선 방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우선 과제이고 그 안의 핵심 동맹이 한국과 일본"이라며 "주한미군 임무가 북한 단독 대응을 넘어 중국 위협 대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기반 한중관계 발전' 실용외교에 도전 요인
이번 NSS에서 확인된 동맹을 통한 대중 견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하락은 '한미동맹 기반 한중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도 큰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입장에선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 및 때론 거절하며,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병행해야 하는 사안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NSS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 견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은 한국이 떠안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더욱 선명한 대중 견제 동참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견제 기조를 한국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 만큼, NSS 공개 전후에 따라 급격한 상황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틀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 왔다"며 "한국은 실용외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전히 있고, 디테일에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yoong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