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리포트] 로봇 심판의 시대, 인간 심판의 과제
승패 뒤바꾸는 찰나의 오심… 기술은 인간 한계 비추는 거울
1000분의 1초가 가르는 승부… 기술 도입 후 판정은 더 정확
손으로 반칙 골 넣었던 마라도나… “VAR 시대면 ‘신의 손’ 없었다”
기계의 정확함과 인간의 유연함… 조화 이룰 때 ‘스포츠 서사’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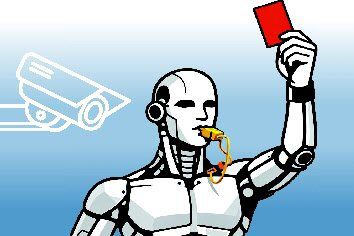 |
《‘로봇심판’ 시대에도 오심 논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다. 스포츠에서도 ‘로봇 심판’들이 인간 심판을 대신하고 있다. 오심은 줄었지만 경기의 맥락을 무시한 판정도 종종 나온다. 로봇의 정확성과 인간의 유연성이 만나야 스포츠의 서사가 완성된다.》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0.7초. KB스타즈는 신한은행에 60-61로 끌려가고 있었다. 한국 여자 농구 간판 슈터 강이슬(31·KB스타즈)은 작전시간을 마치고 나와 골 밑에 자리를 잡았다. 스로인 패스를 점프하며 받은 강이슬은 착지하자마자 몸을 돌려 슛을 던졌다. 강이슬이 코트에 넘어지는 순간 경기 종료 버저가 울렸다. 동시에 공도 림을 갈랐다. 62-61로 경기를 뒤집은 KB스타즈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환호했다.
신한은행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바로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공이 강이슬의 손을 떠날 때 0.2초가 남아 있었으니 득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심판진의 판단이었다. KB스타즈와 신한은행이 2025∼2026시즌 여자프로농구 1라운드 맞대결을 벌인 지난달 26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신한은행 코칭스태프는 체육관을 떠나기 전 중계방송사에 100분의 1초 단위로 당시 순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영상 분석 결과를 근거로 다음 날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규칙에 따르면 강이슬이 공중에서 패스를 받은 순간부터 시간이 흘러야 했다. 영상에서는 착지할 때까지 경기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
여자 프로농구에서 경기 종료 0.2초를 남겨 두고 역전 슛을 성공시킨 KB스타즈 강이슬. 영상 확인 결과 계시원이 버튼을 0.2초 늦게 누르는 바람에 이 골을 인정한 건 오심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농구에서는 계시원(計時員)이 버튼을 눌러야 경기 시간이 흐른다. 버튼을 늦게 누르면 경기 시간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 경기 계시원은 버튼을 0.2초 늦게 눌렀다. 신한은행은 강이슬이 슛을 던질 때 이미 경기가 끝나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WKBL도 “계시원의 조작과 비디오 판독 과정에서 오심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농구 계시원은 선수 손에 공이 닿는 걸 눈으로 확인한 뒤 버튼을 누른다. 사람이 시각 정보에 반응하는 데 보통 0.2초가 필요하다. 그래도 0.01초마다 한 장면씩 포착한 영상 기준으로 버튼을 늦게 눌렀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스포츠에서 기술은 때로 인간의 태생적 한계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 계시원은 두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 1000분의 1초도 놓치지 않는다.
 |
2024년 파리 올림픽 남자 육상 100m 결선 최종 순위 판독 사진. 파리 올림픽 때는 1초당 사진 4만 장을 찍는 초고속 카메라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오메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육상은 농구보다 더 ‘찰나’에 희비가 갈리곤 한다. 승자가 가장 빨리 나오는 남자 100m가 올림픽의 ‘꽃 중의 꽃’으로 통하는 이유다. 올림픽 남자 100m 결선이 끝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팬들의 함성으로 스타디움이 가득 차기 마련. 지난해 파리 올림픽 때는 달랐다. 경주가 다 끝나고도 적막만 가득했다. 노아 라일스(28·미국)와 키셰인 톰프슨(24·자메이카)이 똑같이 9초79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육상 공식 기록은 100분의 1초 기준이다. 단, 100분의 1초까지 똑같을 때는 1000분의 1초까지 따진다. 이날 라일스는 9초784로 톰슨(9초789)보다 1000분의 5초가 빨랐다(육상 공식 기록은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으로 계산한다). 이 차이를 판별할 수 있었던 건 1초에 사진 4만 장을 찍는 초고속 카메라 덕이었다. 심판진이 사진을 판독해 라일스의 우승을 확정하는 데 10초 정도 걸렸다.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오메가는 “보통 3초 정도면 판독이 끝나는데 이번에는 차이가 워낙 근소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육상 순위 판정에 카메라를 처음 활용한 올림픽은 1912년 스톡홀름 대회였다. 당시에도 출발 총성과 함께 작동하는 초시계가 있었다. 대신 시계를 멈춰 기록을 확정하는 건 인간 심판 몫이었다. 선수 한 명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주심이 초시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도 사진을 찍었다. 당시에는 필름 대신 ‘사진판(photographic plate)’을 썼다. 유리로 만든 사진판은 암실에서 현상을 거쳐야 해 결과를 확인하는 데 최소 15분이 필요했다.
이 대회 남자 1500m에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사진 판독을 통해 메달 주인공을 가렸다. 올림픽 신기록(3분56초8)을 세운 영국의 아널드 잭슨(1891∼1972)이 금메달리스트인 건 확실했다. 문제는 당시 세계기록 보유자였던 에이블 키비앳(1892∼1991)과 노먼 테이버(1891∼1952·이상 미국)가 똑같이 3분56초9를 기록했다는 점이었다. 사진 판독 결과 잭슨이 결승선을 통과한 시점에 키비앳이 테이버보다 앞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에는 1위 선수 통과 시점에 사진을 딱 한 장만 찍었기에 지금만큼 결과가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이 ‘포토 피니시’ 기술 도입 이전보다는 사정이 확실히 좋아졌다. 그전에는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심판진의 다수결 투표로 순위를 정했다. 인간의 감각과 판단에 의지해야 했기에 오심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 오심은 경기의 일부가 아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오심 위험이 가장 줄어든 종목은 야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09년부터 비디오 판독 제도를 통해 각 팀에 심판의 순간적인 판단 미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흔히 ‘로봇 심판’이라고 부르는 볼·스트라이크 자동 판정 시스템(ABS)도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ABS는 투구 위치를 0.01cm까지 추적해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는지 판정한다.
야구팬들은 ABS 도입을 크게 반겼다. KBO는 프로야구 출범 후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한 지난해 야구팬 8000명에게 ‘리그 운영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제도’를 꼽아달라고 했다. 가장 많은 88.7%가 ABS를 꼽았다.
반면 축구에서는 비디오 판독(VAR·Video Assistant Referee)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2016년 클럽 월드컵 때 VAR을 시범 도입하자 찬성파는 “언제까지 오심이 경기의 일부가 되어야 하냐”며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반대파는 “축구는 흐름의 경기인데 VAR은 흐름만 끊어 놓을 뿐”이라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
디에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오른쪽에서 두 번째)에게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안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 후반 경기 장면. 당시에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없어 마라도나가 왼손으로 골을 넣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 출처 국제축구연맹(FIFA) 홈페이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미있는 건 ‘신의 손’ 디에고 마라도나(1960∼2020·아르헨티나)가 VAR의 대표적인 찬성파였다는 점이다. 마라도나가 이 별명을 얻은 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였다. 마라도나는 잉글랜드와 맞붙은 대회 8강전 때 0-0으로 맞서던 후반 5분 상대 골키퍼와 공중볼을 놓고 경합했다. 이 공은 헤더를 시도하며 뛰어오른 마라도나의 왼손에 맞고 그대로 잉글랜드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경기 후 논란이 일자 마라도나는 “내 머리와 신의 손이 함께 골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세월이 흘러 VAR 도입을 반기면서 “당시에도 VAR이 있었다면 신의 손은 없었을 것”이라며 웃었다.
축구에서도 이제 오프사이드 여부는 로봇 심판이 판정한다. FIFA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을 도입한 뒤 생긴 변화다. SAOT는 공과 선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한 뒤 인공지능(AI)에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공 안에 들어 있는 센서가 1초에 500번씩 현재 위치를 송출하고 경기장 지붕에 설치한 카메라 12대가 선수별로 신체 29개 지점을 1초에 50번씩 추적하면서 AI 판정을 돕는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 트로피는 ‘마라도나의 후예’인 아르헨티나에 돌아갔다. 사실 조별리그 첫 경기가 끝났을 때만 해도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점치기는 쉽지 않았다. SAOT표 ‘예방 주사’를 제대로 맞았기 때문이다. 당시 FIFA 랭킹 3위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51위)에 1-2로 무릎을 꿇었다. 아르헨티나는 이 경기에서 사우디 골망을 총 4번 흔들었지만 SAOT가 연이어 오프사이드로 판정하면서 한 골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한국 TV 중계진이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할 정도로 SAOT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렸다.
● 로봇 심판은 신이 아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술’이 판정에 깊숙이 개입하면 할수록 판정은 더욱 정밀해지게 마련이다. 야구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는지, 축구공이 골라인을 넘어섰는지 따지는 건 사람 눈보다 카메라가 더 정확한 게 당연하다. 육상에서 사진 판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스포츠에는 ‘완벽한’ 판정보다 ‘납득할 만한’ 판정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상황과 맥락을 이해해야 올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회색지대’에서 특히 그렇다.
축구 규칙에는 상대 팀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 때 고의로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게는 무조건 퇴장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DOGSO(Denial of an Obvious Goal-Scoring Opportunity)’ 조항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골대까지 거리 △플레이 방향 △수비수 위치와 숫자 △공 점유 가능성 등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칙의 고의성을 판단한다. 이때 ‘의도가 명백했는가’를 로봇 심판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스포츠 물리학 권위자 존 에릭 고프 미국 린치버그대 교수는 “기술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는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접촉이 반사적인 움직임이었는지, 의도적인 방해였는지는 판단하지 못한다. 물리학은 충돌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반칙을 정의할 수는 없다”며 “로봇 심판은 움직임만 보지만 인간 심판은 움직임의 이유도 본다”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기술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도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초시계를 0.2초 늦게 눌렀다거나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0.78cm 비켜갔다는 ‘물리적 사실’은 기계의 영역이다. 하지만 선수의 심리와 경기 흐름을 읽는 ‘서사적 진실’은 여전히 사람 몫이다.
요컨대 로봇 심판은 명백한 오심을 바로잡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경기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기계의 차가운 정확함과 인간의 유연한 통찰이 조화를 이룰 때 스포츠 팬들은 경기의 본질에 오롯이 몰입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잊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럭비 유니언에서 명심판으로 이름을 날렸던 앨런 루이스는 “심판의 목표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경기는 판정을 꽤 잘한 경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기술의 존재도, 심판의 이름도 물러난 그 지점에서 스포츠는 비로소 각본 없는 완벽한 드라마가 된다.
조영우 기자 jer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