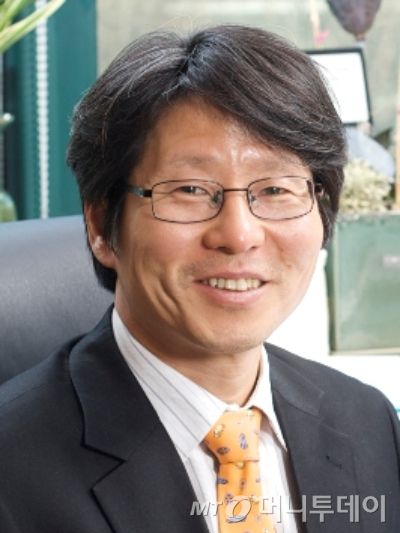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정유신 |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중국의 성장률도 2024년 5.0%나 2025년 4.9~5.0%(추정)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시장의 답은 'No'(노)다. 중국 정책기관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DRC)와 사회과학원(CASS)은 각각 4.5%와 4.3~4.6%, IMF는 4.5%, 골드만삭스도 4.7~4.8%로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중국 정책기관의 전망이 글로벌 기관보다 더 낮은 점이 눈에 띈다.
왜 그럴까. 그 배경으론 중국 정부의 '양(量)에서 질(質)로의 정책전환'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제14차 경제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에는 코로나19 충격 회복을 위해 5% 내외의 고속성장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지난해 말 소비재 교체 보조금과 설비투자 확대로 성장률을 약 0.2% 끌어올린 것도 같은 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15차 경제 5개년 계획(2026~2030년)부터는 정책의 중심축이 질적 성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2035년 목표인 '중등 선진국 수준'을 달성하려면 성장의 속도보다 기술자립과 중산층 확대 등 성장의 질이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양적 성장엔 전보다는 여지가 생겼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제15차 기간 연 4% 중반, 제16차(2031~2035년) 연 3% 중반의 성장률이면 2035년 목표인 1인당 소득 2만~3만달러 달성에도 큰 무리는 없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4% 중반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책전환과는 별개로 부동산 위기·내수침체·고용불안이라는 '삼중고'도 중국 성장률의 하락요인이다. 중국의 부동산업은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며 지난 30년간 중국 고성장을 뒷받침해온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였다. 하지만 고령화·출산율 저하 등 인구구조가 일변하면서 되레 성장을 가로막는 애물단지가 됐다. 구조조정 장기화로 오히려 성장의 제약요인이 됐고 그 여파로 소비와 민간투자 증가율은 각각 연 4~5%, 1% 내외로 과거 대비 3~5%포인트, 6~8%포인트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부채부담이 GDP의 300%를 넘나드는 점도 재정확대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는 대신 기술자립과 실질 생산력 강화 등 질적 정책전환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AI·전력장비 등 전략 분야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2~3배로 GDP의 1%(240조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0%까지 확대될 거라고 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에서 과당 경쟁과 기업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한 '내쥔'(內卷)에 대해선 카운터 정책의 일환으로 공장 신·증설 규제와 구조조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무튼 중국의 '양에서 질로의 정책전환'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다. 대중 수출이 20%인 우리로서는 중국의 양적 성장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뿐 아니라 중국의 질적 성장 강화로 반도체·전자 등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꼼꼼한 정책검토와 함께 신속하고 보다 전향적인 민관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