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 의무 공천제·가산점’ 도입 통해 정치 참여 확대 모색
새 당명 개정 TF도 전부 청년 당원으로 구성
장동혁 “청년 진입 장벽 낮춰 당 이끌 유능한 인재 육성할 것”
청년 당원 반응 엇갈려…“당 변화하려 노력 vs 표 얻으려는 전략”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이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며 오는 6월 지방선거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핵심 기구인 당 인재영입위원회와 공약개발본부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인재 영입과 정책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가 2030 세대 민심을 선점해 수도권과 주요 격전지에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와 공천 기회 보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도부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로 여성과 청년을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을 통해 청년 인재를 적극 영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청년과 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경선 득표율에 최대 20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기조를 ‘청년과 미래’로 정하고 당의 정책과 공천 전략을 청년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 발굴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방선거 승리라는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청년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겠다”며 “2030 인재 영입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선발된 인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이후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새 당명 개정을 맡은 태스크포스(TF) 역시 위원 전원을 마케팅·디자인 분야 전문가이자 청년 당원 33명으로 구성했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당의 주체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취지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청년 당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청년 중심 정책과 공천 구조가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단기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0년째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 중인 박모(33) 씨는 “그동안 청년 정책이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껴왔다”며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과 공천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여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의무 공천제’와 경선 가산점 제도에 대해 그는 “이제 청년들도 당에서 오래 활동한 인물이나 현역 의원들과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청년 후보가 실제로 당선될 기회가 늘어난 만큼 정치 참여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2021년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입당했다는 한모(27) 씨는 “지도부가 ‘청년’을 강조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더라도 여전히 공천을 받거나 당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기는 쉽지 않다”며 “영입되는 청년 인재 역시 평범한 청년보다는 고학력·엘리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과연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이번 변화가 지도부의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청년 중심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청년 위주의 정책과 공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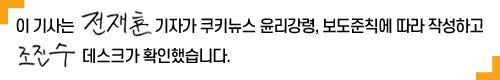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