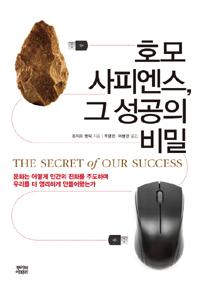 |
"인간을 이해하는 잘못된 방식은 우리가 비록 털은 다소 적지만, 정말로 영리한 침팬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관점은 놀라우리만치 흔하다."
인간이 지구 최고 종(種)으로 진화한 비결에 대해 흔히 세 가지 설명이 제기된다. 첫째는 일반적 지능과 정신적인 처리 능력이고, 둘째는 수렵 채취 시절 자연환경에서 생존하려고 진화시킨 고도의 정신 능력, 셋째는 인간 사이 협력을 가능하게 한 협력 본능(사회 지능)이다.
셋 다 '지능'으로 꿸 수 있는데, 책에 따르면 "어느 것도 생태적 우세 또는 우리 종의 독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뇌 크기는 생존력과 무관했다. 상상을 해보자. 인간 49명과 원숭이 50마리로 나뉜 두 영장류 무리가 생존 대결을 벌인다. 두 팀 모두 외딴 열대림에 떨궈 2년 후 어느 쪽이 많이 살았는지 관찰해본다. 양쪽 모두 장비는 쓸 수 없다. 성냥, 물통, 칼, 신발, 안경, 밧줄 등 어떤 도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팀이 이겼을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생존과 번성은 문화에서 비롯했다는 게 책의 핵심이다. "인간의 유전적 진화를 주도하는 중심이 되는 힘은 수십만 년 동안, 또는 더 오랫동안 문화적 진화였다는 사실이다. 문화적 진화의 결과들은 깊고도 넓게 퍼져 있다." 여기서 문화란 전승 개념이다. 인간이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습득하는 것인데 관행, 기법, 도구, 동기, 가치, 믿음 따위의 덩어리라 보면 된다.
인간의 진화가 문화라는 덩어리에 의존해왔다는 주장은 매우 전복적이다. 문화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진화의 추동체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책에는 이 역발상을 입증하는 자료와 사례가 가득한데 하나하나 설득력 있다. 문화와 유전자는 상호작용하며 진화했다는 것, 즉 '문화·유전자 공진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책은 인간 이해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김시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