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조현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초기 증상이 청소년의 사춘기 행동과 유사해 빠른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신질환 상담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한 학부모들의 거부로 상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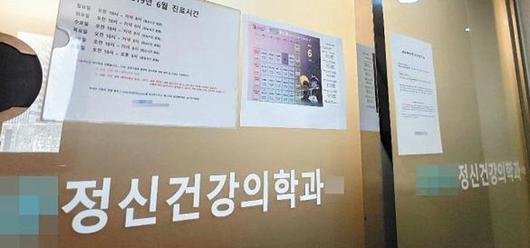 |
조현병은 청소년기 발병률이 41.9%에 달할 정도로 높다. 그렇지만 초기 증상이 사춘기 행동과 유사해 진단이 어렵고, 사회적인 낙인을 우려한 학부모의 반대로 상담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의사단체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피해의식 또는 자의식 과잉 등 사춘기 행동 유사
조현병은 사고와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다.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 환시·환청 등 환각증상과 자신을 과대·과소평가하고 밖에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각종 망상증상을 동반한다. 과거엔 정신분열증으로 불렀지만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조현병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조현병 초기 증상은 사춘기에 나타나는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흔히 조현병 초기 증상을 일탈현상이라고 부른다. ▲잘 씻지 않거나 청소를 하지 않는 현상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을 크게 보이거나 반대로 전혀 관심이 없는 현상 ▲수면시간이 불규칙적이고 밤낮이 바뀌어 생활하는 현상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한 현상 ▲심한 분노를 표현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현상 ▲집중을 못하고 이유 없이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 ▲말수가 줄고 깊은 생각에 빠져드는 현상 등이다.
하지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간사(서울 은평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예민한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상담 결과 조현병으로 드러났다"며 "학부모가 크게 놀라 즉시 상담치료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 간사는 이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상담 중 종종 발견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진단이 쉽지 않다 보니 전문가들은 빠른 상담과 치료를 당부한다. 특히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청소년기 발병률이 높은 게 특징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 400명을 지난해 실태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발병률은 29.5%로 가장 높았다. 대학생 20.9%, 직장인 13.9%, 군 제대 후 8.6%, 중학생 7.8%, 초등학생 4.6%, 대학원생 1.1% 순이다(기타 13.7%).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발병률도 41.9%에 달했다. 청소년기가 조현병을 찾아내 치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인 셈이다. 이 시기엔 상담·약물치료로 70~80% 완치가 가능하지만, 늦어질수록 치료효과가 감소한다.
◇학업스트레스 줄이고 아이 행동 변화 관심 가져야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는 특히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입시압박과 경쟁에 노출돼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이 반복되면 조현병이 생길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학업 진도를 쫓아가지 못하거나 외부와의 대화를 단절하는 모습 등이다.
노성원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처음엔 그저 사춘기에 보이는 스트레스성 행동이었더라도 유사한 경험을 자주하면 조현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가 관심을 갖고 대화와 관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섣부른 조언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조언을 공격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공감하면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지만 실제론 정신과 상담을 거부하는 학부모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다. 서울 중랑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검사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상담을 위해 학부모에게 연락했지만 '사춘기라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며 "결국 전문상담을 받지 못한 채 졸업했다"고 전했다.
학부모가 전문의 상담을 피하는 이유는 정신질환 상담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다. 하 간사는 "아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펄쩍 뛰며 믿지 않으려는 학부모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상담을 한 사실이 낙인이 돼 학교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졸업 뒤 진로에도 영향을 줄까봐 선뜻 상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 반발 완화할 '지역 전문의 자문제도 시급'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소년 정신질환을 살피는 일선 학교의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검사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조사다.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상태 등을 진단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교내 상담을 하거나 위센터 또는 시·군·구에 설치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증진센터로 인계한다. 이곳에서 상담을 계속하거나 정신과 전문의 상담으로 다시 이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센터로의 인계가 불가능하다.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 검사와 상담 결과가 모두 민감한 의료정보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국민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검사나 진단을 했다는 사실이 밖으로 드러날 위험이 없지만, 학부모들의 막연한 두려움 탓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붕년 서울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교육청별 상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자문제도를 구축하고, 교사가 아닌 전문의가 직접 학부모를 설득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 조선에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