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스 캐럴 오츠 신작 ‘카시지’ / 사랑을 거부당한 자폐 소녀의 실종 / 살인범 몰린 상처 투성이 전쟁영웅 / 폭력에 휩쓸린 사람들의 고통 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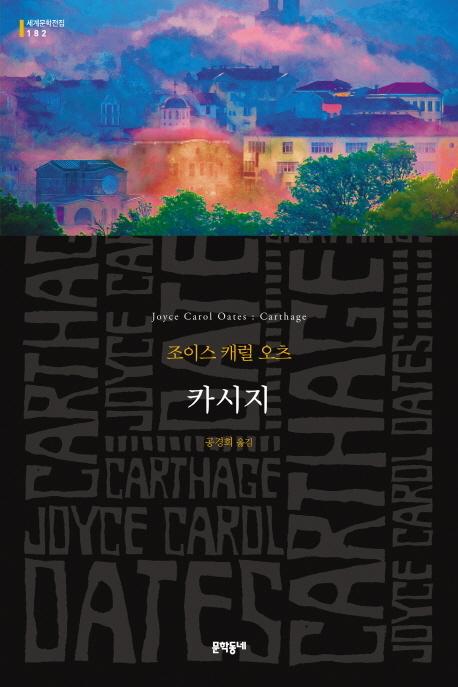 |
영미권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돼온 미국 원로작가 조이스 캐럴 오츠(81)의 신작 장편 ‘카시지’(공경희 옮김·문학동네)가 국내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다산성 작가로 소문난 오츠는 팔순을 넘긴 지금까지도 왕성한 필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 번역된 ‘카시지’는 전쟁이라는 이름의 국가 폭력과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개인의 폭력, 사랑과 용서에 대해 집요하게 탐색하는 작품이다. 세밀하고 유장하게 지치지 않고 풀어나가는 오츠 특유의 이야기 솜씨가 여전히 빛을 발한다.
미국 뉴욕주 북부의 소도시 카시지에서 메이필드가는 유명한 집안이다. 이 집의 19살짜리 작은딸 크레시다 메이필드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실종된다. 마지막까지 크레시다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이라크전 참전병 출신인 브렛 킨케이드 상병. 언니의 약혼남이었던 이 남자의 지프 안에서 크레시다의 혈흔이 발견되고 강가에서는 그녀의 스웨터도 나온다. 브렛은 경찰의 취조에 횡설수설하다가 본인이 크레시다를 죽여서 유기했노라고 자백하기에 이르고, 시체를 찾지 못한 재판에서 그는 그가 원했던 사형 대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간다.
 |
팔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현역 작가인 미국 소설가 조이스 캐럴 오츠. 그는 “삶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창조력”이라면서 “개인으로서의 작가는 사라져도 에너지는 예술작품에 담기고, 그 안에 갇혀서 누군가 시간을 내서 다시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동네 제공 |
여기까지만 읽고 나면 전형적인 미스터리 장르소설로 여겨지기 쉽지만 이후 이어지는 전개가 간단치 않다. 이라크전 영웅으로 짐짓 추앙되지만 실제로는 얼굴과 두개골과 다리까지 망가져 돌아온 상이용사 브렛은 마음까지 황폐해진 존재다. 브렛의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언급을 삼가지만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소연한다.
“대형 석유사업가들이 그들을 매수해서 석유를 확보하려고 아랍에 들어가는 거야. 자본가들이 빌어먹을 큰 송유관을 꽂는 거지. 그게 부시가 전쟁을 선포한 이유야! 가여운 브렛, 우리 애는 쥐뿔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지만, 그런 건 금방 알게 돼. 가여운 이 미련한 아이가 이른바 부-수-적 피해라는 걸 입었는데, 일단 군복을 벗으면 아무도 신경 쓰질 않아.”
브렛은 동료 병사들이 이라크 민간인 소녀에게 저질렀던 참혹한 행위를 목격한 탓에 오히려 음모에 휘말려 죽음의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처지다. 사회 부적응자이긴 마찬가지인 크레시다가 그를 짝사랑해 고백하다가 거부당하자 처절한 배신감에 휩싸인 채 자발적인 실종에 돌입한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은 적 없는 사람, 귀여움 받은 적 없는 사람”이니 “쓰레기처럼 강물에 떠내려가다 사라지는 것이 더 나았다”고 되뇐다.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초적인 복수’를 감행한 셈이다. 크레시다의 실종으로 인해 그녀의 부모는 이혼하고 언니는 크나큰 상처를 안고 먼 곳으로 떠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브렛이 교도소에서 고통받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오츠는 이러한 서사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미국 인권단체의 ‘이노센트 프로젝트’를 들여다본다. 자발적 실종 상태의 크레시다가 다른 이름으로 살면서 이 프로젝트에 관한 르포를 쓰는 연구원의 조수로 참여해 미국의 인권 실태를 탐사하게 된다. 마지막 ‘귀환’의 장에 이르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7년 만에 그녀가 나타남으로써 어떻게 다시 합치고 사랑과 용서의 단계에 이르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요. 부적응자들, 별종들… 브렛 나는 알아요, 이제 그 누구도 나처럼 당신을 사랑할 순 없다는 걸. 이제 당신은 변했어요. 내가 당신을 넘치도록 사랑할 거라고 장담해요. 내가 두 사람분의 충분한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문제될 건 없어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크레시다의 ‘자폐증’에 가까운 ‘경계성 인격장애’가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그녀가 호소하는 사랑의 감정은 절절했다. 그 감정이 쓰레기처럼 취급됐을 때 느꼈을 분노와 자발적 실종의 다짐은 애절하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이라크로 갔고, 그곳에서 참혹한 폭력을 경함한 뒤 고향 땅에서 파혼에 이른 뒤 혼몽한 상태에서 전쟁터인지 경찰서인지 헷갈리는 정신으로 ‘자백’에 이른 브렛 상병의 처지도 안타깝기는 매한가지다. 전쟁이라는 국가의 큰 폭력은 개인의 폭력으로 이어졌고, 그 폭력은 사랑을 파괴했으며, 용서는 다시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었다. 그러므로 크레시다가 모든 것을 원상으로 돌리기 위해 깊은 영혼의 방황을 통해 속죄의 다짐을 하는 것은 작가가 찾은 최상의 결론일 터이다.
“나는 브렛 킨케이드와 세상을 잇는 고리가 될 것이다, 그가 허락해준다면.”
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