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균 한국형사정책硏 연구위원 / “학계 ‘연령 상향’ 기본권 침해로 여겨 /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축소 시각도 / 성매매 등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 / 16세로 하되 동의 상관없이 처벌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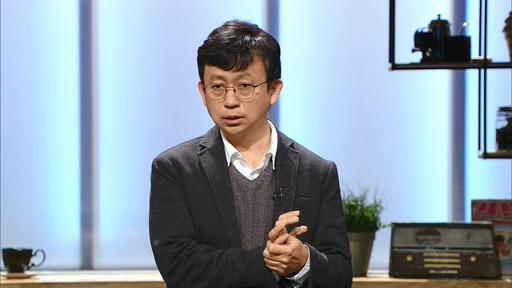 |
“이제는 우리 사회도 ‘단호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가만 놔두기엔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동안 현행 13세인 ‘성적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을 올리자는 주장은 꾸준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입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취재팀은 지난 16일 김한균(사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연령 기준 왜 안 바뀌고 있나.
“일단 형법학자들이 대단히 보수적이란 점을 들 수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확대되면 시민의 자유가 축소된다’고 믿는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느냐’ 하며 주저하는 것이다. 또 일부 여성단체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축소를 우려한다. 아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 추진력을 얻기 힘들었다. 물론 이런 시각들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있기엔 아동 성착취 범죄가 너무 만연한 실정이다.”
-13세가 왜 문제인가.
“아동에게 행위의 책임을 묻기엔 13세 기준은 너무 낮다. 예컨대 가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언뜻 자유 의사로 보일지라도 잘 뜯어보면 사회적·구조적 문제다. 이 아이들은 근본적으로는 ‘피해자’다. 그럼에도 국가는 아이한테 ‘너희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 아동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할 자유’를 보장하는 셈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성인이 아동과 성적 관계를 가졌을 경우 책임을 묻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럼 몇 살이 적정한가.
“연령은 무척 논쟁적인 주제다. 중요한 것은 이 동의 연령이 ‘가변적’이란 점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해 계속 연령 기준을 손질했다. 이 문제는 이제 생물학적이라기보다 사회학적 문제가 됐다. 우리 사회도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 16살로 하되 그 이상 청소년도 고용 등 신분관계나 신뢰관계를 따지는 게 어떨까 싶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교사, 기업주, 성직자 등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하는 것이다.”
 |
-청소년끼리의 관계는 어떡하나.
“동의 연령을 상향하더라도 청소년끼리 좋아서 하는 자연스러운 관계마저 범죄로 볼 수는 없다. 우리 정서상 용인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이른바 ‘로미오와 줄리엣법’ 등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성인과 아동의 성적 관계이다. 우리 사회의 논의 역시 성인의 아동 성착취에 집중해야 한다. 아이와 성인이 설령 ‘사랑’했다고 해도 사회적 위치와 관계성을 감안하면 성 착취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법률 개정만 중요한 건가.
“아무리 법을 바꿔도 결국 판결은 판사의 자유심증에 따라 내려진다. 현재 판결들을 보면 성범죄 피해 아동들한테 ‘피해자다움’을 요구한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한 시각이다. 예컨대 살인을 저지르고도 태연히 웃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 ‘왜 애정 표현을 했느냐’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등 질문은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따로 교육을 받지 않는 한 판사들도 ‘생애 경험’에 갇힐 수밖에 없다. 판사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아동의 성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김민순·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