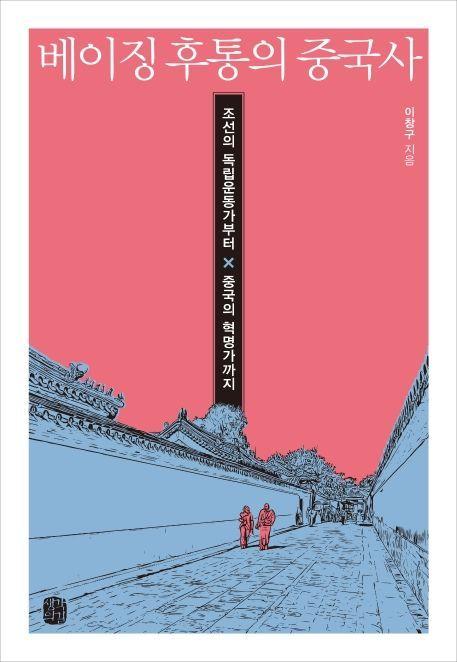 |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단재 신채호는 1920년 4월 여성 독립운동가 박자혜 여사와 중국 베이징의 진스팡제 21호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신채호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과 자금성 뒤쪽 징산공원 옆 5ㆍ4따제에 있는 베이다홍러우를 자주 찾았다.
박자혜 여사는 베이징의 번화가 왕푸징에서 멀지 않은 셰허병원이 1920년 개원했을 때 간호사로 들어가 일했다. 셰허병원 옆에는 중화성경회 옛 건물이 있다. 1920년 고려기독교청년회 본부가 있었던 곳으로 도산 안창호는 이곳에서 회원들의 애국심 고취 강연회를 자주 열었다. 베이징 둥창 후통 28호에서는 1994년 1월16일 이육사 선생이 순국했다.
둥창 후통 28호 말고도 앞서 언급한 진스팡제 21호, 베이다홍러우, 셰허병원, 중화성경회 옛 건물 등 모두 베이징의 후통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후통은 전통 뒷골목을 뜻한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 종로나 을지로의 뒷골목이다. 베이징의 후통은 원나라 건국 때부터 조성돼 800년 역사를 자랑한다.
베이징 하면 으레 천안문 광장, 자금성, 북해공원, 이화원, 만리장성, 왕푸징 등 잘 알려진 명소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베이징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다면 명소뿐 아니라 뒷골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라오베이징(베이징 토박이)들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후통은 광대하다. 자금성을 중심으로 3000여개 후통이 실핏줄처럼 뻗어 있다. 지금은 베이징을 대표하는 번화가가 된 왕푸징도 도심 한복판을 가르는 전통 후통이 크게 확장돼 쇼핑 거리로 단장된 곳이다.
'베이징 후통의 중국사'는 베이징 뒷골목까지 샅샅이 훑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베이징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지은이 이창구는 서울신문 현직 기자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3년6개월간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다. 특파원에게 베이징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날마다 기사 마감에 시달리는 특파원 생활 자체가 바쁜 데다 사회주의 국가의 수도인 만큼 제한도 많다.
그래서 지은이는 오히려 베이징 현장에서 중국에 대해 더 큰 갈증을 느꼈다. 그러던 중 베이징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후통을 돌아다녀 보라는 조언이 있었다. 이후 그는 주말마다 후통을 돌아다녔다. 중국에 대한 갈증은 이렇게 해소했다. '베이징 후통의 중국사'는 당시 발품을 판 결과물이다.
후통 곳곳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책은 여섯 개 장으로 구성돼있다. 지은이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만으로 첫 장을 채웠다. 그만큼 후통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암 박지원이 다녀간 공자 사당 공묘와 원텐샹(남송 시대 마지막 재상) 사당도 후통에서 만날 수 있다.
지은이는 후통의 거리ㆍ건물과 관련된 인물을 찾고 역사·문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국 역사 속 인물들이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낯익은 이름도 종종 눈에 띈다. 중국의 혁명가로 베이징대학 총장을 지낸 차이위안페이, '아큐정전'의 작가 루쉰이 대표적인 예다.
후통의 대표격인 난뤄구샹에서는 '중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치바이스의 옛집을 만날 수 있다. 치바이스는 올해 예술의전당 전시를 통해 작품이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지난해 12월5일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같고도 다른: 치바이스와 대화전'이 열려 중국 유일의 국가미술관인 중국미술관 소장품 116점이 전시됐다. 후궈쓰제에 있는 인민극장은 과거 대형 경극이 공연됐던 베이징을 대표하는 극장이었다. 후궈쓰제 9호는 대표 경극 배우인 메이란팡이 살던 곳으로 지금은 메이란팡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극장은 올해 3월 초연한 창극 '패왕별희'의 연출을 대만의 경극 배우이자 연출가인 우싱궈에게 맡겼다. 경극에서는 남성 배우가 여성 역할을 맡는 게 전통이었다. 우싱궈는 전통에 따라 주인공 우희 역을 국립창극단 소속 김준수에게 맡겼다. 당시 우싱궈가 경극에서 여성 역을 맡은 대표적인 남성 배우의 예로 든 이가 바로 메이란팡이다.
(이창구 지음/생각의길/1만6000원)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