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마후라, 후회 없이 살았다 - 제132화(7649)
설날이면 생각나는 것들
스타 배우 잡으려고 충무로 난리
64년에는 주연작 네 편 동시 개봉
‘연산군’의 지극한 효심 잊지 못해
온 국민 울린‘저 하늘에도 슬픔이’
 |
1980년대 중반 설날 연휴에 모인 신영균씨 가족. 신씨는 ’팬들 덕분에 오늘까지 왔다“고 말했다. [사진 신영균예술문화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나이를 먹는다는 것. 여든이 넘어서부터는 거의 잊고 사는, 아니 잊고 살려는 일이다. 하나둘 늘어가는 나이테를 의식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다. 내일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보니 이제 꽉 채워 아흔셋이라는 게 새삼 실감 난다. 당뇨 때문에 떡국을 잘 안 먹는 편이지만 “혹시 떡국을 안 먹으면 더 천천히 늙으려나” 하는 싱거운 상상도 한번 해본다.
당뇨 때문에 설날 아침에 떡국 못 먹어
설날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많지 않다. 어릴 적 설날 풍경이 어렴풋이 그려지는 정도다.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에도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고 어른들께 세배를 올렸다. 지금은 갈 수 없는 고향, 황해도 평산의 산과 들이 그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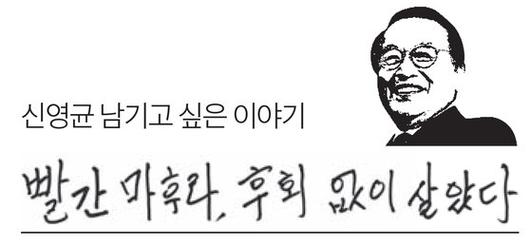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60년 영화 ‘과부’의 주연 배우로 공식 데뷔하고 나서는 설날의 의미가 좀 달라졌다. 당시 극장가에서 설 연휴는 한해 최고의 대목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놀거리가 적었던 반세기 전에는 훨씬 더했다. 영화 제작자들은 이때 맞춰 준비한 영화를 10여 개 개봉관에 걸려고 엄청난 애를 썼다.
특히 흥행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주연급 배우들은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명절에 맞춰 영화를 완성하느라 여기저기 촬영장을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64년 설날 극장가는 신영균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석가모니’ ‘평양감사’ ‘아편전쟁’ ‘치마바위’ 네 편에서 주연을 맡았다. 내 몸이 내가 아니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각 다른 영화를 찍는 날이면 혼이 쏙 빠지는 것만 같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살인적인 일정을 다 소화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
신상옥 감독의 ‘폭군 연산’. [사진 노기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물론 이 모든 건 ‘과부’ 이전 만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당시 제작자나 지방 극장가에선 “연극만 해본 치과의사 출신의 신출내기를 주연배우로 하면 흥행이 되겠느냐”며 심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조긍하 감독으로선 모험을 한 셈이다. 대개 배우들이 처음 주연을 맡은 작품과 감독을 평생 잊지 못하는 이유다.
이후에도 조 감독과 여러 작품을 함께했지만 연기의 참맛을 알게 해준 건 신상옥 감독이다. 62년 신정과 구정에 연이어 개봉한 영화 ‘연산군’과 ‘폭군 연산’은 배우 신영균을 하루아침에 세상에 알렸다. 두 작품은 거의 동시에 촬영·제작돼 서울에서만 관객 30만여 명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같은 감독이 같은 주연배우로 같은 주제의 영화를 만든다는 게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만큼 흥행 요소를 갖춘 작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폭군 연산’은 후속작인데도 장기 상영 영화 순위에 올랐다. 개봉관 한 극장이 영화 한 편만 상영하던 시절, 상영 일수는 인기의 상징이었다. 명절 같은 때는 좌석이 부족하면 입석도 허용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벗겨진 고무신이 수없이 굴러다녔다. 이때부터 나는 ‘사극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내가 연산군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연산군을 폭군이라고 비난하지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는 폐비 윤씨에게 효심 지극한 아들이었다. 사약을 받으면서 비단 한삼에 피를 토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이 ‘금삼의 피’를 보고 연산군은 복수심에 타오른 것이다. 나는 폭군이자 효자라는 연산군의 양면에 매력을 느꼈다. 설날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관객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다.
 |
김수용 감독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우일 때는 명절도 없이 지내다 보니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늘 미안하다.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명절 연휴를 이용해 가족여행을 즐겨 다녔다. 올 설날은 홍콩에서 보낸다. 64년 두 달 넘게 홍콩에 머물며 ‘비련의 왕비 달기’를 찍었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다. 달기역을 맡았던 홍콩의 유명 여배우 린다이(林黛)는 고인이 됐지만 그의 절친한 동료 배우 리리화(李麗華)는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 만날 수 있다면 꼭 안부를 전하고 싶다.
설날 하면 또 생각나는 영화는 김수용 감독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5)다. 대구 명덕초교 4학년 이윤복이 쓴 일기를 바탕으로 소년가장의 고달픈 삶을 그린 영화다. 어머니는 노름꾼 아버지의 학대에 못 이겨 집을 나가버리고, 맏이인 윤복과 어린 동생들은 결국 집세를 못 내 쫓겨나는데 그게 하필 설날이었다. 흩어져 사는 가족도 설에는 모여서 온정을 나누는 법인데 말이다. 너나없이 가난했던 시절,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2014년 대만에서 원작 필름 되찾아
윤복은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 구두닦이를 하면서 일기로 마음을 달랜다. 나는 이 일기를 책으로 출간해서 베스트셀러로 만든 담임 선생님 역할로 나온다. 65년 국제극장에서 개봉해 서울에서만 관객 28만5000여 명을 동원했다. 한국 흑백영화로는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제3회 청룡영화제에서 작품상·감독상 등을 수상했고 제2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도 출품됐다.
하지만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오랫동안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러다 대만영상자료원에서 중국영화로 분류해 보관해 온 ‘추상촌초심’(秋霜寸草心)이 바로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사실이 2014년 밝혀졌다. 60년대 중반의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영화이기에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설날 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무엇일지 궁금하다. 아무쪼록 명절을 쓸쓸하게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사랑과 온정이 가득한 설날이 되기를 바란다.
정리=박정호 논설위원,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