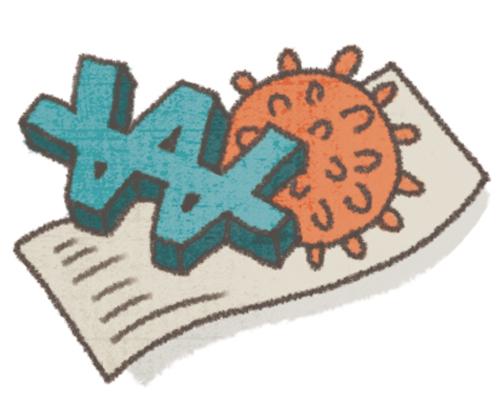 |
1997년 12월은 ‘참담한 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이제 선진국”이라고 외친 김영삼정부. 11월 터진 국가부도 사태로 그달에는 식량 수입마저 걱정해야 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태국이 부럽다”고 했다. 왜? ‘상하의 나라’에는 사시사철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
재정경제원이 ‘돈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그때다. 그달 5조원 규모의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3조8744억원어치를 팔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1993년 전격 도입된 금융실명제. 빛을 보지 못한 ‘구린 돈’은 장롱 속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논란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가·차명 계좌를 당연시했으니 이해할 만했다.
무기명 채권은 22년 만에 부활할 모양이다.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채권 발행에 군불을 지핀다. “국난을 극복할 최선의 방법”이라며. 그런 걸까.
금융실명제 27년. 지금 ‘숨은 돈’은 1990년대 말 비실명 자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금고와 가상화폐 지갑에 감춰진 돈은 십중팔구 범죄자금이다.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범죄자금 세탁의 길은 활짝 열리고, 범죄의 족적은 지워진다. ‘n번방’, ‘박사방’, 라임펀드 사건…. 권력형 비리 의혹도 수두룩하다. 물론 상속·증여세를 면하려는 자금도 모이겠지만.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돈을 조달할 수 없을까.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을 뒤따라 위기의 불 끄기에 나섰다.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방식으로 돈을 무제한 풀기로 했다. 금융회사·공공기관의 자금이 말라 멀쩡한 기업을 부도낼 일은 없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물론 은행이 책임을 면하려고 딴지를 건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댓글이 붙었다. “라임펀드로 빼돌린 돈 파킹하고 숨기는 데 무기명 채권이 제격.” 왜 여당내에서 황당한 제안이 나오는 걸까. 경제전문가 집단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관료를 B급쯤으로 여기는 걸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도 모르는가.
강호원 논설위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