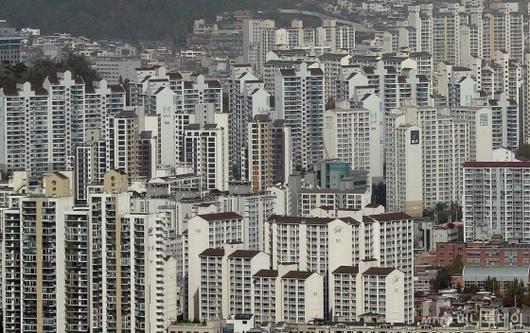 |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에 도입했던 '사전청약제' 카드를 꺼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3기 신도시에 이를 도입해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 주택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제 도입, 본청약 1~2년 전 청약… 내년 상반기 9000가구 적용
━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위해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가구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 중 일부 물량은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을 사전 청약하는 것으로, 당첨자는 본 청약 때까지 요건을 갖출 경우 100% 당첨된다. 사전청약제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 처음 실시했던 제도다.
사전청약자가 본 청약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 일정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한다.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전청약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시 확정된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가구다.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계획/사진= 국토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도 8조원 투자
━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에도 8조원을 투자한다.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하도록 하고 신도시 내 10분 안에 이동 가능한 미래교통 도시를 구현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고양선(고양창릉), 하남선(하남교산), 부천대장·인천계양(S-BRT) 등 광역교통대책에 먼저 투자한다.
지하철은 내년 상반기까지 철도망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문화·보육시설과 함께 공급한다.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추가 교통대책 마련 중이다.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자율주행차로 운행하고 모두 수소버스로 공급한다. 공유형모빌리티 도로‧공유시설(주차‧충전) 설치 및 공공주차장 중심으로 주차로봇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동일 면적에 주차대수가 약 50% 증가하고 입출차 시간은 약 50% 단축된다.
━
주택 조기 공급으로 '내집 보유 효과' 유도… 서울 기존 주택 매매시장 영향 제한적
━
이처럼 정부가 3기 신도시 청약과 교통 대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서울 주택 수요 분산 효과를 위한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공급 확대가 가시화됐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막연히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기보다 조기당첨에 따른 '내집 보유효과'를 유도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울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9000가구 물량 자체는 적지 않지만 청약하려는 사람들은 지금도 기존 주택 매입은 하지 않고 있어 주택 매매시장 영향은 크지 않고, 청약 과열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입주 시점만 뒤로 밀리는 것으로 매매 시장보다는 향후 전세 수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