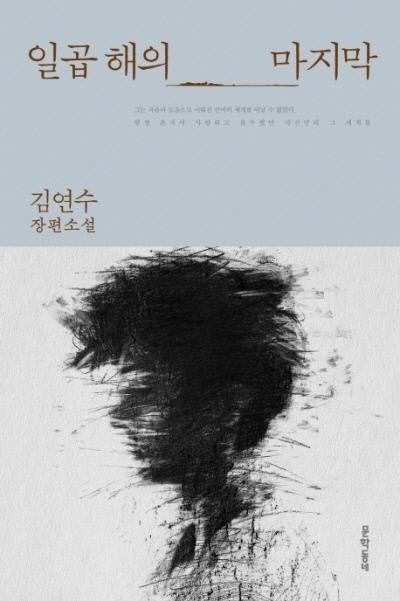 |
일곱 해의 마지막
김연수 지음
문학동네 | 248쪽 | 1만3500원
“누가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행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뤄진 언어의 세계를 떠날 수 없었다. 평생 혼자서 사랑하고 몰두했던 자신만의 그 세계를.”
한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무언가를 온전히 버리는 일은 어떤 의미일까. “사랑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불행해지는 것쯤이야 두렵지 않아서” 시인은 다시 시를 썼다. 그리고 7년이 흐른 뒤 펜을 내려놓는다.
시인 백석(1912~1996)의 분단 이후 행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시인으로서의 그의 삶은 실패에 가까웠다. 소설가 김연수(50)는 그 좌절의 시간에 주목했다. 그가 8년 만에 내놓은 장편 <일곱 해의 마지막>은 백기행(백석의 본명)이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해 1962년 절필할 때까지, 시인으로 살았던 마지막 7년을 복원한 소설이다. 백석의 생일이기도 한 지난 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연수는 “시인이 더 이상 시를 쓰지 못하는 것의 의미, 그럼에도 백석이 놓지 않았던 소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전쟁 이후 백석은 시인보다는 번역가의 삶을 살았다. 정감 어린 민속어로 생의 비애와 아름다움을 탁월하게 묘사했던 시인의 능력은 무용한 것으로 취급됐다. 그가 발표한 시는 ‘부르주아적 색채’를 띤다고 지탄받았고, 마흔여섯에는 당이 원하는 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양에서 양강도 삼수군 국영협동조합으로 쫓겨난다.
소설 속 기행은 “폐허에 굴러다니는 벽돌 조각들처럼 단어들은 점점 부서지고 있다”고 한탄한다. 김연수는 “지금까지도 북한 문학사에서 백석이란 이름은 통째로 지워져 있고, 남한에서도 1988년 이전까지 그의 시는 출판이 금지돼 있었다”며 “그가 마지막으로 시를 발표한 1962년부터 1988년까지, 백석은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
소설가 김연수가 8년 만에 출간한 장편 <일곱 해의 마지막>은 시인 백석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에서의 삶을 조명한 소설이다. 작가는 백석이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해 1962년 마지막 시를 발표할 때까지, 시인으로 살았던 그의 마지막 7년을 소설로 복원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연수는 대학 시절 백석의 시를 접한 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서정시는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이 소설을 처음 구상하게 됐다고 했다.
월북·납북 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해금 조치가 이뤄지고 2010년대 북한 문학 관련 자료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확인한 백석의 시는 실망스러웠다.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발표한 동시 ‘나루터’ 역시 수령에 대한 찬양을 담은 일종의 선전시였다. 백석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현실의 수령’을 호명한 찬양시를 내놓고 절필한다.작가는 그 시기,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던 시인의 고통을 떠올렸다고 했다. “백석이 ‘나루터’를 끝으로 시를 안 쓰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못 쓰게 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가 시를 안 쓰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하고 소설을 썼습니다. 체제 안에서 안전하게 찬양시를 쓸 것인가, 아니면 많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쓰지 않을 것인가의 고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백석을 소설 속 ‘기행’으로 불러내기 위해, 작가는 1950~1960년대 북한 문단과 사회상에 관한 자료를 탐독하고 백석이 북한에서 쓰거나 번역한 글을 모두 찾아 읽었다. 그는 백석이 번역한 러시아 시인 벨라 아흐마둘리나의 시 ‘잣나무’를 읽은 뒤 그가 절필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했다.
“당시 백석이 발표한 시들은 실망스러웠지만, 번역은 마치 자신의 과거 시처럼 말맛을 살리며 정말 아름답게 했어요. 서정적인 표현을 쓰면 ‘호사 취미’라고 비판받는 시기였는데도, 마치 본인이 쓰고 싶은 시를 쓸 수 없는 답답함을 번역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처럼.”
김연수는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이 소설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필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백석이 삼수로 추방됐을 때의 나이, 마흔여섯이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건 당시에 제가 소설을 쓰면서 갖고 있던 어떤 절실한 고민과도 연결된 문제였어요. 세상이 바뀌었으니 소설도, 소설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거나, 문학 외적인 것들의 비중이 커져가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할 때였어요. 이 소설을 쓰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설은 기행의 절필이 단순히 ‘시인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거기서 불타는 한 권 한 권은 저마다 하나의 세계였다. (…) 이 모든 세계가 모여 다채롭고도 영롱하게 반짝이는 빛을 발하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 한 권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인 한 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현실 전체가 몰락하는 것이다. 수많은 세계를 불태우고 남은 하나의 세계라는 점에서 그들의 현실은 한없이 쪼그라들다가 스스로 멸망하리라.”
“이제 시는 자신의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불행과 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자신을 살아 있게 했고, 구원했던 언어와 문장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묻던 시인은 결국 글쓰기를 멈췄다. 그리고 백석의 시는 한국적 서정의 상징으로 남게 됐다.
김연수는 시를 소설 속 스스로 타오르는 ‘천불’에 빗댔다. “기행은 시에서 멀어지지만, 그의 시는 천불처럼 저 스스로 생명력을 찾아갑니다. 그가 더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시인 백석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쓰지 않음을 선택해 그의 시가 영원히 기억되는 역설, 작가라면 가져야 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