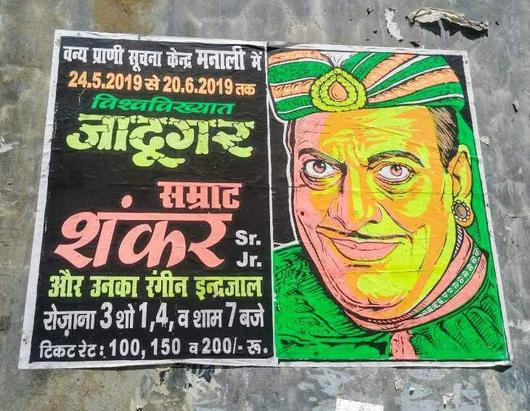 |
힌디어가 적힌 간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며칠 전, 인도 교육과정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뽑혔다. 이로써 한국어는 영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등과 ‘선택 외국어’ 자리를 놓고 경합하게 됐다. 중국어는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분쟁 때문에 퇴출당한 듯하다.
그만큼 앞으로 한국과 인도는 나눌 것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좋게 한국도 힌디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하는 건 어떨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 인도에서는 힌디어 말고도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 영어의 위력은 날이 갈수록 어마어마해지고 있다.
이 널따란 인도 땅에는 무려 780개의 언어가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부 인도인과 남부 인도인이 만나면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러다 보니 1947년 독립 이후 인도는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기준이 되었다. 영미권의 시트콤이나 영화는 인도식 영어 발음을 종종 희화화하지만, 사실 인도인들의 영어 실력은 인도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장 막강한 힘이다. 이미 출판물의 80% 이상이 영어로 제작되고 있다.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인도의 공식 문서는 대부분 영어로 작성된다. 말이 같은 인도인들끼리도 비즈니스 할 때는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처음 인도에 왔을 때 나는 힌디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10년 넘게 한국에 산 외국인들이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 모양새가 안타까웠기에 한 결심이었다. 힌디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인도의 문화와 사람들을 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 도전에 실패했다. 핑계를 찾자면 두 가지다 일단 힌디어 선생님이 출산해 수업이 잠시 끊겼다. 또 하나는 인도인들이 영어를 정말 잘한다는 것이다. 사실 나의 영어 실력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여행을 다니며 습득한 서바이벌 회화 수준이다. 읽는 것을 좋아해 재미 삼아 번역하기도 했지만, 전문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인도 친구들을 만나면 정신이 아득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제발 쉬운 영어로 하라고!” 애걸한다. 젊은 친구들은 난해한 영어로 말을 건다. 가장 긴장되는 건 9살 내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의 대화다. 선생님들은 유독 빠르게 말한다. 빠르게 영어로 말하는 게 교육 수준이 높다는 증거로 여기기 때문이다.
영어가 힌디어보다 더 편하다는 한 인도 친구의 말에 당황한 적도 있다. “미미, 왜 너는 한글로만 글을 써? 영어로 쓰면 더 많은 기회가 더 있을 텐데.” 나는 항상 모국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로 내 생각을 제대로 쓰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외국어는 필요할 때 얼마든지 습득해서 써먹으면 그만이다. 가치 있는 외국어 콘텐츠는 번역가가 나설 것이다. 하지만 인도 친구는 나를 구세대 취급한다. “그걸 왜 번역가가 해줄 때까지 기다려?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
갑자기 뜬금없는 비교 같으나, 미국에서 활동했던 인도 출신 작가 줌파 라히리가 떠올랐다. 그는 영어로 쓴 소설로 맨부커상까지 받은 뒤 이탈리아로 건너가 이젠 이탈리아어로 소설과 에세이를 쓰고 있다. 하지만 가령 ‘롱 롱 타임 어 고’(long long time ago·옛날 옛적에)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모든 말들이 영어로 통일된다면 우리나라 ‘갬성’(특화된 감성)을 담은 ‘호랑이 담배 피울 시절에’ 같은 어구는 사라질 것이다. 인도에도 비슷한 의미로 ‘바다가 설탕만큼 달콤하던 시절에’라는 말이 있다. 이 얼마나 원시적이고 로맨틱한 표현인가. 여러 상상과 감정을 몰고 오는 표현이다. “네가 영어만 주야장천 쓴다면 이런 어구들은 사라질 텐데?” “그건 힌디어 보호주의자들이 지켜주겠지.”
미미 시스터즈가 2018년 발표한 노래 ‘우리, 자연사 하자’ 가사를 영역하던 기억이 난다. 영어 능력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이불 속에서 우울해 하지 마’ ‘아플 땐 의사 말고 퇴사’ 같은 것은 도저히 번역이 불가능했다. 비슷한 뉘앙스는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은 아니었다.
아무리 영어로 전 세계가 소통 가능하다지만, 역시 모국어를 쓸 때 나 같은 내가 되는 거 같다. 인도인들 역시 영어로 한창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와 친한 친구들과 말할 때 힌디어를 쓴다. 모국어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감정과 직결돼서일까? 한국과 인도가 한국어를 매개로 더욱 가까워지면 좋겠다.
작은미미(미미 시스터즈 멤버·작가·뮤지션)
 |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