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 듯 소녀들이 들어찬 전차, 재사용하는 콘돔의 이름 ‘돌격 1번’, 606호의 주사, 소녀 한 명에 군인 29명을 뜻하는 말 ‘29 대 1’.
에밀리 정민 윤(29)의 시집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열림원·사진)에는 이런 단어들이 돌림노래처럼 이어진다. 시집의 문을 여는 시이자 같은 제목으로 9차례 변주되는 시 ‘일상의 불운’은 “내 불운이란 터질 듯 들어찬 전차”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이 잔혹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시어로 소환한다.
“칠십 년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내 과거가 살아 있다는 걸 몰라. 위안소의 소녀들, 그때 우리는 모두 아이들이었어.”(‘일상의 불운’)
시집은 계속 기억해야 할 역사,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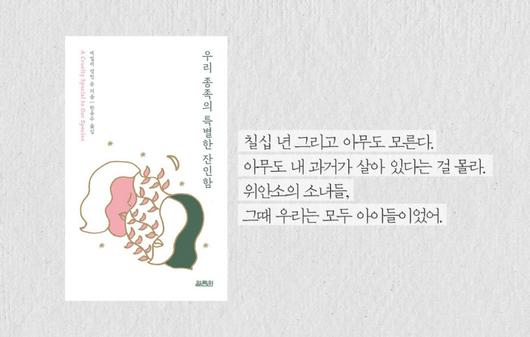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문단에서 먼저 주목받은 작가 에밀리 정민 윤의 첫 시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인 14일 소설가 한유주의 번역으로 출간된다. 시인은 1991년 한국에서 태어나 열 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2009년 대학 입학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다.
펜실베이니아대학과 뉴욕대학에서 각각 영문학 학사와 문예창작 석사 학위를 마친 시인은 논문을 작성하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비극의 역사를 접한 뒤, 미국 사회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시를 쓰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역사를 증언하기까지 걸었던 가시밭길을, 전쟁과 폭력에 짓눌린 여성들의 이야기를 시로 옮겼다.
시인은 한국어판 서문에 “한국에서 이 책의 목적은 ‘알림’이 아니라 ‘지속시킴’이 된다”며 “이미 아는 역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한 감정적, 담론적 참여를 통해 지금까지도 부정되고 삭제되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며, 문학이 그 참여를 돕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지난’, 혹은 ‘해결된’ 문제가 아닌 그들이, 우리가 계속 항쟁하고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고발’ ‘증언’ ‘고백’ ‘사후’ 등 4개의 장 35편의 시로 구성된 시집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잔혹한 역사에서부터 시작해 현대 여성들이 겪는 일상적 폭력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한다. 시집에서 강렬한 울림을 주는 대목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옮겨온 2부의 연작시 ‘증언들’이다.
총 7구의 시는 황금주, 진경팽, 강덕경, 김상희, 김윤심, 박경순(가명), 김순덕 등 7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고, 각 생존자의 이름이 소제목으로 붙었다. 마치 시각예술의 ‘콜라주’처럼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를 부분적으로 이용해 시인의 언어적 사유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찾은 시(found poetry)’의 방법론을 차용했다.
“그래서 나는 병영을 나와/ 걸었다/ 38선까지 내내 혈혈단신으로 걸었다/ 미군들이 내게 DDT를 너무 많이 뿌렸고/ 이가 전부 떨어져 나갔지/ 12월 2일이었다/ 나는 자궁을 잃었고/ 이제 일흔이다.”(‘증언들’-황금주)
 |
시집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을 펴낸 에밀리 정민 윤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입국한 에밀리 정민 윤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 중이라 화상 연결로 간담회에 참여했다. 열림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끝내 살아남은 목소리,
그리고 수많은 고통의 여백
“읽기 불편했으면”
●
연작시에는 여백이 많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가 쪼개져 빈 공간이 드러나고 시각적으로도 마치 시가 전체 페이지 위에 흩어진 형상이다. 시인은 “빈 공간들은 생략되거나 지워진 내용을 상징한다”며 “증언들을 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선택적으로 뺀 단어들이기도 하고, 역사 속 혹은 당사자들의 기억 속에서 삭제된 것들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수없이 고민하며 두려워했다는 그는 “마디마디를 끊으면서 독자들의 읽기 경험을 좀 불편하게 하고 싶었다. 편하게 읽을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저의 글쓰기 경험도 불편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시집의 중심축은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지만, 시인은 이를 시작으로 여성을 잠식해온 무수한 세상의 불의와 폭력을, 지배적 담론이 배제하는 존재의 이야기를 시집 주변부에 배치했다. 동양인 이민자이자 여성으로서 시인의 개인적 경험들, 일상의 차별과 언어에 대한 고통도 시 속에 녹아들었다.
에밀리 정민 윤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이 책이 반일 민족주의적으로 읽히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전쟁폭력, 여성폭력 문제까지 이어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귀국한 시인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이라 화상 연결로 간담회에 참여했다.
“모든 시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질문이라고 믿는다”는 시인의 말처럼, 그의 시는 세상에 현재진행형 질문들을 던진다. 고통을 견디고 끝내 살아남은 목소리를 용기 있게 기록하며, “복잡하고 잔인한 인간성”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숙고해야 함을, ‘기억함’의 의미와 상처 이후 회복의 길을 묻는다.
“소녀들이 서로를 꼭 붙들었다. 누가 사는가,/누가 떠나는가, 누가 이 삶을 믿는가/너와 나 다음 세상은 나아지기를.”(‘위안’)
●
선명수 기자 sms@khan.kr
플랫팀 twitter.com/flatflat38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