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한국 역사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김용섭(89) 교수가 지난 20일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그는 ‘자본주의 맹아론(萌芽論)’과 ‘내재적 발전론’ 등의 이론을 통해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사의 숨은 신(神)’이란 별명으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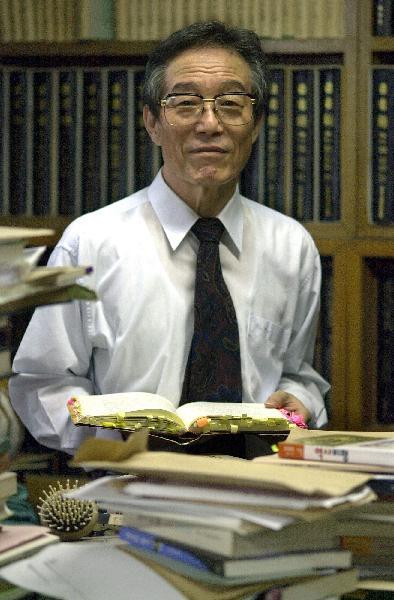 |
2000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될 무렵의 김용섭 교수. |
강원도 통천 출신인 김 교수는 서울대 사대 역사과와 고려대 대학원을 마친 뒤 척박했던 한국 농업사 연구에 투신했다. 그는 “6·25 전쟁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그 전쟁은 한말 일제하부터 이어 온 계급적 대립이 확대된 내전이라는 판단이 들어 역사적으로 살피게 됐다”는 것이다. 1950년대 후반 약관의 나이로 동학혁명 관련 논문을 발표한 뒤 한국 전통 사회의 해체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조선 후기 사회가 외세의 작용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혼자 힘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봤다. 토지 대장인 양안(量案)과 호적 대장을 치밀하게 분석해, 근대 경제로 변화하는 데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세력인 ‘경영형 부농(富農)’이 조선 후기에 성장하고 있었음을 규명했다.
‘조선 후기 농업사 연구’ ‘한국 근대 농업사 연구’ 등 그의 연구는 한국 민족이 주체적으로 역사를 이끌 힘이 없어서 외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민사관의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떨쳐냈다. 나아가 한국인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사대(1958~1966)와 문리대(1967~1975) 교수를 지냈으나, 서울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때 연세대로 자리를 옮겼다. ‘무슨 글을 그렇게 쓰느냐’고 질책했던 선배 교수들의 압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에서 그의 ‘한국근대사’ 강의는 필수 수강 과목으로 꼽혔고, 대학원 강의는 청강하러 온 타 학교 대학원생들로 붐볐다. 그의 이론은 1980년대 이후 민중사관의 뿌리가 됐고, 2000년대에는 지나치게 주체성을 강조한 도식적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연이 있다. 1960년대만 해도 신문·잡지에 대중적인 글을 발표해 왔지만, ‘급격한 건강 악화로 학문 연구와 대중적 활동 중 하나만 해야 할 기로에서 전자를 택했다’는 것이다. 한 유명 사진가가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의 얼굴을 담기 위해 ‘딱 한 장만 찍자’고 호소했으나 매몰차게 거절한 일도 있다. 제자인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외국 강연 기회가 많았는데도 일절 응하지 않았고, 특히 일본이라면 펄쩍 뛰셨다”고 회고했다.
 |
김용섭 연세대 명예교수의 최근 모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97년 정년을 맞은 뒤 2000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됐으며, 국민훈장 동백장(1997), 치암학술상(1984) 등을 받았다. 김경희 지식산업사 대표는 “내년 초 출간이 예정된 ‘김용섭 저작집’의 제10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김 교수가 입원했고, 그 때문에 지난 2월 제1회 ‘한국학 저술상’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학문에 쓰신 분”이라고 했다.
유족으로 아내 김현옥씨와 아들 김기중 서울대 의과대 교수, 딸 김소연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3일 오전 6시. 22일엔 조문을 받지 않는다. (02)2072-2011
[유석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