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평론가 최범, <한국 디자인 뒤집어 보기> 출간
·한국의 디자인, 사회문화의 비평…대안 제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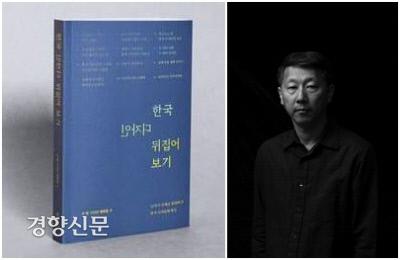 |
디자인 평론가인 최범 한국디자인사연구소장이 디자인과 사회문화 비평서 <한국 디자인 뒤집어 보기>(안그라픽스)를 펴냈다. 안그라픽스·최범 제공 |
‘공공 디자인에 공공성이 없는 이유’ ‘디자이너의 사회학’ ‘담론으로 본 한국 디자인의 구조’ ‘한국 디자인에 드리운 국가주의 그림자’ ‘디자인은 어쩌다 말이 되었나’ ‘공예는 언제부터 관광기념품이 되었나’ ‘디자인은 민주주의다’….
저명한 디자인 평론가인 최범 한국디자인사연구소장이 최근 펴낸 책 <한국 디자인 뒤집어 보기>(안그라픽스)의 목차 일부다. 일부지만 디자인, 디자인계 안팎, 나아가 사회와 디자인의 관계 등 한국의 디자인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짚어내는 핵심적 주제들이어서 눈길을 잡는다.
<한국 디자인 뒤집어 보기>는 디자인 비평서이자 사회문화 비평서다. 한국의 디자인, 특히 공공 디자인의 현실과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또 근현대사와 사회 현상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와 디자인·시각문화 전반을 읽어내고, 이 시대 디자인 풍경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를 해석하는 것이다.
 |
최범 디자인 평론가는 한국의 디자인이 일상생활 속의 디자인이 아니라 국가와 산업 중심의 디자인에 함몰됐다고 분석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잡하고 어지럽게 내걸린 도시 속 간판은 황폐한 시각문화를 상징한다. 그런데 숱한 지적에도 왜 개선되지 못할까? 민주공화국이란 한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세종대왕 등 조선왕조의 상징 동상들이 세워져 있을까? 산업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의 디자인은 왜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까? 공공 디자인인데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같은 물음에 답을 하는 책이기도 하다.
최범은 “뒤집힌 것을 뒤집어 바로 잡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이라며 “지난 30여년 평론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한국 디자인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의 핵심을 빠짐없이 책에 담았다”고 말한다. 경향신문 등에 연재한 기획 시리즈 글을 바탕으로 크게 수정·보완했다. 대학·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미학을 공부하고 월간 <디자인> 편집장, 디자인 비평 전문지 <디자인 평론> 편집인 등을 지낸 저자의 내공이 돋보인다.
 |
최범 디자인 평론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광화문 광장에 “왜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을까”라며 한국 디자인에 드리워진 국가주의 등을 분석한다. 사진은 새로운 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인 광화문 광장 전경. 김기남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범은 한국 디자인의 근본문제로 “아직도 국가와 산업 중심으로 디자인을 바라본다는 것”을 꼽는다. 여느 나라들처럼 국가와 산업을 위한 디자인과 사회와 문화를 위한 디자인이 균형을 이루며 조화로운 디자인 풍경을 그려야 하는데, 우리는 국가·산업 디자인에 함몰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문화를 위한 디자인은 외면되고 결국 시민들의 일상 삶 속에 풍요로운 디자인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산업 중심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중심으로 디자인을 뒤집어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근현대 한국의 디자인은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적 자산이라기보다 국가 주도의 ‘정치 수단’에 가깝다. 영국의 미술공예운동, 독일의 바우하우스, 일본의 민예운동 등 전통 공예를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도 없었다. 한국의 디자인 담론은 “그 주어가 디자인이 아니라 국가·산업이 되면서 보편적 담론”이 되지 못했다. 아직 “광화문 광장에 조선시대 상징 동상들이 서있고”, ‘한국적인 디자인’은 “맨날 오방색을 두르고 훈민정음체로 도배돼 나타나는” 이유다. 최범은 책에서 한국의 디자인이 형성되는 과정, 그 결과와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디자이너 등 디자인계의 자성을 촉구한다. “디자인계가 국가 권위주의 체제에 ‘부역’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전문가인 디자이너들 마저 국가·산업 디자인에 매달려 시민 사회와 문화를 위한 대중의 생활세계 디자인에 소홀했다는 아픈 지적이다.
 |
2019년 금호미술관에서 열린 ‘바우하우스와 현대 생활’ 특별전 전시 전경. 금호미술관 제공.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 사회의 공공 디자인은 제도의 산물이지만 또한 시민들의 삶과 의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일상 삶을 더 풍요롭게하는 ‘좋은 디자인’이든 황폐하게 만드는 ‘나쁜 디자인’이든 그 사회 구성원들도 책임이 있다. 최범은 “우리 사회에서 디자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적·공동체적 삶의 양식이라기보다 개인의 사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소비 상품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개성’보다 ‘명품’이라는 지위를 추구하는 사회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짝퉁의 범람’이 대표적 사례다.
보다 나은 한국의 디자인 풍경을 그려내기 위해선 사회와 문화를 위한 디자인, 그 디자인이 생활민주주의와 대중을 잇는 매개체가 돼야 한다고 최범은 강조한다. 디자인계와 제도권, 시민 등 저마다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이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민주 시민’이 되어야”하며 “대중은 디자인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적 민주시민으로서 디자인을 통해 삶을 가꾸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으로서 디자이너들에게 ‘시민’이 되기를 요구함으로써 일상에서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범은 “디자인은 결국 민주주의, 생활 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