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기관 주문 1경…자본금 50억 자문사가 7조 허수 주문
공모가 고평가 개미들 피해…펀드 규모 따른 한도등 개선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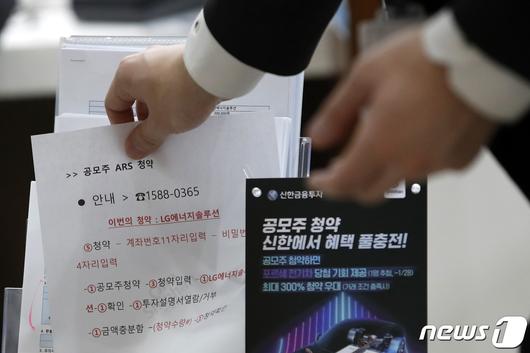 |
19일 서울 영등포구 신한금융투자 본사 영업점에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안내문이 놓여져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 사상 최초로 '경(京)' 단위의 주문이 몰렸다. 그만큼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지만 실제로는 허수 주문이 많았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청약증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수량을 얼마든지 적어낼 수 있다. 1억원 밖에 없는 회사도 100억원어치 주문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기관투자자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엔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자본금 50억원의 투자자문사가 7조원이 넘는 주문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2337만5000주이었는데 모든 물량을 다 사겠다고 한 것이다. 수요예측에서 1경5203조원의 돈이 몰린 것은 이런 기관투자자의 허수 주문이 많았던 영향이 크다.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서 원하는 수량을 적어내고 경쟁률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받는다. 경쟁률이 치열한 공모주의 경우 한주라도 더 받기 위해 신청수량을 실수요보다 과하게 베팅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에서 청약금의 50%를 청약 증거금으로 내야한다. 반면 기관투자자는 증거금이 없다. 배정 물량에 대한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기관투자자도 청약증거금을 넣어야 했지만 공모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2007년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청약증거금을 폐지했다. 만약 수요예측에서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지 않으면 해당 물량은 주관회사가 인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모주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투자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적절히 신청을 했다"면서 "당시 기관투자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없앴는데 갑자기 공모주가 인기를 끌면서 역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청약 주문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300만주, 3000만주 등 조단위의 주문을 넣는 것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모운용사는 회사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펀드 운용역들을 대상으로 펀드 규모 10% 이내에서 필요한 주식수를 취합해 주문한다"면서 "오히려 정직하게 필요한 물량만 신청하는 공모운용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피해는 개인이다.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서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기관이 적절한 공모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다. 그런데 기관투자자의 뻥튀기 청약이 늘어날수록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공모가는 최상단에서 결정된다. 최상단을 넘어서는 가격이 정해기지도 한다.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자의 경쟁 속 고평가된 가격으로 공모주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펀드 규모를 고려한 청약 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모주 투자 열기가 식으면 이런 규제가 상장 기업과 주관사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증권사 투자은행(IB)부문 임원은 "공모주 제도에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시장 전체를 죽이는 일일 수 있다"면서 "새로운 규제보다는 각 운용사가 컴플라이언스를 잘 지키고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o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