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공짜예금’ 18조원↑…정기예금 19조원↓
대규모 정기예금 만기에 ‘대기성 자금’ 늘어나
금융권, 연 최고 7%대 파킹통장 판매…자금확보 나서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한때 5%를 웃돌던 은행권 정기예금금리가 일괄 3%대로 내려온 가운데, 1년 전 막대한 자금이 몰렸던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며 투자처를 찾는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파킹통장의 금리 혜택을 늘리며, 시중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어디에 넣어볼까” 5대 은행 ‘대기성자금’ 한 달 새 18조원↑
 |
서울 한 거리에 주요 시중은행의 ATM기기가 설치돼 있다.[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16조7480억원으로 전월말(598조7041억원)과 비교해 18조439억원(3.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 등 이자가 거의 없는 비원가성 자금을 의미한다.
이는 만기를 맞은 정기예금 잔액이 수시입출금식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결과로 풀이된다. 불과 지난해초까지만 해도 주요 은행들은 5%에 육박하는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됐지만, 현재는 3% 후반대 수준이다. 이에 정기예금 만기를 맞은 소비자들이 정기예금 재가입을 선택하기보다, 여타 투자처를 물색하기 위해 입출금 통장에 돈을 예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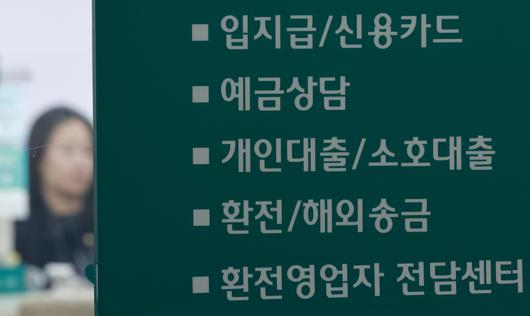 |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 앞 안내문.[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실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말 기준 849조2957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19조4412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액수가 그대로 수시입출금 통장에 흘러들어간 셈이다. 아울러 5일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금리(1년 만기)는 3.5~3.9%로 최저 3%대 중반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금리가 떨어진 것은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면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1년물, AAA) 금리는 5일 기준 3.639%로 지난해 5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다시 정기예금 금리가 이전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확보하자” 파킹통장 금리 경쟁…연 최고 7%대까지
 |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금융권에서는 늘어난 대기성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권에서는 연 7%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까지 등장했다. 실제 OK저축은행의 ‘OK짠테크통장’은 50만원까지 우대조건 없이 연 7%의 금리를 제공한다. 다만,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3.5%가 적용된다.
에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자유예금’의 경우 연 4.1% 금리를 최대 2000만원까지 적용한다. SBI저축은행의 ‘사이다입출금통장’은 1억원 한도로 연 3.5%의 금리를 제공한다. 다만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0.2% 금리가 적용된다.
 |
서울 한 거리에 주요 시중은행의 ATM기기가 설치돼 있다.[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맞춰 ‘파킹통장 쪼개기’로 금리 혜택을 높이는 소비자들도 등장했다. 금리가 높은 대신, 한도가 낮은 여러 금융사 파킹통장 상품에 자금을 분산해,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통장 개설 후 영업일 20일이 지나야만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혜택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은행들에서도 파킹통장 금리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 ‘생활통장’ 상품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연 3%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초 파킹통장 상품 ‘세이프박스’의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해 2.1% 금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같은날 정기예금상품의 금리는 0.1%포인트 내렸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wo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