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푸드테크협의회장 인터뷰
산학연 2000개 단체 생태계 협의
식품·기술 등 400여 기업 참여
“4경원 시장 푸드테크 핵심은 ‘개인맞춤’
현지 맞춤형으로 1000억弗 수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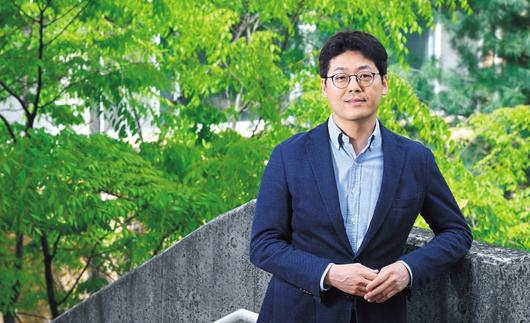 |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교육연구동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푸드테크 분야의 1등은 한국입니다. 삼성전자·LG전자는 물론,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성장한 쿠팡·배민·컬리도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장 겸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은 푸드테크 개념에 대해 “먹기 위해 돈을 쓰는 모든 과정이 푸드테크와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재료 생산부터 유통, 제조, 배달, 조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푸드테크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푸드테크를 위한 협력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00개의 산업체, 대학, 정부 산하기관이 모인 단체다. 지난 2022년 6월 출범했다. 참여 기업은 400여 개로, 식품기업과 기술기업이 대다수다. 신세계푸드, 롯데중앙연구소, 트릿지, 서울대 등이 회장단을 구성했다.
푸드테크는 수출 유망산업이다. 이 회장은 푸드테크가 수출 효자로 등극하기 위해 글로컬라이징(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세계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기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한 ‘기술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푸드테크를 정의하면.
▶푸드테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 산업에 기술이 추가되는 것이다. 밀양에 자동화 공장을 지은 삼양식품이나 닭 손질을 자동화 공정으로 전환한 하림 등 첨단산업이 접목된 형태 모두가 푸드테크라고 할 수 있다.
-푸드테크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밥을 해줄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먹기 위해 필요한 밥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 로봇이 등장했다. 서비스 구독 방식도 그래서 나왔다. 대체육도 마찬가지다. 소나 돼지를 키울 사람이 없다. 고기 소비가 늘고 반려동물까지 증가하니 식품산업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대체 기술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었다. 푸드테크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넘어 한국의 최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의 푸드테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의 푸드테크가 현재 전 세계 1등이다. 무엇보다 푸드테크는 ‘개인 맞춤’이 중요하다. 한국에선 온라인으로 뭘 먹을지 추천 받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는 행위가 일상이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배송 받아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도 한국이 유일하다. 삼성전자나 LG전자도 푸드테크의 영역에 있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식품 관련 가전제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CES(세계가전제품박람회)에서 선보이는 가전제품도 푸드테크를 적용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빠르게 이용한다는 점도 경쟁력이다. 물류·유통에서 제조까지 디지털로 연결돼 자동화로 공급이 가능하다.
-눈에 띄는 푸드테크 기업이 있는가.
▶농축수산물 무역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트릿지는 풀무원의 기업가치 10배를 넘어 3조5000억원에 달한다. 트릿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대체할 수도 있다. 식품을 제조하려면 농수축산물 가격이 중요한데 이 데이터시스템을 트릿지가 구축한다. 이전에는 쿠팡, 배달의민족,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비자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 트릿지, 야놀자 같은 데이터 기업들이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
-푸드테크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앞서 말했듯 푸드테크의 핵심은 ‘개인 맞춤’이다. 사람마다 다른 생애주기·체질·혈당부터 레시피와 먹는 순서 등을 데이터로 축적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되면 개인에게 맞춘 대체식품의 선택권이 확장된다. 인력 축소로 축사와 농작지는 고도화되고, 집합건물로 바뀔 거다. 로봇이 등장하면 위생 문제도 해결된다. 식품이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대체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숙제는 무엇인가.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다. 예컨대 정부는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하는 것을 식품이라고 본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배양육은 식품이 아니다. 푸드테크의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 정의와 시각이 달라지면, 시장의 방향성과 규모도 달라진다.
-정부는 푸드테크 시장 규모를 2020년 기준 61조원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은 어떤가.
▶전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현재 4경원에 달한다. 한국은 600조원 수준이다. 기존 농식품 유통 관련 시장 규모가 600조원이 넘는다.
-푸드테크협의회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한국 푸드테크 수출액 1000억달러(한화 약 137조원)가 목표다. 다만 우리 기술을 해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지 맞춤형 작업이 필수적이다. 각 국가에서 인증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올해 11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UN산업개발기구(UNIDO) 등과 협력해 ‘월드 푸드테크 엑스포’를 열고, ‘월드푸드테크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100여 개 국가의 가입을 통해 표준을 만들 것이다.
여러 산업 분야와 같이 가야 한다. 2027년에는 경기도 과천시에 월드 푸드테크 센터가 조성된다. 푸드테크 관련 입법안(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현재 법사위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큰 틀에서 민간의 의견이 잘 반영됐다. 정석준 기자
“전 세계 푸드테크 분야의 1등은 한국입니다. 삼성전자·LG전자는 물론,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성장한 쿠팡·배민·컬리도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장 겸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은 푸드테크 개념에 대해 “먹기 위해 돈을 쓰는 모든 과정이 푸드테크와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재료 생산부터 유통, 제조, 배달, 조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푸드테크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푸드테크를 위한 협력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00개의 산업체, 대학, 정부 산하기관이 모인 단체다. 지난 2022년 6월 출범했다. 참여 기업은 400여 개로, 식품기업과 기술기업이 대다수다. 신세계푸드, 롯데중앙연구소, 트릿지, 서울대 등이 회장단을 구성했다.
푸드테크는 수출 유망산업이다. 이 회장은 푸드테크가 수출 효자로 등극하기 위해 글로컬라이징(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세계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기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한 ‘기술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푸드테크를 정의하면.
▶푸드테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 산업에 기술이 추가되는 것이다. 밀양에 자동화 공장을 지은 삼양식품이나 닭 손질을 자동화 공정으로 전환한 하림 등 첨단산업이 접목된 형태 모두가 푸드테크라고 할 수 있다.
-푸드테크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밥을 해줄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먹기 위해 필요한 밥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 로봇이 등장했다. 서비스 구독 방식도 그래서 나왔다. 대체육도 마찬가지다. 소나 돼지를 키울 사람이 없다. 고기 소비가 늘고 반려동물까지 증가하니 식품산업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대체 기술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었다. 푸드테크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넘어 한국의 최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의 푸드테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의 푸드테크가 현재 전 세계 1등이다. 무엇보다 푸드테크는 ‘개인 맞춤’이 중요하다. 한국에선 온라인으로 뭘 먹을지 추천 받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는 행위가 일상이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배송 받아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도 한국이 유일하다. 삼성전자나 LG전자도 푸드테크의 영역에 있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식품 관련 가전제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CES(세계가전제품박람회)에서 선보이는 가전제품도 푸드테크를 적용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빠르게 이용한다는 점도 경쟁력이다. 물류·유통에서 제조까지 디지털로 연결돼 자동화로 공급이 가능하다.
-눈에 띄는 푸드테크 기업이 있는가.
▶농축수산물 무역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트릿지는 풀무원의 기업가치 10배를 넘어 3조5000억원에 달한다. 트릿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대체할 수도 있다. 식품을 제조하려면 농수축산물 가격이 중요한데 이 데이터시스템을 트릿지가 구축한다. 이전에는 쿠팡, 배달의민족,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비자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 트릿지, 야놀자 같은 데이터 기업들이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
-푸드테크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앞서 말했듯 푸드테크의 핵심은 ‘개인 맞춤’이다. 사람마다 다른 생애주기·체질·혈당부터 레시피와 먹는 순서 등을 데이터로 축적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되면 개인에게 맞춘 대체식품의 선택권이 확장된다. 인력 축소로 축사와 농작지는 고도화되고, 집합건물로 바뀔 거다. 로봇이 등장하면 위생 문제도 해결된다. 식품이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대체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숙제는 무엇인가.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다. 예컨대 정부는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하는 것을 식품이라고 본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배양육은 식품이 아니다. 푸드테크의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 정의와 시각이 달라지면, 시장의 방향성과 규모도 달라진다.
-정부는 푸드테크 시장 규모를 2020년 기준 61조원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은 어떤가.
▶전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현재 4경원에 달한다. 한국은 600조원 수준이다. 기존 농식품 유통 관련 시장 규모가 600조원이 넘는다.
-푸드테크협의회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한국 푸드테크 수출액 1000억달러(한화 약 137조원)가 목표다. 다만 우리 기술을 해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지 맞춤형 작업이 필수적이다. 각 국가에서 인증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올해 11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UN산업개발기구(UNIDO) 등과 협력해 ‘월드 푸드테크 엑스포’를 열고, ‘월드푸드테크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100여 개 국가의 가입을 통해 표준을 만들 것이다.
여러 산업 분야와 같이 가야 한다. 2027년에는 경기도 과천시에 월드 푸드테크 센터가 조성된다. 푸드테크 관련 입법안(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현재 법사위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큰 틀에서 민간의 의견이 잘 반영됐다.
정석준 기자
mp1256@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