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온갖 생물 이용해 생존
잊고 싶을 만큼 섬뜩하다가도
다채로운 생명 현상 보며 감동
◇기생충 제국/칼 짐머 지음·이석인 옮김/414쪽·1만3800원·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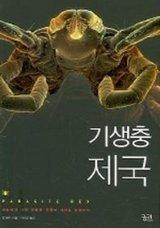 |
한국은 지난해 처음 열대성 질환인 말라리아 경보 제도를 만들었다. 그해 8월 3일 국토 전역에 걸쳐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74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 수준이었다.
흔히 괴롭거나 힘든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땀을 뺄 때 ‘학을 뗀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학’은 학질(말라리아)의 줄임말이다. 오랜 관용구가 있을 정도로 한국의 말라리아 피해는 컸다. 1970년대 말라리아 퇴치에 성공해 1980년대엔 환자가 발생하지 않다가 1993년 환자가 다시 발생했고 이후 꾸준히 환자가 생겼다. 한때 완전히 퇴치된 것으로 보였던 시기를 지나며 국민들의 말라리아에 대한 관심이 줄었을 뿐이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이 길어지면서 말라리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열원충은 모기를 통해 사람 몸에 침투한다. 여름이 길어지면 모기 번식이 늘어 열원충도 더 많이 퍼지게 된다.
이 책은 열원충 같은 갖가지 기생충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소개한다. 미국 예일대 교수이자 미국 과학저널리즘상 수상자가 썼다. 예컨대 말라리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기는 감염병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퍼진다. 바이러스나 세균은 동식물과 세포구조부터 다른 단순한 형태의 유기체다. 그러나 말라리아를 옮기는 열원충은 크기만 작을 뿐 보통 동물처럼 복잡한 몸 구조를 갖고 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기는 병보다 말라리아 퇴치가 더 어려운 이유다. 열원충은 악어에 기생하는 악어새나 말미잘 속에 몸을 숨기고 사는 열대어처럼 사람과 모기 두 가지 동물의 몸속을 보금자리 삼아 살아간다.
책은 온갖 생물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전 세계 기생충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어떤 기생충은 읽고 나서 빨리 잊고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하다. 반대로 작고 하찮아 보이는 기생충도 있는데 “어떻게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을 저렇게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까”라는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현실 속 기생충의 삶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어지간한 공포 영화나 공상과학(SF) 영화에 나오는 외계 괴물보다 더할 때도 있다. 이 책은 과학을 알면 상상의 폭도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생충은 아직도 그저 징그럽고 약간 이상한 삶의 방식 정도로 취급되곤 한다. 그러나 기생은 생태계를 크게 바꿔온 생물학 현상이다. 생물계는 단순히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이상의 다양한 기생 방식이 있다. 각 생명체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관계 속에서 늘 변화하고 있다. 책은 생물의 생존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인지에 대해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또 삶의 방식과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