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온갖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던 재난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나 통신망 단절, 미세먼지 등은 자연현상과 인간의 과오라는 두 가지 원인 중 어느 하나로 단정 짓기 어렵다. 과거 이분법적 재난 분류를 벗어난 새로운 종류의 재난의 생겨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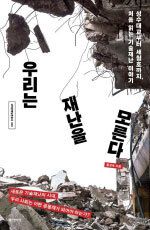 |
홍성욱/ 동아시아/ 1만7000원 |
신간 ‘우리는 재난을 모른다’는 과거 사례를 통해 기술과 인간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복잡한 기술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발생한 이런 재난을, ‘기술재난(technological disaster)’의 범주로 설명한다.
기술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가 원전을 만나 벌어진 기술재난의 대표적 사례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대 독일 그뤼넨탈사는 진정제와 수면제로 개발한 탈리도마이드를 판매했고, 이후 사지가 짧은 기형아가 1만여명 출생한 것도 기술재난의 하나다. 이 사건은 신약에 대한 임상을 표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저자는 기술재난을 이해하기 위해 인위적 재난 이론, 위험으로의 표류 이론, 정상 사고 이론, 스위스 치즈 모델, 일탈의 정상화, 위험 사회 이론 등의 이론적 틀부터 차근히 설명한다. 또 과학기술학(STS) 관점에서 느린 재난, 환경기술 재난, 구조적 재난, 기술 정치 등의 개념을 활용해 기술재난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참사, 인도 보팔 유독가스 유출 참사, KAL 007기 피격 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등 국내외 재난의 예가 폭넓게 제시된다.
기술재난을 오롯이 이해하려면 기술 시스템을 잘 알아야 한다. 문제는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런 이유로 몇몇 전문가나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회 전체의 공감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과거 자연재난에서는 피해자들이 서로 돕고 화합하며 결속을 다진 반면, 오늘날 기술재난은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기며 잘잘못과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분열하고 ‘음모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은 탓이다.
저자는 결국 바람직한 재난 조사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재난을 연구할 ‘기술재난 연구 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