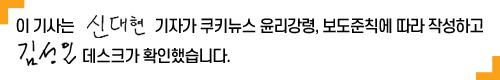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안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곽경근 대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새해 첫날 아기 울음소리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다. 병원들은 출산 소식을 전하며 더 많은 아기의 탄생과 성장을 기원한다. 올해도 전국 분만실 곳곳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숫자는 해마다 작아지고 있다.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줄줄이 문을 닫고 전공의는 산부인과를 택하지 않는다. 저출산 기조에 분만 인프라까지 붕괴하며 아기 낳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일산차병원에서 남자 아이 3명이 태어났다. 같은 날 이대목동병원에선 자궁내막증 수술을 받은 고위험 산모가 응급 분만을 통해 세쌍둥이를 출산했다. 태어난 아기와 산모는 모두 건강하게 퇴원했다. 당시 응급 분만을 집도한 전종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산모는 임신 31주 3일째인 지난 1일 새벽 4시쯤 응급실을 찾았는데, 혈압이 떨어지고 복강 내 출혈이 생겨 개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대량 출혈에 이어 자궁파열을 발견해 응급 제왕절개술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임신은 증가세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5세다. 첫 아이 출산 연령은 평균 33.6세로 조사됐다. ‘40대 출산’은 더 이상 일부 임산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같은 해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7.9명으로, 20대 초반 출산율(3.8명)의 두 배가 넘었다.
고위험 임산부는 늘고 있는 반면 분만병원은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 수는 463개로, 지난 2013년 706개 대비 243개(34.4%) 줄었다.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는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까지 줄면서 반토막이 났다.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곳은 72곳에 달했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이 22곳, 산부인과가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50곳이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안전한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700여개의 분만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에 분만병원이 있어도 신규 의사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8년 177명에서 2023년 103명으로 감소했다.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상황은 더 나쁘다. 올해 상반기 새로 들어올 산부인과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9일에 접수를 마감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모집인원은 3954명인데 지원은 314명(7.9%)에 그쳤다. 이 중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했으나 1명만 지원해 0.5%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전공의를 가르칠 대학병원 교수는 정년퇴임이 이어지면서 오는 2041년에는 현재의 31%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전종관 교수는 “분만 사고가 생겼을 때 배상금만 10억원이 넘는다. 소신껏 진료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떤 의사가 하겠는가”라며 “소송 등 법적 부담이 경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지역 분만 인프라는 깨진 지 오래다. 고위험 산모를 전원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소신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사법리스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프라는 계속 망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만 인프라를 강화해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라며 “의료 현장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