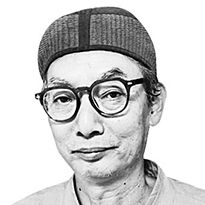고진하 목사·시인 |
봄의 전령은 뚜우 뚜우우~ 나팔을 불며 오지 않는다. 산자락에, 논밭 두렁에 낮게 엎드려 배밀이 하는 꽃다지·냉이·제비꽃·소리쟁이의 걸음마로 온다.
꽃샘바람이 아주 맵다. 왜 봄바람은 꽃을 시샘하는 것일까. 봄기운에 새싹들이 꿈틀대며 올라오지만 바람이 너무 차 집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오후에 바람이 좀 잦아들기에 텃밭으로 나가 보았다. 양지바른 곳엔 노란 꽃다지와 광대나물·냉이·봄까치꽃이 고개를 들고 반겨준다.
■
꽃샘바람 이기는 봄나물은
하나님의 몸인 자연의 선물
‘시간은 돈’이라는 틀 버려야
김지윤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호미를 들고 나가 냉이를 캤다. 며칠 더 놔두면 쇠서 먹을 수 없다. 어린 냉이를 캐서 코에 대 보니, 향긋한 봄내음이 물씬거린다. 지난겨울 폭설도 많이 내리고 얼마나 추웠던가. 그 혹한의 동장군을 이겨내고 연둣빛 경이를 피워낸 냉이 한 바구니 캐서 집으로 들어오며 나는 연신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거저 얻은 선물. 몸을 낮추고 쪼그려 앉아 보듬어 안으면 내 품에 드는 야생의 먹거리. 이런 먹거리는 우리가 산과 들로 나가 채집하는 노력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물론 나는 작은 텃밭에 채소나 가꿔 먹는 소농이기 때문에 쌀이나 과일 같은 농산물은 농부들의 수고에 의존해 살고 있다.
얼마 전 가톨릭 수도자인 리처드 로어의 『오직 사랑으로』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를 언급하며 이런 가슴 뭉클한 구절을 인용해놓았더라.
“프란치스코는 서양 세계가 ‘교회 첨탑에 시계를 설치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에 등장했다. 우리가 계산을 시작했을 때 프란치스코는 계산을 멈추었다.”
교회 첨탑은 오늘날처럼 고층 건물이 없던 시대에 마을에서 가장 잘 돋보였을 것이다. 그 우뚝한 높은 첨탑에 ‘시계’를 설치했다는 것. 시계가 무엇이던가.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며 하루의 삶을 설계하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 ‘시간은 곧 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시계를 보는 일에 익숙해지며 계산적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계산적 이성이 인간을 지배함에 따라 소비주의 또한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서 아무런 계산도 하시지 않는다. 그냥 주시기만 한다. 하느님은 당신의 몸인 자연이 생산한 선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시기만 한다. 하느님은 너희가 이렇게 받았으니 나에게 얼마를 내어놓으라고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의 질서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 자본주의는 철저한 타산에 기반하여 모든 것을 주고받는다. 우리는 땅이나 건물, 소위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소유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대되었다는 듯이 생각해야지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마이스터 엑카르트) 우리의 몸이든 영혼이든, 감각이든 힘이든, 외적인 재화나 명예든, 이웃과의 관계든, 작은 집이든 대저택이든 간에 잠시 임대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자본과 인간의 욕망이 빚어내는 불협화음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놓는 은총의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다 내어주는 자연을 스승 삼으면 될까. 그렇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건강한 몸, 행복을 누리는 마음,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영혼 외에는 요구하지 않는다. 삼라만상은 서로 공감을 나누는 거대한 교향곡이라던가. 나는 오늘 아침에도 참새들 우짖는 소리에 깨어나 교향악단의 일원이 되는 은총을 누렸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