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과속 노화의 종말'…대사증후군 유발하는 식생활 경고
 |
오렌지 주스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바쁜 현대인의 간식을 책임지는 주원료는 밀가루와 설탕이다. 도심의 '오아시스'인 카페 진열대에서 일에 지친 직장인을 기다리는 달콤한 쿠키나 케이크는 이들 두 재료가 없다면 존재하기 어렵다.
스트레스를 잊으려 무심코 집어 드는 이런 간식은 노화를 촉진하고 혈압상승, 고혈당, 혈중지질 이상, (복부)비만 등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인자가 겹친 상태인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키운다.
예전에는 대사증후군이 중장년층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근래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계에 의하면 대사증후군에 걸린 20대는 2018년에 10만5천명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는 15만5천명 수준으로 47.7%나 늘었다고 한다.
의학박사 박민수는 신간 '과속 노화의 종말'(허들링북스)에서 이처럼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에 찌든 현대인의 식생활이 초래하는 위험을 경고하고 노화를 늦추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
케이크 |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남아도는 혈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하고 혈당이 부족할 때 다시 꺼내서 쓰는 항상성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수면 결핍, 과로,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식, 비만, 정제된 고혈당 음식 위주의 식생활 등은 혈당 수치를 일정 범위에서 유지하는 항상성 기능을 망가뜨린다. 현대인은 애초에 항상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한국인의 대다수는 선천적으로 인슐린 기능이 취약하다. 책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의 크기가 12.3% 작고, 췌장 내 지방 함량은 22.8% 더 많으며 인슐린 분비 기능은 36.5% 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한국 사람들의 혈당 처리 능력이 서양인보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슐린 분비 기능과 직결된 당뇨병 통계에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23년 국내 당뇨병 환자는 382만명으로 2019년보다 18.6% 늘었으며 전체 인구의 10%가 당뇨병 환자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책은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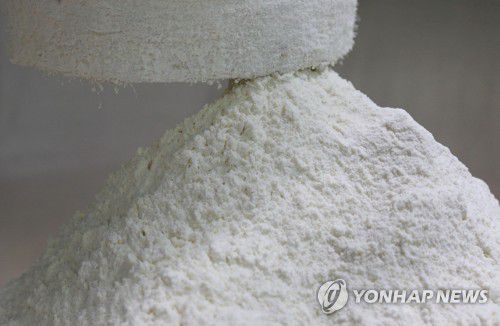 |
밀가루 |
만병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이 젊은 층 사이에서 늘어난 데에는 영양 면에서 불균형한 식생활이 퍼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책은 특히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밀가루를 꼽는다. 수확된 밀은 껍질(표피) 15%, 배젖(배유) 83%, 씨눈(배아) 2%로 구성돼 있는데 밀에 포함된 비타민과 미네랄의 98%는 씨눈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식품점에서 구입하거나 초가공식품의 형태로 먹는 밀가루는 껍질과 씨눈이 제거돼 있기 때문에 영양소 측면에서 반쪽짜리 음식과 마찬가지가 된다.
밀가루는 혈당지수(GI)가 높다.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 과다 분비를 유발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 기능이 저하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고갈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한다. 밀가루 속에 포함된 정제당의 위험성이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이나 알코올에 비견될 정도라고 경고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책은 전한다.
밀가루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이후에는 혈당이 평균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저혈당 상태에 빠지면 인체는 본능적으로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폭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겪고 이후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
채소와 곡물 |
책은 대사 기능을 회복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삶고 데치고 생으로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라고 권고한다.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튀기는 대신 삶거나 데치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가능하면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줄이고 암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으라고 강조한다. 녹황색 채소에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성분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은 물론 신진대사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다. 또 채소에 든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섬유질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식품이다. 하지만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 과일의 주요 성분은 과당과 포도당인데 과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뇨병 전단계이거나 당뇨 환자, 혹은 마른 비만 체형인 경우 과도한 과일 섭취를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특히 과일을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과일 속 당이 액체 형태로 농축돼 몸에 빠르게 흡수되므로 혈당 스파이크(혈당 급상승)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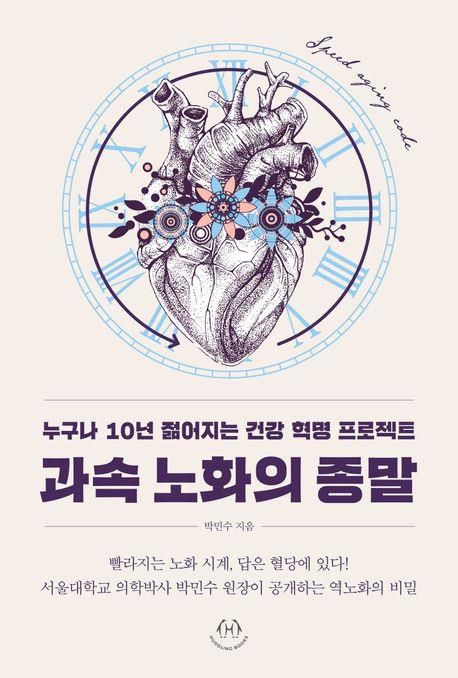 |
책 표지 이미지 |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위험하지만,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고 책은 설명한다. 한국영양학회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려면 하루 에너지의 55∼65% 정도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라고 권한다고 한다. 어떤 탄수화물을 먹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책은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 대신 통밀, 메밀, 현미 등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먹으라고 조언한다.
232쪽.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