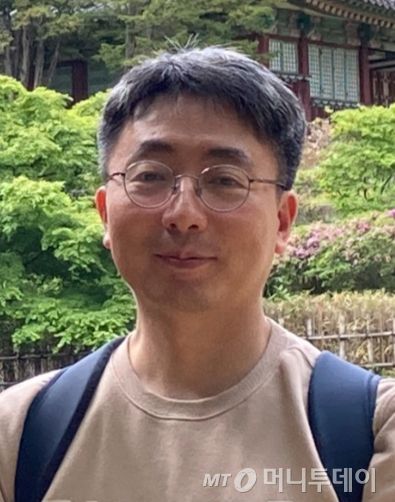 |
중앙박물관 이태희 연구관 |
인쇄는 박물관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박물관 출판물은 글에 오탈자가 없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전시품의 색감과 형태를 인쇄물에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밤새 교정을 보고 인쇄소에서 다시 출력물을 확인하며 아침을 맞는 일도 드물지 않다. 지금이야 도심 재개발과 도시기능 조정 등의 영향으로 많은 출판사와 인쇄소가 파주 등 외곽으로 이전했지만 과거 서울에서는 충무로와 을지로에 밀집했다. 늦은 밤까지 형광등 불빛 아래 "착, 착, 착" 하는 인쇄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해가 밝으면 인근 식당에서는 인쇄공 어르신들이 소주 한 병에 첫술을 뜨는 모습이 이어지곤 했다. 늘 바쁜 곳이었지만 특히 더 분주한 시기가 있었으니 바로 선거철과 연말이다. 이 시기에는 인쇄소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기에 웬만한 책은 일정이 뒤로 밀리기 일쑤였다. 연말마다 뉴스에 단골로 등장한 '달력 인쇄소 풍경'은 한 해의 끝자락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달력은 송년인사의 필수품이었다. 사보 없는 기업은 있어도 달력을 찍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었다. 외국계 대기업부터 읍내 연쇄점이나 종묘상까지 경쟁적으로 달력을 돌렸다. 그러다 보면 집마다 대여섯 개의 달력이 모이는 데 여기서부터 본선이 펼쳐진다. 예쁜 그림, 큰 숫자, 간지표기 등 미적 가치와 가독성, 기능성을 심사숙고해서 연중 집에 걸어둘 두세 개를 고른다. 최종 승자는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하며 한 해 동안 광고판 역할을 톡톡히 하겠으나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는 차례음식 채반 밑 기름받이나 아이들의 낙서장으로 소리 없이 퇴장했다.
동아시아의 전통시대에 달력, 즉 역서(또는 책력)는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다. 양력과 달리 당시 행용된 음력(태음태양력)은 천체 관측을 바탕으로 계산과 보정이 필요했던 까닭에 제작 자체도 어려웠지만 '관상수시'(觀象授時·하늘을 관측해 시간을 받는다)는 제왕의 권리이자 의무였기에 통치자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민간에서 함부로 역서를 제작했다가는 무거운 벌을 받았다. 조선은 명으로부터 매년 역서를 받았지만 국내에서 사용하는 역서는 직접 만들었다. 명나라에서 9월 말일, 또는 10월에 찍은 역서를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려면 해를 넘겨야 했고, 베이징이 기준점이었기에 우리나라의 천체 관측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진 칠정산 내외편은 역서 제작의 참고서였다.
역서는 책 형태로 벽걸이용 달력보다 다이어리에 가까웠다. 관상감에서는 매년 역서를 찍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5000부 정도에 불과했으나 후기에는 인구도, 수요도 늘어 38만부까지 증가했다. 많은 수량이 발간됐지만 공급은 수요를 맞출 수 없었고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베껴서 사용하기도 했다. 워낙 다량으로 찍었기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박물관은 물론 도서관에도 꽤 많다. 역서에는 연, 월, 일 및 각각의 간지와 길흉, 일진 정보가 있었다. 어떤 사용자들은 여기에 그날의 날씨와 중요한 일을 부기했다. 아마 남아 있는 일력을 모두 모아보면 조선 후기 기상데이터를 복구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조선시대 역서는 '민력'(民曆)이란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연말연시 대형 서점의 한 귀퉁이를 장식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민력은 물론 달력을 찾는 이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눠주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 역시 스마트기기 속으로 빨려들어간 세상만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인가, 달력을 바꿔 걸던 순간이 이제 아련한 추억이 돼 떠오르곤 한다. 한 해를 견디며 색깔은 누렇게 바래고 귀퉁이는 말려들어간 달력을 떼어내고 새것으로 걸 때 그 기분이란. 이제 곧 동지다.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 임금은 신하들에게 신년의 달력을 선물했다. 낡은 것을 털어버리고 새것을 맞이하는데 이만한 선물이 있을까. 새해는 달력을 하나 사봐야겠다.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