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성의 표현과 이용방식 고찰
지금도 여전한 처녀성 신봉 짚어
“더욱 폭넓고 촘촘한 연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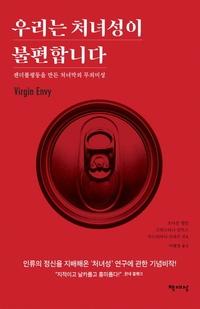 |
우리는 처녀성이 불편합니다
조너선 앨런·크리스티나 산토스·아드리아나 슈파르 엮음, 이혜경 옮김/책세상·2만원
13세기에 발간된 의학 논문 <여성의 신비>에는 여자가 처녀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백합을 갈아 먹여보라고 나와 있다. “처녀가 아니라면 백합을 먹는 즉시 오줌을 싸게 된다”는 것이다. 가부장제의 유구한 역사에서 여성의 처녀성 검증은 ‘재산을 물려줄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지 확실히 한다’(장자상속)는 실용적인 목적 아래, 여성의 몸을 소유하고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됐다. “처녀성을 욕보이는 데 열광했던” 18세기 로맨스 소설들은 철옹성과도 같은 처녀막을 파괴하고 처녀성이라는 보물을 획득함으로써 한 여성을 지배하게 된 남자주인공의 전쟁과도 같은 모험담을 들려준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여성이 시트에 흘린 붉은 피야말로 처녀성의 완벽한 증거이자 이 전쟁의 로맨틱한 전리품으로 그려진다.
21세기 개명천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성의 몸속에 처녀막 따위는 없다는 ‘과학적 지식’과 처녀성이라니 이 무슨 전근대적이고 차별적인 용어인가 개탄하는 ‘젠더 감수성’쯤은 갖춰야 마땅할 듯하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처녀성이 불편합니다>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조너선 앨런, 크리스티나 산토스, 아드리아나 슈파르는 오늘도 전 지구적으로 활약이 눈부신 ‘처녀성에 대한 환상’을 프로이트의 ‘남근 선망’ 개념에 빗대 ‘처녀 선망’(Virgin Envy)이라 이름 붙인다. 이들은 동서고금의 문학과 대중문화에서 처녀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이용되는지 고찰한 11명 학자의 연구를 소개한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에이미 버지는 백합을 갈아 마신 여성이 화장실로 뛰어가는지 감시하던 시대에서 무려 800여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처녀성 검사를 시행하는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초야를 치른 신부의 처녀성을 증명하기 위해 혈흔이 묻은 시트를 공개하는 관습이 여전한 터키의 사례를 든다. 또한 서양 여주인공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의 왕족인 남자주인공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의 현대 로맨스 소설들이 여전히 처녀성을 칭송하고 서사의 주요 장치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동양처럼 먼 곳의 일’로 치부해 문제를 교묘히 피해간다고 지적한다.
조너선 앨런과 크리스티나 산토스는 숫처녀 인간과 숫총각 뱀파이어가 혼전순결을 굳건히 지키는 영화 <트와일라잇>이 “금욕, 순결, 정조, 처녀성에 대한 미국의 문화적 강박을 투사하고 있다”고 짚는다. 인기 미국 드라마 <트루 블러드>를 분석한 제니 지헨바우어는 상처치유 능력이 있는 뱀파이어 제시카가 분방한 성생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처녀막 회복을 통해 영원히 처녀로 살아가는” 설정이 “젊은 여성의 과잉성욕을 칭송하는 한편 성적 금욕을 요구하는 미국사회의 이중성을 반영한다”고 꿰뚫는다. “착한 소녀는 결혼 전까지 처녀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는 <트루 블러드> 속 미국 중간계급의 ‘가족적 가치’는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가 지난 100년간 되풀이해온 주제이기도 하다. 아스마 세이이드는 “최근 20년 동안에는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선택하는 외관상 해방된 여성 인물들이 등장했지만, 영화는 결국 이들이 자신의 처녀성을 앗아간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인도사회의 가부장성을 영속화한다”고 설명한다.
2011년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을 체포해 처녀성 검사를 했다. 트레이시 크로 모리와 아드리아나 슈파르는 이 일이 멕시코혁명에 참여한 여성 전사들이나 칠레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시기 여성 게릴라들이 당한 고문과 성폭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간파하면서 “정치적 행동을 하는 여성들의 ‘질’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결국 여성의 ‘입’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불과 며칠 전 국내 드라마 <왕이 된 남자>에선 가짜 왕에게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진짜 왕이 중전과 합방을 서두르며 “당신이 ‘누구의’ 여인인지 알려주겠다”고 을러대는 장면이 나왔다. 중전의 처녀성을 갖는 이가 ‘진짜 왕’이라는 얘기다. 성폭력으로 처녀성을 훼손당한 피해자만 ‘피해자답다’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꽃뱀 취급하는 흐름 역시 ‘처녀 선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저자들이 “처녀성 관련 연구가 앞으로 더욱 폭넓고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미경 자유기고가 nanazaraza@gmail.com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