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5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컴퓨터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위민인테크(Women in Tech)’ 페스티벌.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스타트업 '마미모니터'의 창업자 엘지 아오마토(가운데)가 벤처투자자 및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사업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마운틴뷰=신혜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실 정부창업지원금은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를 지원서류에 적절히 넣고, 논문을 좀 열심히 봐서 기술구현이 어떻게 가능할지 설명을 쭉 써주면 돼요. 만약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들의 관심사와 사업 아이템을 연결해서 점수를 더 얻을 수도 있죠.”
지난해 인터뷰한 국내의 한 청년 창업가는 ‘창업기금 마련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벤처창업이 미래경제 동력으로 주목되면서 정부주도 지원사업도 많아졌지만, 사업모델 심사를 관련학과 교수나 정부 관료가 주로 하다 보니 통과를 위한 일종의 ‘공식’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를 눈치 챈 청년 창업가들은 여러 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사업계획서가 실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오히려 정부지원금만 받아 생명만 연장하는 ‘좀비기업’만 양성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자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머물렀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청년들 역시 창업 마중물 자금을 얻기 위해 사업계획서 쓰는 법이나 발표하는 방법을 배운다. 모의 피칭(사업모델소개) 대회나 세미나도 활발하다. 14일 스타트업 투자ㆍ채용 플랫폼 ‘엔젤리스트’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는 3만8,226개의 스타트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걸음마 단계의 도전자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4만여개의 사업모델 중 눈에 띄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 ‘공식’은 없다. 투자회사 수만 650개, 스타트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주목하고 있는 대기업까지 합하면 1,000여개가 넘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형화된 방식으로는 이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 투자회사들도 소비재ㆍ헬스테크 등 특정 분야나 창업단계에 특화된 투자를 하고 있으니 평가기준도 제각각이다. 헬스테크 기업인 ‘미야헬스’의 마케팅디렉터 알렉스 골드는 “좋은 피칭은 창업자의 개성과 비전이 담긴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한다. 창업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를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발달한 것이다.
물론 오랜 역사의 실리콘밸리에 비해 걸음마 수준인 우리 창업생태계에 이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방법은 있다. 정부주도 창업기관에서 일하다 실리콘밸리로 이주한 한 사업가는 “정부사업 심사위원에 창업경험이 없는 학계 인사 대신 실제 사업을 하며 산전수전을 겪어본 사업가를 선정한다면 보다 많은 유망기업이 발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의 실리콘밸리 조성’ 같은 겉모습보다 벤처창업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조언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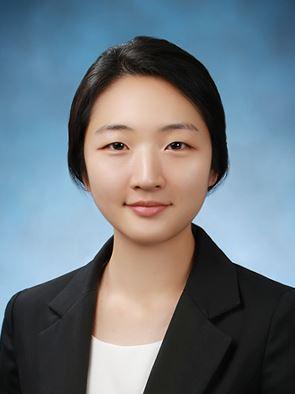 |
신혜정 한국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