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때 동독 경비병들 '수수방관' / 서독이 동독 주민에 발포한 경비병 명단 기록했기 때문 / 같은 역할 하는 北인권기록보존소는 文정부 들어 약화 / "북한에서 인권 실현하려는 노력은 미룰 수 없는 과제"
 |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뒤 동·서베를린 시민이 나란히 장벽 위에 올라가 대결 종식을 자축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베를린 장벽 넘어도… 동독 경비병은 지켜보기만 했다
실은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의 ‘완전한 무용지물화’를 의도한 게 아니었다. 동독 주민들이 서베를린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출국 허가증’을 신청해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 법률안에 명시했다.
하지만 1989년 11월9일 오전 일부 언론이 이 대목을 쏙 빼고 ‘동독 정부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가했다’는 취지로만 보도한 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보도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은 동독 주민들이 출국 허가증 신청 등 절차를 과감히 생략한 채 동·서독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하고, 공권력으로 도저히 막을 없는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만 장벽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1989년 11월9일 오후 동베를린 시민들이 장벽 앞으로 몰려와 “서베를린으로 넘어가겠다”고 요구했을 때 동독 경비병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처지였다. 그들은 ‘주민들을 그냥 통과시키라’는 명령을 상부에서 받은 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을 든 경비병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장벽으로 쇄도하는 주민들한테 발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독일 현대사 전문가인 윌리엄 스마이저는 최근 국내에 번역·출간된 저서 ‘얄타에서 베를린까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경비병도 마지막 ‘사회주의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서독이 난민에게 발포한 국경 경비병 명단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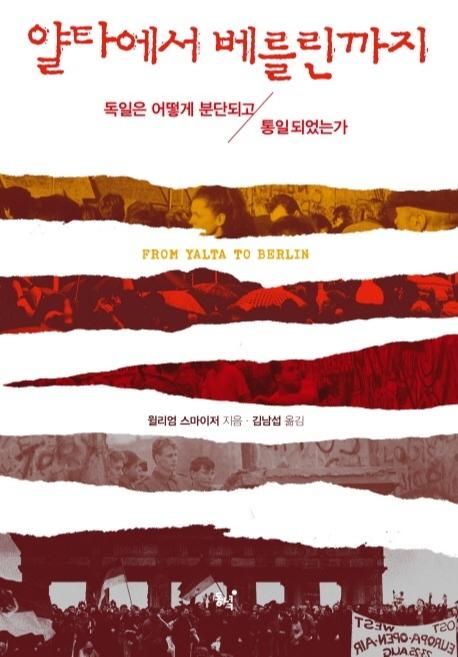 |
독일 현대사 전문가 윌리엄 스마이저가 독일 통일의 과정을 기록한 ‘얄타에서 베를린까지’ 표지 |
◆서독 "동독 주민에 발포한 경비병 명단 다 갖고 있다"
책은 ‘난민’이란 문구를 썼지만 이는 실은 동독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의 탈출을 시도한 동독 주민을 뜻한다. 냉전 시절 동독 경비병들은 베를린 장벽 월담을 시도하는 이가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 즉각 실탄이 든 총을 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래 1989년까지 장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다 사살된 이가 130∼200명에 달하고 체포된 이도 3200여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중요한 건 서독 정부가 탈출하려는 동독 주민에게 발포한 동독 경비병 명단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베를린 장벽 너머 서베를린 지역에는 동독 경비병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하는 요원이 별도로 배치됐는데, 그들이 총을 쏜 경비병의 신상정보를 차곡차곡 기록해둔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 과거 동독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범죄를 처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동독 경비병들은) 서독이 난민에게 발포한 국경 경비병 명단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스마이저의 표현에서 ‘통일 이후의 봉면’을 의식한 동독 공무원들이 극도로 몸을 사렸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90년 통일이 이뤄지고 난 뒤 독일은 인권침해 범죄에 가담한 동독 관료들을 공직에서 추방했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면 형사처벌까지 가했다. 동독 시절의 판검사와 경찰관, 군인 등이 대표적이다. 옛 동독 판검사 약 3000명 중 3분의2가 통일 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통계도 있다.
 |
2016년 10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우리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文정부 들어 되레 약화
한국도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그것이다. 보존소는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여러 차원에서 모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중 접경지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집결소(강제로 송환된 탈북자 등을 임시로 가두는 구금시설), 교화소(교도소), 관리소(정치범 가족 등을 수용하는 시설)에서 이를테면 모월 모일 모시 이뤄진 성폭력 및 그에 대한 조직적 은폐 시도 등 구체적 범죄 행위를 상세한 기록으로 만들어 남기는 식이다.
그런데 이 보존소가 문재인정부 들어 ‘힘이 확 빠졌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공안통 부장검사가 맡던 보존소장 자리는 최근 4급(서기관)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으로 ‘격하’됐다. 보존소장 밑에 검사 2∼4명을 보내 파견근무를 시키던 관행도 사라졌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부가 남북대화를 의식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보편적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보존소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백태웅 교수는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창설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모은 정보를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형사사법적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서 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