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규나 소설가 |
죽을힘을 다해 뛰어올라간 다뤼는 숨을 헐떡이며 언덕 정상에 멈춰 섰다. 바위들이 뒤덮인 남쪽 벌판은 푸른 하늘 아래 그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동쪽 들 위로는 벌써 아지랑이가 가물거리고 있었다. 이 가벼운 안개 속에서 감옥으로 향해 뻗은 길을 천천히 걷고 있는 사내를 발견하고 다뤼는 가슴이 아팠다.
ㅡ알베르 카뮈 '손님' 중에서, 단편집 '적지와 왕국'에 수록.
외딴 고원, 작은 학교에 재직 중인 다뤼에게 손님이 찾아온다. 늙은 군인은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온 죄수를 도시의 관할 재판소에 인계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떠난다. 전쟁 중 인력이 부족해진 탓에 교사인 다뤼에게도 공무 집행의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살인했다는 사내는 기회가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는다. 처음엔 권총을 손에 쥐고 경계하지만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다뤼는 갈등한다. 아무리 살인자라지만 경찰도 군인도 법관도 아닌 자신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협조하는 것은 정당한가. 1957년에 발표한 '손님'을 통해 작가 알베르 카뮈는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선 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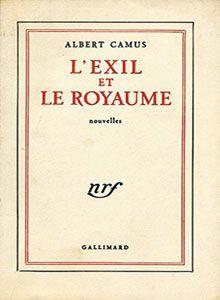 |
다음 날 함께 길을 떠난 다뤼는 정부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알면서도 갈림길에 멈춰 선다. 식량과 여비를 사내에게 건네며 멀리 떠나 살아가라고 당부한다. 발을 떼지 못하는 죄수를 등 떠밀었던 다뤼는 한참 후 뒤를 돌아본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도 사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뤼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는다.
한국 정부가 탈북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했다. 동료들을 죽였다는데 흉기도 혈흔도 시신도 확인된 게 없다.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했다면서도 자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포박하고 눈을 가리고 재갈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서울 한복판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하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처형당할 줄 알면서도 사지로 돌려보낸 사람들. 해외 난민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만은 모질고 잔인하기가 짝이 없다.
[김규나 소설가]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