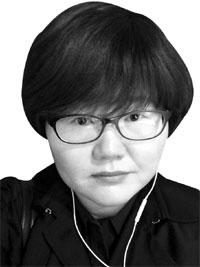 |
한국 추상화 선구자인 김환기의 푸른 점화 '우주(Universe) 05-IV-71 #200'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지난해 11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132억원에 팔린 이 작품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낙찰 당시만 해도 송재엽 동원건설 대표의 아들인 송자호 M컨템포러리아트센터 수석큐레이터가 "지인들과 공동 투자한 펀드에서 '우주'를 낙찰받았지만 아직 정리할 게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 기자의 전화를 받은 송 큐레이터는 '우주'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매사인 크리스티코리아는 "컬렉터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송 큐레이터는 지인들과 작품 소유 정리(?)에 실패한 것일까. 아니면 혹시 세무조사가 두려워 구입 사실을 숨기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고가 미술품 구입을 공개하면 국세청의 표적이 된다. 특히 기업인이라면 비자금과 돈세탁에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로 서울미술관 설립자인 안병광 유니온약품그룹 회장이 2010년 35억6000만원에 이중섭 유화 '황소'(1953)를 낙찰받은 게 공개돼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인지 2년 전 85억원에 김환기의 붉은 점화 '3-Ⅱ-72 #220'을 낙찰받은 사람도 지금까지 소유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림을 산 게 죄는 아닌데 한국에서는 컬렉터가 세무조사를 받는 게 두려워 비밀에 부치려고 한다. 실제로 고가 미술품이 낙찰되면 세무서가 경매사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림을 탈세 등 범죄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부가 미술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외국에선 그림을 샀다고 세무조사를 하는 사례가 드물다. 대체로 외국 컬렉터는 미술품 구입을 명예로 생각하고 떳떳하게 밝힌다. 구입한 미술품을 일반인도 관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훗날 미술관에 기증해 문화예술 유산으로 남긴다. 미국 석유재벌 록펠러 가문은 평생 모은 방대한 미술품을 뉴욕 현대미술관(MoMA·모마)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에 기부해왔다. 미국 카지노 재벌 스티븐 윈도 고흐, 고갱, 피카소 등의 걸작을 구입해 갤러리에 걸고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카지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웠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정부는 2017년 세계 경매 최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구세주)'를 구입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부(國富)를 과시하기도 했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30만달러(약 5000억원)에 낙찰된 이 작품은 루브르 아부다비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국내에서도 미술계 발전을 위해 컬렉터가 양지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미술품 구입이 작가들을 후원할 뿐 아니라 국가 문화유산을 남기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소장품을 미술관에 기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명예와 혜택도 줘야 한다. 모마와 메트로폴리탄도 미술품 기부 덕분에 세계적인 컬렉션을 보유하게 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강화와 세무조사로 옥죄지 않아도 미술 시장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미술 시장 규모는 2018년 5000억원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4482억원(예술경영지원센터 기준)으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낙찰 총액도 1565억원으로 전년 낙찰 총액인 2194억원보다 629억원(28.7%) 급감했다.
[문화부 = 전지현 차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