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규나 소설가 |
눈이 마주치자 그는 짧게 다듬은 까만 콧수염 밑에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동물처럼 미소 지었다. 피부는 가무잡잡하게 햇볕에 탔고, 눈은 강간할 처녀나 도망치려는 범선을 가늠해 보는 해적의 눈처럼 까맣고 대담했다. 그녀를 쳐다보며 빙긋 웃는 입가에는 냉소적인 즐거움이 서렸고 얼굴에는 냉혹한 무자비함이 드러나서 스칼릿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ㅡ마거릿 미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콧수염 기른 남자 하면 레트 버틀러가 먼저 떠오른다. 1936년에 발표된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히어로. 처음에는 경멸당했으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흑기사처럼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끝내는 스칼릿의 마음을 사로잡은 레트는 첫인상부터 강렬했다. 스칼릿의 첫사랑 애슐리가 혈기도 없고 콧수염도 기르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콧수염 있는 남자와 키스하면 따갑지 않을까 궁금하던 여학생 시절, 레트를 연기한 클라크 게이블의 사진을 구하려고 충무로를 뒤지고 다녔다.
채플린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비극적인 콧수염도 있고, 히틀러나 스탈린, 레닌과 마르크스의 잔혹하고도 폭력적인 콧수염도 있다. 콧수염 없는 조선 왕들의 어진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한제국의 고종과 순종도 권위적인 콧수염을 기르고 있다. 꽃미남, 초식남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한껏 멋 부린 콧수염이 부와 권력, 세련됨과 남성다움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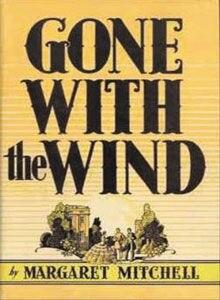 |
어떤 이유든 외모를 조롱하는 건 유치하고 비겁하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콧수염이 일제 총독을 연상시킨다지만 정확히 누굴 말하는지도 궁금하다. 많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떠올렸겠지만 그는 총독이 아니었다.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기 전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었다.
레트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했던 스칼릿을 냉정하게 떠난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보내면 남는 건 뒤늦은 후회뿐이다. 남북전쟁을 치르느라 너무 지쳐 울 기운도 없던 스칼릿은 내일 다시 힘을 내어 사랑을 되찾으리라 다짐한다. 누구에게나 내일의 태양은 떠오른다. 다만 진실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김규나 소설가]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