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자
아니 에르노 지음·정혜용 옮김
열린책들|110쪽|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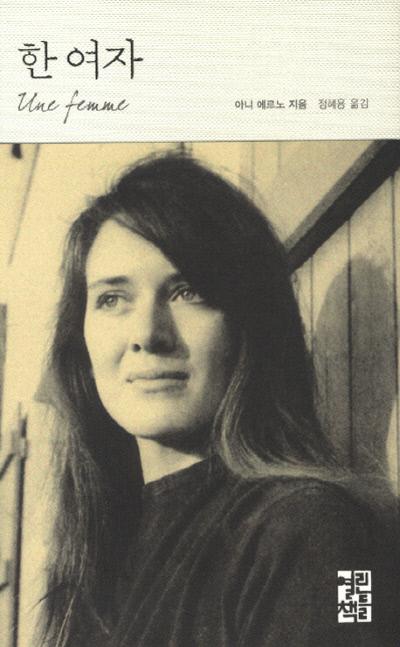 |
극장에서 <작은 아씨들>을 봤어요. 개성이 뚜렷한 네 자매 중에서 작가지망생 ‘조’한테 저는 아무래도 감정이입이 됐지요. 소설 배경이 된 19세기에 ‘여성의 이야기는 결혼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조는 시대를 거스르는 선택을 해요. 가정에 예속되지 않고 글 쓰는 단독자로 살기로 마음먹고 사랑하는 사람의 구애를 거절하죠. 한데 작가로 인정받는 길은 험난하고 점차 삶에 지쳐가요. 엄마에게 결심한 듯 말하죠.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엄마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며 딸을 말리고 조는 엄마에게 무너지듯 안겨 울어요. 외롭다고, 너무 외롭다고 고백해요.
덩달아 눈물지었네요. 결혼이 여성에게 자기 단념의 선택지가 되는 게 슬펐어요. 한 여자가 제 본성대로 살려면 밖으로 물리쳐야 할 것들과 안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 단단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무게에 자기가 눌리는 거 같아요. 조가 센 척했지만 나약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도 기대지 않고 살아갈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그 장면에서 느꼈어요.
스크린 위로 선생님 얼굴이 겹쳤어요. 근래 제가 만난 가장 강한 여성이고, 조처럼 밤을 밝혀 글을 쓰는 여자가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봐요. 지난 연말 한 시사주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선생님을 인터뷰할 때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잘 쓰고 싶어서요. 잘 쓴다는 건 빤하게 쓰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에게서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을 보고 싶어 해요. 그만큼 놀라운 활약을 하셨죠. 귀 막고 눈 감은 세상에 비정규직 문제와 안전 노동의 이슈를 알렸어요. 자식 잃은 엄마의 고통을 투쟁으로 승화하는 이야기는 숭고하지만 무수히 소개됐고 익숙한 한국적 모성 서사이기도 해서, 그 안전한 이야기의 틀을 넘어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엄마든 누구든 하나의 단어로만 설명되는 단순한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한 사람에 대한 기록, 그 엄중한 과제 앞에서 제가 도움받은 책이 있어요. 아니 에르노의 <한 여자>라고 딸이 엄마의 삶과 죽음을 기록한 자전적 소설이에요. “어머니는 농번기인지 아닌지, 병이 난 형제자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들쭉날쭉 학교를 다녔다”는 문장에선 놀랐어요. 배움의 의자를 빼앗기고 희생의 자리에 배정되는 여자의 삶은 국경이 없구나 싶었죠. 저자의 어머니는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엄마처럼 자애로움의 화신이 아니에요. 딸에게 불쾌한 계집애라고 폭언을 퍼붓고 때리고,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은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것 전부를 내게 주는 것이었다”고 딸이 말할 정도로 집착해요. 딸은 기억하죠. “나는 내 딸이 행복해지라고 뭐든지 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더 행복한 건 아니었지”라던 엄마의 체념 어린 말을요. 정신적으로 고양되려는 의지, 권위, 낭만, 야심, 분노, 의심, 딸에 대한 지지와 질투 등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의 활화산을 품고 있는 사람. “때로는 ‘좋은’ 어머니를 때로는 ‘나쁜’ 어머니를” 본다고 딸은 진술해요.
이 책이 좋은 이유는 한 사람을 선악 이분법으로 가르지 않고 그 양극단을 오갈 수밖에 없었던 격렬한 삶의 조건과 맥락을 살핀다는 점이에요. “나는 어머니의 폭력, 애정과잉, 꾸지람을 성격의 개인적인 특색으로 보지 않고 어머니의 개인사, 사회적 신분과 연결해 보려고 한다.” 한 인간이 처한 사회 구조, 모순과 욕망의 지도를 읽어내기를 포기하지 않고 감정의 실개천까지 포착한 글들은 사모곡을 넘어선 인간 탐구서가 됩니다.
선생님, 책장을 덮고 나자 “내가 태어난 세계와의 마지막 연결고리” 내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에 대해 나는 얼마나 글을 쓸 수 있을까. 그저 식구들에게 세끼 따스운 밥 해먹이던 엄마, 김치 떨어질까 반찬 나르기 바빴던 무던한 엄마였다고 말해왔는데, 그건 어쩌면 내가 엄마의 다른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 속내나 감정도 검열 없이 내보이게 되잖아요.
 |
엄마는 살다가 미칠 것 같을 때 무얼 했을까. 새벽미사 기도로는 풀리지 않는 생의 분노와 갈증과 허기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주술이 정신의 안정제이자 마취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랬고요. 엄마가 되면 희생이나 헌신은 자연스럽도록 엄마의 욕망, 엄마의 영혼, 엄마의 외로움, 엄마의 자아분열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도록 우릴 길들였으니까요.
인터뷰하던 날, 선생님이 같은 자리에 있던 20대 기자의 손을 잡고 말했죠. “이런 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글로 쓰기로 해요. 엄마로만 살라 하다가 엄마로 살지도 못하게 자식을 빼앗아가버리는 이 무자비한 세상의 말들 안에서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무지개보다 예쁜 마음’을 가진 ‘작은 아씨’였던 ‘한 여자’의 다성적인 목소리를요.
은유 | 작가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지금 많이 보는 기사
▶ 댓글 많은 기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