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에서 문명비판으로 중심이동
반어와 역설 통해 날카로운 통찰 보여
“무소유는 가진 뒤의 자유다”
“광장을 먹고 튄 자들이 있다”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 자유의 비결
 |
이렇게 한심한 시절의 아침에
백무산 지음/창비·9000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백무산의 시 세계는 노동 현실을 보고하고 노동자의 해방을 향한 싸움을 독려하는 데에서 출발해 인간 문명의 폐해를 지적하고 생태적 전망을 모색하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제목부터가 강렬하게 노동 및 노동자 지향성을 드러냈던 첫 시집 <만국의 노동자여>(1988)에서부터, 허무와 절망을 직시하는 가운데 신생의 가능성을 추구한 <폐허를 인양하다>(2015)까지 아홉 권 시집에 그런 이력은 오롯이 기록되었다.
그의 열 번째 시집 <이 한심한 시절의 아침에>는 백무산의 최근 관심사를 심화, 확장한 시편들로 채워졌다. 현실 정치와 지배 질서에 대한 환멸,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회의와 반성, 시간으로 상징되는 문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다짐 등을 새 시집에서 두루 만날 수 있다. 환멸과 반성과 다짐을 표현하기 위해 시인은 자주 역설과 반어라는 수사법에 기댄다.
“무소유의 청빈함을 제대로 글로 쓰는 작가는 좀 살 만한 자다/ 어디 가나 밥과 집이 넉넉한 스님이라야/ 무소유를 제대로 설법할 수 있다// 무소유는 가진 뒤의 자유다”(‘무무소유’ 부분)
“현자들은 현재만을 살라고 충고하지만/ 현재를 살아볼 도리가 없다/ 지금은 끓고 있을 뿐이다// (…)/ 현재는 허기다 주린 배로 사냥에 나선/ 피에 젖은 발톱이다/ 둥지로 돌아가지 못한 부러진 날개다// 지금은 먹을 수 없다 죽을 지경이다/ 현재는 끓고 있는 창세기다”(‘밥이 끓는 동안’ 부분)
무소유가 오히려 소유에 기반한 자유라는 지적은 날카롭고 통렬하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무소유의 청빈함과 자유란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현재에 충실하라는 충고도 마찬가지. 현재를 충실히 살 수 있는 것 역시 배 부르고 등 따스운 이들의 특권일 따름이다.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이에게 현재만을 살라는 조언은 죽으라는 말이나 매한가지, 한가한 헛소리로 들릴 것이다.
히말라야에서 마주친 순례객들에게서도 시인은 역설과 반어의 산 증거를 본다. “죄 없는 자들일수록 더 많이 참회하고/ 적게 먹는 자들이 더 많이 감사하고/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이 뉘우치고/ 힘들여 사는 자들일수록 고행의 순례길을 떠”(‘히말라야에서’)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그런데 시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그는 선을 긋는다. 그런 순례객들의 모습은 일견 아름다울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실에 대해 지니는 효과에 그는 부정적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여전히 철저한 유물론자라 할 수 있다.
“꽃을 노래하고 별을 우러르고/ 영롱한 이슬을 글에 담는 사람들”(‘인간 형성’)과 그들을 떠받들며 칭송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백무산은 가차없이 일갈을 날린다. “속에 구정물이 가득해서 이슬을 찾고/ 당장 숨이 차고 혼미해서 꽃을 찾고/ 인간성이 시궁창이라서 향기를 찾고/ 영혼이 누더기라서 별로 기워야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들에 견주어 그가 오히려 평가하는 이는 “종일 남의 집 똥구덩이에 고개를 박고/ 얼굴에 입술에 똥물 바르고 그 돈 벌어 밥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마누라 화장품도 사주고 조상 제사도 모시”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더럽고 고된 노동을 밥벌이로 삼는 이들. 노동을 경시하고 추상적 가치를 숭상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은 인간과 인간성 자체에 대한 반성으로 나아간다.
“인간이 제 손으로 똥 푸는 일이 없어지고/ 자기가 싸놓고 제 것이 아닌 양/ 혐오하고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고상한 습성을/ 동물과 유일하게 구별되는 습성을/ 우리는 인간성이라고 부른다”(‘인간 형성’ 부분)
새의 비상은 흔히 자유의 표상으로 찬미되곤 한다. 그러나 백무산은 진정한 자유는 중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딛고 있는 데에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땅을 떠나면서 우리는 자유를 잃고 불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림자가 스며들지 않는 풍경들/ 흙냄새를 품지 않는 풍경들/ 나무의 그늘과 풀을 밟고 있지 않는 풍경들/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없는 풍경들”(‘과잉 풍경’)은 지구를 납작하게 만들고 인간을 오히려 구속한다는 것. “나는 아직도 희미한 그 집에 가고 있다/ 흙과 짐승과 나무가 주인인 집에/ 이랴이랴 소 한 마리 끌고 돌아가는 중이다”(‘소를 끌고’)라는 고백은 생태적 가치에 충실한 ‘오래된 미래’를 향한 그리움을 불교의 심우도에 빗대어 노래한다.
“올 필요 없답니다/ 민주화가 되었답니다/ 민주화가 되었으니 흔들지 말랍니다”(‘겨울비’), “광장을 먹고 튄 자들이 있다// (…)// 그 광장에 힘 있는 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광장이 사라졌다’) 같은 시들이 현실 정치를 향한 따끔한 질책을 담았다면, 이번 시집의 정수를 담은 작품은 ‘정지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반어와 역설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새로운 문명과 시간 질서 구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그러하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정지의 힘’ 전문)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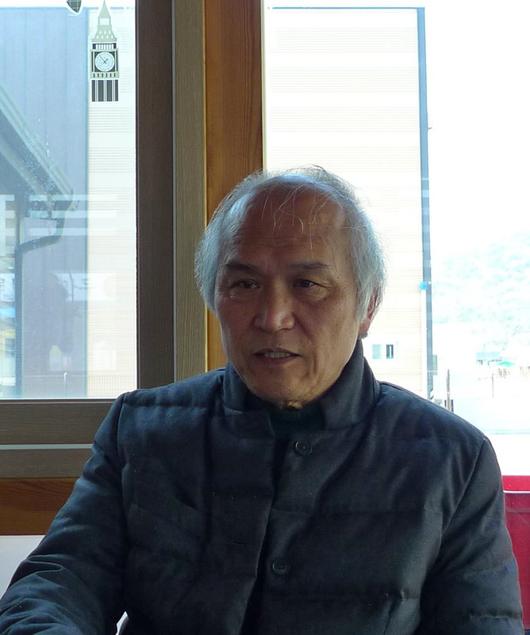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연속보도] n번방 성착취 파문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