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노동, 문화 모든 것들의 가치를 후려친 자본주의 600년사
한꺼번에 찾아온 후려치기의 대가...생산-소비-재생산 반복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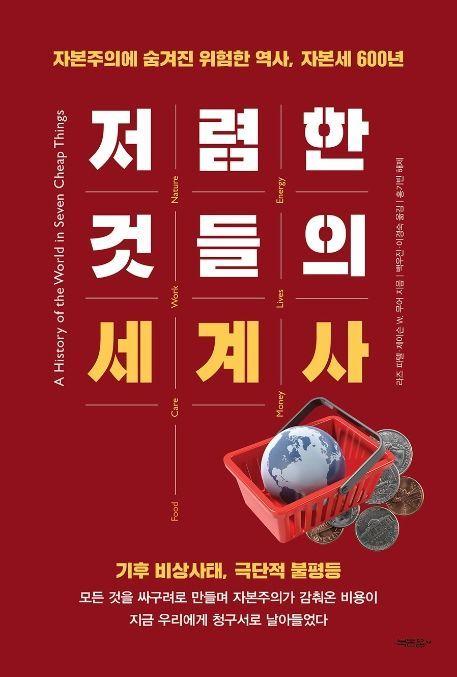 |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자본주의의 시초는 영국의 산업혁명이다. 석탄ㆍ증기기관ㆍ철도라는 삼위일체가 막대한 잉여생산력과 함께 거대한 자본시장을 구축하고, 놀라운 기술 발전이 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왔다.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의 세계 정복기는 이처럼 거창하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역설적이게도 카를 마르크스(1818~1883)가 주창한 사회진화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는 거창한 사회진화론에서 벗어나 좀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본주의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에서 설명하는 자본주의 역사의 뿌리는 교과서 내용보다 40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간다. 석탄ㆍ증기기관ㆍ철도가 없던, 아직 유럽에서 마녀사냥과 십자군이 판치던 무지몽매한 시대 14세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왜 하필 14세기일까. 14세기 말엽에 소빙기라는 전지구적 기상 재앙이 갑자기 찾아왔다. 온 세상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농업 생산량은 급감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료제와 백신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흑사병이 유럽 인구 절반의 목숨을 앗아간다. 이로써 느긋하고 목가적이던 중세의 질서는 완전히 해체된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된 유럽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유럽인들은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기 시작한다.
바다로 나간 유럽인들은 그러다 운 좋게 15세기에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섬들을 발견한다. 유럽과 중동에서 금값으로 거래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안성맞춤인 옥토였다. 자본주의는 아메리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탄생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에는 유럽인들이 알고 있는 나라나 법, 종교라는 장벽조차 없었다. 오로지 한탕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탐욕만 존재했다. 유럽 출신 정복자들은 한탕을 위해 눈앞에 놓인 모든 것의 단가부터 후려치기 시작한다.
사탕수수밭으로 일구기 위해 밀림마다 불을 질러 밀어버렸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끌고 와 아메리카에 대량으로 퍼뜨렸다. 노예 품종 개량에도 나서 온순한 아메리카 원주민 노예와 체력 좋은 백인 노예, 더위에 강하고 지구력 좋은 흑인 노예들의 교배로 신인류가 탄생한다. 오늘날 중남미 대부분을 차지한 혼혈 인종이 탄생한 것이다.
아메리카 사탕수수 사업은 점차 번창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설탕은 각국의 국왕조차 1㎏을 얻는 데 수년의 시간과 노력, 돈이 필요할 정도로 귀했다. 단맛에 일단 길들여진 사람은 더 많은 설탕을 원했다. 수요는 계속 팽창했다. 수익이 쏠쏠했다. 유럽의 상인들은 공동 출자해 원정대를 계속 파견한다. 유럽의 자본과 아메리카의 토양, 아프리카의 노동력이 결합된 삼각무역은 이렇게 태어났다.
대항해 시대의 초기 식민지 체제는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체제로 굳어져 유럽에 재수입된다. 자본주의는 중세 1000년 동안 왕ㆍ귀족ㆍ성직자를 떠받친 봉건제도마저 깨뜨리기 시작한다. 자연 파괴로 원자재를 생산하고 영주의 장원에 매인 노동력을 끄집어내 저임금 노동자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상품을 광범위한 지역에 판매한다. 생산-소비-재생산의 반복으로 점철되는 자본주의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유럽인들도 자본주의 풍파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전만 해도 유럽 사회는 중동의 이슬람 문명권처럼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그러나 200년이 넘도록 성전을 치른 유럽 사회에서 신앙의 무게는 한없이 가벼워졌다. 전쟁은 수지타산이 맞을 때만 하는 산업으로 변질됐다.
노동력의 바탕인 가정도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재편되기 시작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라는 물결 속에서 농경사회에 근간한 유럽 전통의 대가족 체계가 철저히 무너진다. 무한한 권한을 지닌 가부장이 이때 출현한다. 중세까지 남성과 동일하게 모든 노동에 동원된 여성 인력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갇힌다. 여성의 삶은 우수한 인적 노동자원을 생산ㆍ관리해 자본주의 체제에 바치는 일로 목적이 변질된다.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는 자본주의의 추악한 본모습을 들춰내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그동안 단가를 후려치며 착취해온 지구 환경과 인권 문제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경고한다. 그 대가들이 한꺼번에 모두 치러야 할 빚으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인 생산-소비-재생산의 무한 반복이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은 파괴되고 인구는 수용 범위를 넘어섰다.
저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는 단순한 주장에서 벗어나 세계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동안 자본주의가 성장해오며 땔감으로 써온 원주민ㆍ지역문화ㆍ자연ㆍ여성ㆍ노동 등 모든 문제를 유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차별을 없애려면 자원의 공정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세 말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600년이라는 시간을 더듬으며 내린 결론치고는 일반적 도덕론의 나열일 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민낯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문제의식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