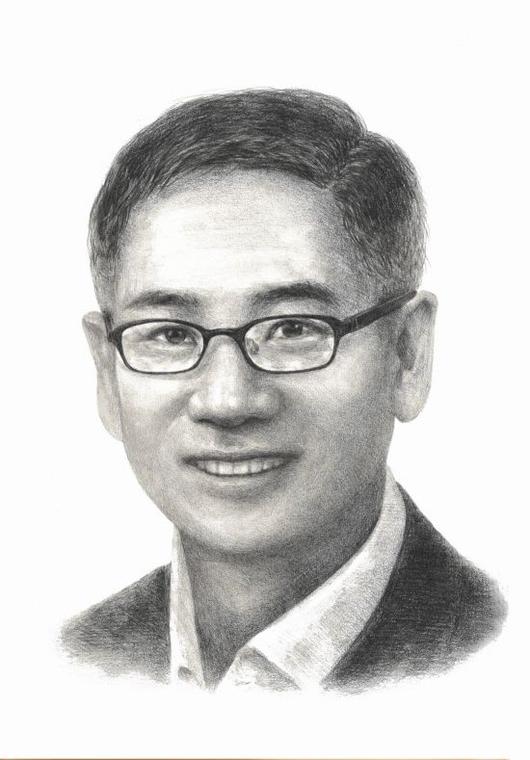 |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적정 외환보유액 논쟁은 한국 경제가 외환 불안을 겪을 때마다 일어나는 단골 메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이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어떤 경로든지 일단 국내에 유입된 외화자금(달러화)은 장롱 속 현금으로 보관되지 않는 한 해외로 리사이클된다. 은행이 해외에서 차입해 국내에 공급한 외화자금의 차환이 유사시 거부될 때 만약 회수할 자금이 국내에 없다면 국가부도가 일어난다. 따라서 외환 당국은 외환준비금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동아시아 외환 위기 후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마틴 펠드스타인은 한 나라의 외환 안정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의지할 수만은 없으며 건전한 거시정책으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단기 외채를 줄이거나 담보신용기구를 만들거나 보유외환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신흥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보유외환을 쌓았다. 그러나 보유외환은 상당한 운영비용을 초래한다. 보유외환은 미 단기 국채와 같이 유동성과 신용도가 높은 자산으로 구성돼 이자 수입이 매우 적은데, 보유외환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또는 통화량 환수 목적에서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비용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유외환이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의 외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본다면 이자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순채권국이었고 만기불일치도 없었지만 한국 경제는 은행권의 막대한 외채에서 비롯된 외환 불안을 막지 못했다. 결국 미 연방준비제도(Fed)와의 유동성 스와프로 위기를 넘겼다. 2008년 위기는 환헤징 등 외화 차입을 유발하는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 행동이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 사건이었다. 외환 당국은 마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피구조세를 매기듯이 단기 외채를 규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부과했다.
올해 비금융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통화 및 만기 불일치가 없었음에도 외환 불안이 일어났다. 다행히 다시 미 Fed와 유동성 스와프를 체결해 비로소 외환시장은 진정됐다.
단기 외채만큼 보유외환을 쌓는 그린스펀 룰, 그보다 보수적인 IMF나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적정 보유외환액도 외환 불안 앞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4조달러 이상 외환준비금을 보유했던 중국은 2015년부터 시작된 외환 불안으로 1조달러를 날렸다.
금융 위기 당시 언론은 '2000억불 간당간당'이라고 헤드라인을 실었다. 팬데믹 때는 '4000억불 턱걸이'라고 했다. 만약 BIS안(案)보다 많은 6000억불 이상을 쌓았더라면 '6000억불 무너지나'라는 제목을 걸었을지 모른다. 비용에 관계없이 외환보유액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충분치 않은 것은 환율이 심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외환 당국으로서는 줄어드는 보유외환의 공포와 폭등하는 환율의 공포 사이에서 균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규모가 작아도 Fed의 스와프가 확실한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은 양(量)보다 질(質)이 외환 안정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나 최상위 국가신용등급을 보유한 호주의 외환보유액은 400억불 남짓이다. 이는 호주달러화의 국제화가 크게 진전됐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호주달러화로 외채를 발행하거나 미 달러화로 환헤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경제 주체의 합리적 행동이 경제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동반하지 않는다. 진정 선진국이라면 해외 자본의 유출입에 경제가 휘둘리지 않아야 하며, 원화 국제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대안이다. 늦었지만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길 때다.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