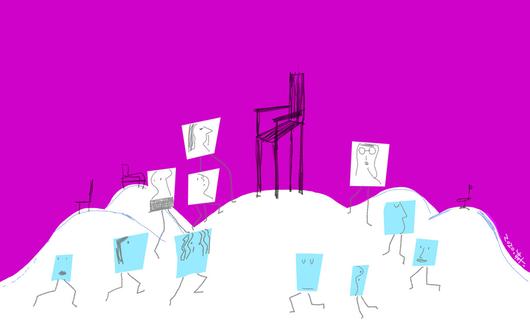 |
일러스트 장선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런 남자는 없다
손희정 외 지음,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엮음/오월의봄(2017)
유명 웹툰 작가가 여성 혐오 논란으로 사과를 했다. 나는 ‘진정한’ 사과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오래된 물음을 다시 떠올렸다. 많은 경우에 그렇듯, 그의 사과는 논란 너머를 향해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가 사과할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소비하는 많은 독자들은 그가 왜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행위이므로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한 통렬한 자기점검이 먼저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잘못’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스스로를 넘어서야만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으로 인해 나의 중요한 것이 침해당했다”는 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침해당했다고 말하는 이의 것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은 내가 나의 일부분을 부정하면서 타인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사과하기 이전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부정해야 할 나의 일부분은 어쩌면 내가 가진 기득권일는지 모른다. 타인을 조롱거리 삼아 웃을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권리 같은 것 말이다. 고작 웃는 것이 권리씩이나 되느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특히나 그것이 개그와 유머의 외피를 입고 있다면 더더욱. 개그나 유머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효과를 누리면서도 교묘하게 도덕적 책임감을 피해간다. 누군가의 재미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되어야만 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드는’진지의 과잉으로 취급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웃자고 한 이야기에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조롱거리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죽자고 달려들 만큼 중요하다.
온라인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조롱의 ‘드립’이 만연해 있고 여성이라면 누구든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갖고 있다. 조롱과 비웃음은 특정 집단의 여성을 단죄하면서 ‘웃을 수 있는 자들끼리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데, 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관계를 규정짓는 위계에 기반한다. 고로 골방에서 혼자 ‘무개념녀’를 조롱하며 웃더라도 그것은 이미 집단적이고 사회적이다.
그렇다면 왜 젠더 위계가 조롱과 비웃음의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작금의 한국 남성성과 어떻게 관련 있는가. 그에 대한 탐색을 담은 책이 <그런 남자는 없다>이다. 이 책은 1950년대와 박정희체제를 거쳐 아이엠에프(IMF)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상을 통해 한국 남성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들여다본다. 남성성이란 시대적 산물이자 사회 구성물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상적 남성성’을 역사화하는 작업인 것이다. 특히‘디지털 시대의 남자 되기와 여성 혐오’라는 장에서 공저자인 김학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농담’을 남성들간의 유대를 통한 배제의 연대를 구축하려는 의례로 이해한다.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잡은 혐오적 여성-괴물 만들기는 “남성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여성들의 악덕을 모아놓은 합성물로서, 여성들의 욕망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젠더권력적 욕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젠더권력적 욕망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나의 재미를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것 같다.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다면 자신을 넘어 상대에 가닿는 진정한 사과가 가능할지도. 젠더위계 속에 자리한 나의 위치로 인해 누군가를 대상화하면서 웃음거리로 삼을 수 있는 권력을 휘둘렀고, 그로 인해 누군가 인간됨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에 용서를 빈다…. 전무후무한 진심어린 사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개그가 되지 않기를.
정미경 소설가
 |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