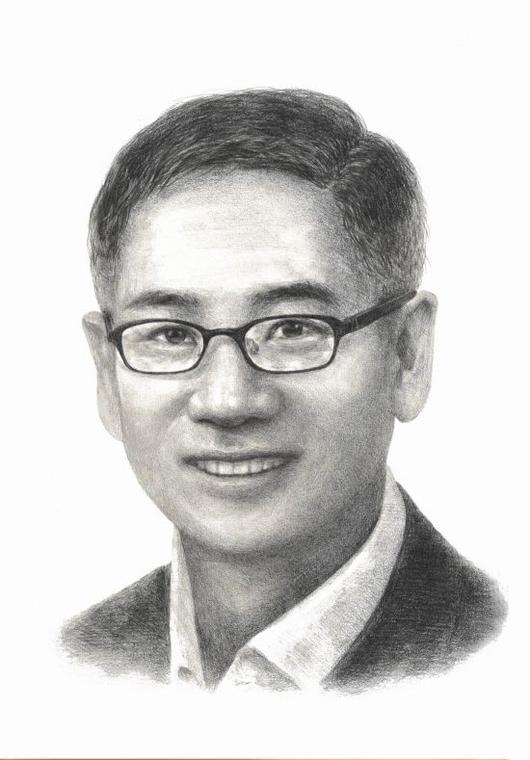 |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던 2008년 8월 ‘비트코인: 사용자 간 전자현금시스템’이라는 논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으로 발표됐다. 사용자 커뮤니티가 거래 정보를 공유해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한 것이다. 이듬해 비트코인이 태어났다.
소박하게 말하자면 비트코인은 일상생활에서 돈 대신 소액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립토 아나키즘의 구현으로 범세계 금융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웅대한 의지도 담겨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초국가화폐로서 비트코인은 국가가 주조권을 독점하는 것을 부정한다. 국가가 주조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현대화폐이론(MMT)과 정반대의 인식에서 주조권 남용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그 가치가 훼손되는 법정화폐와 달리 발행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법정화폐와 은행의 디지털화폐(예금)가 국가권력과 공신력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나 비트코인은 거래와 결제 시스템을 원활히 작동하는 기술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 이 기술은 중앙집중적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거래비용을 낮추고 안정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최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출시된 지 12년, 가상화폐는 마치 1980년대 코믹 호러 영화 ‘그렘린’에 등장하는 몬스터로 변한 ‘모과이’를 보는 듯하다. 한 가상화폐는 상장한 지 30분 만에 1000배 이상 치솟았다. 일론 머스크가 좋아한다고 트윗하자 도지코인은 하루 새 8배가 뛰었다.
20~30대 청년층뿐 아니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자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22시간에 육박한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또다른 언론은 젊은이들이 코인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며 이제 직장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는 청년의 인터뷰도 곁들였다. 금융당국 수장이 강수를 두자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제 코인(가상화폐)을 가치가 오를 자산으로 보고 투자할 뿐,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 작년 MMT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속한 민주당 미 대선후보가 당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불붙기 시작한 가상화폐시장은 폭등했던 2018년 당시보다 한때 시가총액은 3배 가까이, 거래 규모도 5배 이상 늘어났다.
가상화폐의 종류는 9500개, 거래소 400개에 가깝다. 블록체인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비록 비트코인은 그 공급이 제한적이지만 가상화폐의 공급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작년 투자자들은 기업의 근본가치를 평가하는 대신 미래 혁신의 희망에 기댄 이른바 ‘스토리 주식’에 열광했다. 그러나 연초 대부분 그 상승 모멘텀이 약화됐다. 주가는 배당 흐름, 채권 수익률,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펀더멘털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광풍을 막고 균형을 잡아줄 펀더멘털이 없다. 따라서 가상화폐 열풍을 투기판이 된 자산시장에 빗대어 ‘더 큰 바보이론(GFT)’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GFT에 따르면 가치의 과대평가 여부에 상관없이 더 높은 가격으로 ‘더 큰 바보’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그러므로 도박의 본능은 자산 가치를 오랫동안 상승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더 큰 바보’가 사라질 때까지는.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